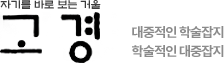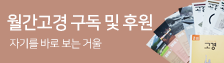[선사, 주인공의 삶]
자리, 감당할 수 없는 무게
페이지 정보
이인혜 / 2015 년 4 월 [통권 제24호] / / 작성일20-05-22 08:32 / 조회4,427회 / 댓글0건본문
자리에 관해 경계하는 말씀이 예부터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자리 하나 났다하면 가지 않기가 어렵다. 생존을 위한 것이든 명예를 위한 것이든, 자리가 주는 편의와 매력은 거부하기 힘들다. 그것을 옛사람은 ‘유위불임난(有位不任難)’이라고 했다. 그런데 자신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자리만 보고 뛰어들다 보면, 우선 자기 속이 시끄럽고 나아가 온 동네가 소란하다.
초등학교 반장부터 대학의 이사장과 총장까지, 사회에서는 과장, 부장, 사장, 회장으로 이어지는 자리, 심지어는 출세간의 방장까지도, 자리를 놓고 벌이는 경쟁은 치열하다.
미관말직부터 ‘장(長)’ 자 붙은 자리에 오르기까지 사람들이 쏟는 노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스무 명의 인턴 중에 겨우 한두 명 뽑힐 직원에 들기 위해 분투하는 조카의 고단함과 해마다 승진심사에 떨어지고 우울증을 겪는 선배의 모멸감을 생각할 때, 엄마의 돈 봉투로 쉽게 반장자리를 얻고 인생의 대부분을 무소속으로 살아온 주제에, 치열한 자리다툼에 대해 말할 자격이 나에겐 없다. 그러나 요즘 학교와 종단에서 자리를 놓고 다투는 모습은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조차 민망할 지경이다.
회사에서의 자리는 밥줄이 걸린 문제니까 그렇다 치고, 생존 문제가 아닌 감투경쟁에도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 것을 보면 거기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쟁취했을 때의 승리감, 타인의 주목을 받는 우쭐함, 지위에 주어지는 특혜, 좌지우지하는 권세의 맛이 있다. 학교 때 기억에, 선생님이 줄반장에게 떠드는 사람 이름 적어놓으라고 하면, 줄반장은 이름 적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애들을 야단치면서 조용히 하도록 시켰다. 한번 완장을 차면 휘두르는 것이 자리의 속성인가 보다.
사회에서는 거의 모든 부장님이 부하직원들의 술자리 안주감이 된다. 그 많은 부장님들이 처음부터 술자리 안주감이 되려고 작정하고 입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인격이 그리 나쁘지 않더라도, 아랫사람에게 직장상사는 편치 않은 존재다. 통솔하는 것이 임무이다 보니 지위 자체가 주는 불편함이 있는 것이다. 나도 짧은 직장생활에서 느꼈던 바가 있다.
한번은 보스에게 따질 일이 있어서 맘을 단단히 먹고 찾아간 적이 있었다. 보자마자 “오늘은 계급장 떼고 붙자.”고 했더니 1초도 안 돼서 돌아온 답이 “내가 왜?”였다. 아차, 싶었다. 나는 김근태가 아니었다. 그리고 보스 또한 노무현이 아니라는 걸 생각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급 사과를 한 뒤에 달아오르는 얼굴과 두근거리는 심장을 느끼며, 짤릴 각오를 하고 ‘아니 되옵니다’를 아뢰었다. 짤리진 않았지만 조직생활에 얼마나 무지한지, 스스로 병신인증을 톡톡히 한 사건이었다. 그 일로 보스가 되기까지 그가 치렀을 대가를 헤아려보았다. 그리 높은 자리가 아니었는데도 많은 일을 겪고 나서 거기까지 간 사람이었다. 그러니 더 높이 오르려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는가.
높은 자리일수록 가기도 어렵고 감당하기도 힘들다. 그래서인지 옛 스님들 중에는 큰절에 주지하라 그러면 도망가는 분들이 있었다. 어록에도 “주지살이 힘들어서…”라는 표현이 자주 보인다. 고암(高庵善悟, 1074~1132)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운거사 주지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운거사는 양자강 왼쪽에서 가장 큰 절이라 도를 실천할 만한 곳이니 거절하지 말아달라는 불안(佛眼) 스님의 부탁이었다.
그는 “총림이 생겨나고부터 이런 명목에 가려 절개를 무너뜨린 납자들이 적지 않다.”면서 딱 거절했다. 불감 스님은 “그의 처신은 역시 따라갈 수가 없다.”고 인정했다.
동양의 선사들만 그런 건 아닌가 보다. 서양의 수행자 중에도 그런 예가 있으니. 베네딕토 16세는 2005년 교황에 선출되자 실제로 매우 힘들어했다고 한다. 그때 기사내용 한 토막.
베네딕토 16세는 “투표가 진행되면서, 말하자면, 단두대가 나에게 내려오리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현기증이 나기 시작했다.”며 “나는 내 인생의 과업이 끝났다고 생각했고 여생을 평화롭게 지내기를 기대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느님께 ‘저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활기차고 강력하게 이 큰 과업을 맡을 더 젊고 나은 후보들이 있습니다.’라고 기도했다”며 “분명히, 이번에는 하느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고 말했다.
(썸바디whereugo님의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를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가 있다. 2013년에 개봉했었는데 제목은 ‘우리에겐 교황이 있다’였다(난니 모레티, 2011, 이태리). 영어 제목은 ‘We have a Pope!’인데, ‘교황이 선출됐습니다.’ 정도의 뜻이겠다. 암튼, 교황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후임 교황을 선출하기 위해 콘클라베가 열린다. 바티칸 성당광장에 운집한 신도들이 굴뚝에 흰 연기가 피어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는 후보로 추대된 추기경들이 안절부절 못한다. 가만있지 못하는 손동작, 초조한 얼굴로 모두 신께 기도한다. “저를 뽑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아니라고 벌써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멜빌이라는 추기경이 새 교황으로 선출되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멜빌은 충격을 받는다. 여생을 편하게 누리려던 계획이 좌절되었으니 패닉에 빠질 만하다. 그런 그가 제정신으로 돌아오도록 은밀한 조치가 취해진다. 정신과 의사가 불려오고 이런저런 소동이 벌어진다. 그러나 그는 도주를 감행한다. ‘주님의 첫 번째 종’, 영광이 철철 넘치는 그 자리를 마다한 것이다. 감당할 수 없는 자리의 무거움을 벗어던지고 자유를 찾아서.
무거운 자리, 왕위를 버리고 밥을 빌어먹는 자리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무려 1,250명의 거지떼를 이끌고 사위성으로 밥 빌러 가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모두가 자리를 포기하고 자유를 향해 가는 멋진 행렬이다. 그 행렬은 성위(聖位)를 이룬다. 가장 낮은 자리에 머무셨기에 모든 중생을 짊어지는 지위에 오르신 것이다.
세속에서 지위는 확실히 차별을 의미한다. 불교의 지위도 차별이기는 하나 수다원부터 아라한까지, 신위(信位)부터 지위(地位)까지 도를 닦아 얻어지는 결과를 뜻한다. 차례차례 거쳐서 부처의 지위에 오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비구의 본뜻, 밥을 빌어먹는 자리에서 시작한다.
아까 그분, 큰절 주지를 마다한 고암 스님은 평생을 간소하게, 강직하게 살다 갔다고 한다. 이런 말을 남기고. “나는 도 닦는 데는 남보다 나을 것이 없다. 다만, 평소에 하는 일이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을 뿐이다.”
자리싸움에 골몰한 요즘 세태에 따끔한 경책이 아닐 수 없다. ‘까이꺼, 왕위’는 아무나 못해도, 부끄러움을 안다면 그를 도 닦는 이라 하겠다.
저작권자(©) 월간 고경.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뉴스
-

인간은 울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천년 고도 교토에는 수많은 정원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료안지龍安寺나 다이토쿠지大德寺처럼 사찰의 방장 정원이거나, 가쓰라리큐桂離宮, 슈가쿠인리큐修學院離宮처럼 황실 정원입니다. 정원에 가더라도 거기 있…
서종택 /
-

팔순八旬에 다시 보이는 성철 큰스님 유필
아마도 우리 세대는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라고, ‘사람이 일흔 살까지 산다는 것은 예로부터 드문 일’이라는 말을 젊은 날부터 귀가 따갑게 들으며 살아왔고, 소납도 70살까지 살면 다행이다 하…
원택스님 /
-

말법시대 불명참회와 53불신앙
지난 호에서 살펴본 윈강 11굴 태화 7년(483) 명문과 석경산 뇌음동의 참회의식은 당시 수행자가 말법시대를 대비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북위 효문제(재위 471∼499) 때 조성된 윈강 11굴…
고혜련 /
-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연꽃은 불교를 선명하게 상징하는 대표적인 꽃이다. 진흙탕 안에서도 고아한 모습으로 그 자태를 은근히 드러내지만 그것을 자랑으로 삼지 아니한다. 연은 잎에서부터 뿌리며 씨앗까지 인간 삶에 어느 하나 …
김세리 /
-

불교에서 유래한 고려시대 대표과자 유밀과
찬란하게 아름다웠던 벚꽃의 향연은 막을 내리고 연둣빛이 선연히 짙어가는 5월입니다. 마치 차례로 줄을 서서 4월이 밀어 올린 기운을 받아 5월은 더욱 찬란하게 되는 느낌입니다. 장미꽃의 붉은 향기는…
박성희 /
※ 로그인 하시면 추천과 댓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