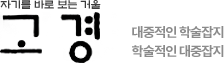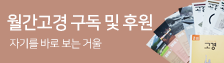[백일법문 해설]
하늘의 달과 천강에 비친 달
페이지 정보
서재영 / 2017 년 8 월 [통권 제52호] / / 작성일20-05-22 08:32 / 조회4,825회 / 댓글0건본문
한 알의 모래 속에 담긴 우주
“한 알의 모래에서 우주를 보고,
한 떨기 들꽃에서 천국을 보려거든
작은 손아귀로 무한을 움켜쥐고,
촌각의 시간에서 영원을 포착하라.”
19세기 영국 시인 윌리암 블레이크가 남긴 영감어린 시의 한 구절이다. 작은 손아귀로 온 세상을 움켜쥐고, 촌각의 시간에서 영원을 포착할 수 있다면 한 줌의 모래 알갱이 속에서도 온 우주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언뜻 보면 모순적이고 불가능한 일이며,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문학적 표현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유는 불교사상, 특히 화엄의 법계연기 사상을 이해하면 매우 자연스러운 내용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화엄종의 현수법장이나 신라의 의상대사가 이해하는 법계의 세계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설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의상대사는 윌리암 블레이크보다 1200년 전에 활동했던 해동화엄의 초조다. 7세기 신라에서 활동했던 의상대사는 법성게(法性偈)라는 게송을 통해 법계의 실상을 압축적으로 표현했다. 법성게는 치밀하게 설계되어 한 폭의 만다라 같은 느낌을 주는데, 여기서 의상대사는 ‘일미진중함시방(一微塵中含十方)’이라고 했다. 미세한 먼지 속에 시방세계, 즉 우주가 들어 있다는 것이다. 화엄에서 말하는 ‘미진(微塵)’은 블레이크가 말한 모래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미세한 것이다.
우리가 보통 먼지하면 떠올리는 것은 창문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에 떠다니는 먼지를 생각한다. 그런 먼지를 일광진(日光塵) 또는 극유진(隙遊塵)이라고 한다. ‘햇살에 일렁이는 먼지’와 ‘작은 틈새로 떠다니는 먼지’라는 뜻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일광진은 소의 털끝에 앉는 크기라고 해서 달리 우모진(牛毛塵)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우모진보다 1/7이나 더 작은 먼지가 있으니 바로 양모진(羊毛塵)이다. 양의 털끝에 앉는 먼지라는 뜻이다. 그리고 양모진보다 다시 1/7 크기의 먼지가 있으니, 토끼 털 끝에 앉는 먼지라는 뜻에서 토모진(兎毛塵)이라고 한다. 토모진 보다 다시 1/7 크기의 먼지가 있으니 물을 통과하는 먼지라는 뜻에서 수진(水塵)이라고 한다. 수진보다 다시 1/7 크기의 먼지가 있으니 금을 통과하는 먼지라는 뜻에서 금진(金塵)이라고 한다. 금진에 비해 1/7로 더 작은 먼지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미진(微塵)이다.
이렇게 보면 미진과 모래알의 크기는 실로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광활한 우주에 비교하면 그 차이란 부질없는 것이니 미진이나 모래알이나 크게 다를 바는 없을 것이다. 의상대사는 시간적으로도 ‘무량원겁즉일념(無量遠劫卽一念) 일념즉시무량겁(一念卽是無量劫)’이라고 했다. 아득한 영겁의 시간이 찰나의 한 생각과 다르지 않으며, 찰나의 짧은 순간이 그대로 아득한 영겁의 시간이라는 것이다.
모래알과 세상, 미진과 시방세계는 개체와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달리 보면 개체와 개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 알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고, 미세한 먼지 속에서 우주를 볼 수 있다면 작은 개체와 전체는 둘이 아니다. 그래서 의상은 ‘일즉일체다즉일(一卽一切多卽一)’이라고 했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는 것이다. 이처럼 개체와 전체, 개체와 개체의 관계는 존재의 관계성과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화엄의 핵심적 개념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법계삼관(法界三觀)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주변함용(周徧含容)’이다. 주변 함용은 전체와 개체, 개체와 개체가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있고, 상호 소통하고 있는가를 설명한다.
달 하나와 천강의 달그림자
주변함용관에서 ‘주변(周徧)’이란 두루 퍼진다는 뜻이고, 반면 ‘함용(含容)’이란 하나로 모아지는 수렴을 의미한다. 성철스님은 이 두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하늘에 떠 있는 달과 천강에 비친 달그림자라는 비유를 가져 온다. 주변은 확산의 개념으로 하나가 온 세상으로 널리 퍼진다는 뜻이다. 그런 이치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선어록에 나오는 ‘일월보현일체수(一月普現一切水)’이다.
하늘에 둥실 떠 있는 달은 하나지만 그 달은 하늘에만 떠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 어디라도 물이 있는 곳이라면 달그림자는 그곳에 모습을 드러낸다. 태평양이든 인도양이든, 한강이든 갠지스강이든, 깊은 우물이든 하다못해 나뭇잎에 맺힌 작은 이슬방울일지라도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달빛이 반짝인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은 비록 하나지만 그 달은 온 세상에 두루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주변이라는 개념이 담고 있는 내용이다.
우리에게 이 비유는 매우 익숙한 내용이다. 교과서에 등장하는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의 비유가 바로 이것이다. 세종대왕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며 지은 노래가 월인천강지곡이다. 하늘에 떠 있는 하나의 달이 천강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이 ‘월인천강’에 담긴 뜻이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가 모든 사바세계에 두루 미치고, 모든 중생에게 진리의 빛을 드러냄을 상징하는 말이다.
그런데 청량징관은 주변함용에 대해 ‘사사무애(事事無碍)’를 설명하는 교설이라고 했다. 법계에 존재하는 무수한 사물과 사물들이 상호소통하고 의존해 있음을 통찰하는 지혜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사무애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되는 월인천강을 하늘에 떠 있는 달과 천강에 비친 달빛으로만 이해하면 본래의 뜻을 곡해할 수 있다. 하늘의 달과 천강의 달을 그런 관계로 이해하면 달은 우주적 진리나 초월적 유일신으로 이해되고, 천강에 비친 달빛은 하나의 빛을 받는 대상 내지는 피조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해는 달이라는 주체와 그것에 의해 빛을 받는 수동적 대상이라는 주종관계로 이해될 위험이 높다.
화엄의 핵심은 하늘에 떠 있는 존재의 근원이나 유일자가 아니라 오히려 지상에 존재하는 이름 없는 것들, 무수한 존재들 자체에 초점이 있다. 그래서 그 이름도 ‘화엄(華嚴)’이다. ‘화엄’이라는 말은 범어 ‘Gaṇḍavyūha’를 번역한 것인데, 한문으로 ‘잡화엄식(雜華嚴飾)’으로 번역된다. 법계의 세계는 온갖 이름 없는 꽃들로 장식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 잡화는 곱게 핀 아름다운 연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먼지와 같이 무수한 존재들을 모두 꽃으로 상징하는 말이 바로 화엄이다. 이렇게 되면 작고 보잘 것 없는 무수한 먼지들과 부분들이 그대로 전체이자 우주가 된다. 여기서 작은 먼지가 곧 광활한 우주와 다르지 않고, 찰나의 순간이 영겁의 시간과 다르지 않다는 통찰이 나오게 된다.
이처럼 연기(緣起)는 하나의 달과 천강에 비친 달그림자라는 수직적 상하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모든 존재의 수평적 관계성이 빚어내는 조화로운 전체에 대한 이해가 연기이고, 그것에 대한 화엄의 설명이 ‘잡화엄식’이다. 여기서 하나와 전체의 관계는 하나에서 전체로 확산되는 ‘주변’을 넘어 ‘함용(含容)’이라는 개념으로도 전환된다. 함용이란 세상에 편재하는 것들이 하나로 수렴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체수월일월섭(一切水月一月攝)’이라는 말이 함용의 관계를 설명하는 비유로 사용된다. 즉, 천강에 비친 달빛은 모두 하늘에 떠 있는 하나의 달로 수렴됨을 의미한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은 천강에 드리운 달의 근원이 아니라 천강의 달그림자가 하늘에 떠 있는 달을 있게 했다는 인식의 전환이다. 따라서 하늘의 달과 천강의 달은 주종관계가 아니라 불이(不二)의 관계가 된다. ‘주변’이 하나가 전체에 미치는 작용이라면 ‘함용’은 전체와 하나가 둘이 아니라는 법성의 본질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하늘의 달과 천강에 비친 달빛이라는 비유가 주는 가르침은 사물과 사물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을 설명하는 사사무애에 대한 설명이다. 하나가 일체가 되고 일체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모든 존재가 개체적 울타리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이다. 모든 존재는 보편적 관계 속에서 생성되고 변화한다. 따라서 사사무애는 모든 존재는 본성이 스스로 공하면서도 신비롭게 함께 있는 진공묘유(眞空妙有)의 법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성철스님은 이와 같은 법계삼관에 대해 불교가 제시하는 안목 내지는 세계관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즉 ‘불교에서는 세계를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 자체가 일즉일체이고, 일체즉일이므로 그와 같은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본 것”이 주변함용관이라고 했다.
따라서 주변함용관을 이해하는 것은 법계의 성품인 법성(法性)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계연기(法界緣起)는 부처님께서 만든 것도 아니고 중생이 만든 것도 아니다. 부처님께서 법계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깨달아서 중생에게 소개했을 뿐”이라는 것이 성철스님의 설명이다.
저작권자(©) 월간 고경.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뉴스
-

인간은 울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천년 고도 교토에는 수많은 정원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료안지龍安寺나 다이토쿠지大德寺처럼 사찰의 방장 정원이거나, 가쓰라리큐桂離宮, 슈가쿠인리큐修學院離宮처럼 황실 정원입니다. 정원에 가더라도 거기 있…
서종택 /
-

팔순八旬에 다시 보이는 성철 큰스님 유필
아마도 우리 세대는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라고, ‘사람이 일흔 살까지 산다는 것은 예로부터 드문 일’이라는 말을 젊은 날부터 귀가 따갑게 들으며 살아왔고, 소납도 70살까지 살면 다행이다 하…
원택스님 /
-

말법시대 불명참회와 53불신앙
지난 호에서 살펴본 윈강 11굴 태화 7년(483) 명문과 석경산 뇌음동의 참회의식은 당시 수행자가 말법시대를 대비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북위 효문제(재위 471∼499) 때 조성된 윈강 11굴…
고혜련 /
-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연꽃은 불교를 선명하게 상징하는 대표적인 꽃이다. 진흙탕 안에서도 고아한 모습으로 그 자태를 은근히 드러내지만 그것을 자랑으로 삼지 아니한다. 연은 잎에서부터 뿌리며 씨앗까지 인간 삶에 어느 하나 …
김세리 /
-

불교에서 유래한 고려시대 대표과자 유밀과
찬란하게 아름다웠던 벚꽃의 향연은 막을 내리고 연둣빛이 선연히 짙어가는 5월입니다. 마치 차례로 줄을 서서 4월이 밀어 올린 기운을 받아 5월은 더욱 찬란하게 되는 느낌입니다. 장미꽃의 붉은 향기는…
박성희 /
※ 로그인 하시면 추천과 댓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