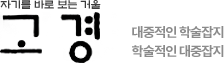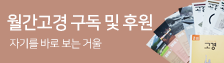[선어록의 뒷골목]
새가 새여서 날 수 있듯이, 개는 개여서 완전하다
페이지 정보
장웅연 / 2015 년 7 월 [통권 제27호] / / 작성일20-05-22 08:32 / 조회4,422회 / 댓글0건본문
밀리거나 까일 때마다 새겨두면 좋은 말 : 태산이 높다 하되 마음속의 산이요, 잃었다 한들 본래 없었던 것이다.
제18칙
조주의 개(趙州狗子, 조주구자)
1. 스님 : 개에게도 불성(佛性)이 있습니까?
조주 : 있다. 스님 : 그렇다면 왜 저런 가죽주머니에 들어가 있습니까?
조주 : 알면서도 짐짓 범한 것이다.
2. 스님 :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 : 없다.
스님 : 일체중생 모두가 불성을 갖고 있는데 왜 유독 개에게만은 없다는 겁니까?
조주 : 그에겐 업식(業識)이 있기 때문이다.
‘무(無)’는 우리나라 선원(禪院)의 대표적인 화두다. 이것 아니면 ‘이뭣꼬’가 대세다.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던 조주종심(趙州從諗)의 엉뚱한 답변에서 유래했다. 불성은 부처가 될 성품을 의미하며, 살아있는 것은 전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게 부처님의 근본교설이다. 곧 조주구자는 불교의 핵심을 위배하고 있다. 그리고 ‘왜 없다고 했을까’란 의심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이 간화선의 시작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다. 위에 소개한 원문에서 나타나듯 조주는 “없다”고만 단정하지는 않았다. 보다시피 “있다”고도 했다. 개인적으로는 단순히 ‘없다’는 것보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주장이 더욱 살갑게 다가온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으며, 없으면 없는 대로 안타깝고 있으면 있는 대로 감질내는 게 삶이니까. 결국 사정이 이러하니 ‘있다’에도 ‘없다’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의도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조주의 말장난은 교육이다.
여기서의 ‘개’란 우리가 욕을 하고 싶을 때마다 걸핏하면 불러내는 그 개다. 개새끼, 개판, 개고생……. 하찮은 존재나 한심한 처지를 가리키는 고금(古今)의 대명사를 일컫는다. 아울러 대화를 여는 스님이 말하는 개는 ‘개만도 못한 놈’ 혹은 ‘개나 물어갈 현실’ 따위를 지칭한다. 불성을 인권 혹은 행복으로 의역한다면, 요컨대 ‘쥐구멍에도 볕이 뜰 수 있느냐’는 질문의 변주인 셈이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란 잠언은 기능주의적 사고의 반영이다. 누구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품격을 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조사선의 세계관은 즉물적이다. 인식하되 분별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개는 그냥 개이지 ‘개×같은 것’이 아니다. 업식은 일종의 심리적 궤양이며, 절망에서 발병하고 비관에서 심화된다. 자고로 스스로를 업신여기는 자는 남으로부터도 대접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새가 새여서 날 수 있듯이, 개는 개여서 완전하다.
물론 불성이 있든 없든 인생은 녹록지 않다. 깨달음은 세속적 성공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외려 깊이 있는 삶일수록 오해받기 쉽다. 개처럼 벌어도 개처럼 지내야 하는 날들은 남녀노소에게 부지기수다. 그래서 참다운 삶의 관건은 끝내 전진이 아니라 극복이며, 이를 해결하는 길은 기어이 용기로 수렴된다. ‘알면서도 짐짓 범할’ 줄 아는 초연(超然)의 자세에서, 마침내 삶다운 삶이 열리는 것이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도 괜찮은, 삶과 죽음이 분간되지 않을 만큼의 적멸(寂滅).
제19칙
운문의 수미산(雲門須彌, 운문수미)
“한 생각조차 일으키지 않아도 허물이 있겠습니까?” 운문문언(雲門文偃)이 말했다. “수미산이니라.”
수미산(須彌山)은 세상의 중심에 있다는 산이자 세상에서 가장 높다는 산이다. 그러나 상상 속의 산이어서,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미산을 쌓을 수 있다. 은행에서 수미산을 찾아오는 길에 화장이 잘 먹은 수미산을 만나면 수미산이 그리워진다. 수미산이 아닌 데도 수미산이라 우기며 수미산 한가운데서 돌연 수미산이 당기기도 한다. 눈 뜨면 없음을 알기에 차마 눈 뜨지 못하고, 눈먼 정신으로 등성이를 오르거나 남의 발을 밟는다. 동네 뒷산의 능선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들썩거리는 마음의 흐름 같아서, 이사 가고 싶다.
제20칙
지장의 친절(地藏親切, 지장친절)
지장 : 상좌는 어디로 가려는가?
법안 : 여기저기로 다니렵니다.
지장 : 어떻게 다니려는가?
법안 : 모르겠습니다.
지장 : 모른다는 그것이 가장 가까운 길이다.
법안은 이 말에 크게 깨달았다.
이성(理性)은 유능하지만 불완전하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정작 오면 한심하다. 인생은 내게 목숨을 주었으나 아무 때나 참견하고 불시에 빼앗아간다. 사랑은 부재(不在)로써 존재한다. 남은 위험하고 나는 불안하다. 진실은 언제나 나와 너의 틈새에만 있다. 결국 오직 모를 뿐이니, 오직 할 뿐. 수처작주(隨處作主). 사랑에 상처받지 않을 원천적인 방법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다. 입처개진(入處皆眞). 진실도 내 마음이 봐줘야만 비로소 진실이다. 아무렇게나 있어도, 나는 정녕 살아도 되는 짐승이었구나!
제21칙
운암이 마당을 쓸다(雲巖掃地, 운암소지)
운암담성(雲巖曇晟)이 마당을 쓰는데 천황도오(天皇道悟)가 다가왔다. “몹시도 구구하군.” 이에 운암이 “구구하지 않은 것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대꾸했다. 다시 도오가 말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달(第二月)이겠군.” 그러자 운암이 빗자루를 세우고 물었다. “이것은 몇 번째 달입니까?” 도오는 더 이상의 대화를 그만두었다.
이를 두고 현사사비(玄沙師備)는 “바로 그것이 두 번째 달”이라고 했고 운문문언은 “남종이 여종을 보면 정성스러워진다”고 했다.
부지런히 절 마당을 쓸고 있는 운암을 보고 손위인 도오가 깐죽거리는 장면이다. 어지간히도 부산을 떤다는 말에 운암은 비위가 상했다. “구구하지 않음도 있다”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모양새다. 하긴 청소만큼 갸륵하고 윤리적인 일도 없으니까. 아쉬운 건 운암이 스스로를 변호하려다가 무심(無心)을 제 손으로 깨뜨렸다는 점이다. 지고 싶지 않다는 오기에 얼굴이 붉어졌을 운암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운암은 “구구하다”는 비난에 얽매여 제이월(第二月)을 따라가고 말았다. ‘제이월’이란 생각 속의 달이다. ‘달’이라는 낱말로만 존재할 뿐 실재하진 않는 달을 가리킨다. 아울러 달을 바라보면서 눈두덩을 손가락으로 누르거나 일부러 사시를 만들면 또 하나의 달이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제이월이다. “본래 그대로가 오묘한 진리이거늘 이를 의심과 차별의 눈으로 보려 하면 제이월이 되고 만다 -『능엄경』.”
한편 정신을 차린 운암은 반격으로 물귀신작전을 시도했다. 도오가 빗자루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지껄이면 곧장 제이월로 끌고 들어올 심산이었으나, 도오는 영민했다.
달이 하나이듯 당신도 하나다. 복제할 수 없으며 갈라먹는다손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같은 맥락에서 나에 대한 세상의 시선과 평판은 제이월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이 호의적일지라도 제삼월이나 제사월일 뿐이다. 제아무리 별난 심보라도 무심(無心)을 이기진 못한다. 도시의 휘황찬란한 밤하늘 아래서 달빛은 얼핏 보잘 것 없으나, 그래도 달은 영원히 빛난다. 혼자서도 버틸 수 있는 것들은, 대개 높은 곳에 있다.
“남종이 여종을 보면 정성스러워진다”는 흑심은 견물생심의 비유다. 남들의 기준에 자신을 맞춰야만 안도감을 느끼는 중생의 악습을 꼬집는다. 외부의 자극에 ‘구구하게’ 반응하다보면 자성(自性)을 훼손하기 십상이다. 운암은 절 안에 흩날리던 먼지를 일껏 쓸어 담아 마음에 처박아버리는 우를 범했다. 자존심을 지키려다가 자존감을 잃어버린 꼴이다. 자존심이 남이 알아줘야만 충족되는 마음이라면, 자존감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유지되는 마음이다. 지속가능한 승리는 ‘상대’가 아니라 ‘패배’를 이겨내는 데서 온다.
저작권자(©) 월간 고경.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뉴스
-

가야산에 흐르는 봄빛을 몇 번이나 보았던가!
지난 2월 16일 백련암에서 신심 깊은 불자님들의 동참 속에 갑진년 정초 아비라기도 회향식을 봉행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하고, 저마다 간절한 서원 속에 한 해를 밝힐 공덕을 쌓아 …
원택스님 /
-

기도는 단지 참선을 잘하기 위한 방편인가?
참선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참선이란 수행법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수행법 중에 “오직 참선만이 가장 수승한 수행법이요, 나머지 다른 수행법들은 참선을 잘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
일행스님 /
-

얼굴 좀 펴게나 올빼미여, 이건 봄비가 아닌가
여행은 언제나 좋은 것입니다. 예전처럼 가슴이 두근거리지는 않지만, 마음속 깊이 잔잔한 기쁨이 물결칩니다. 숙소는 64층인데, 내려다보는 야경이 아름답습니다. 이 정도 높이면 대체로 솔개의 눈으로 …
서종택 /
-

말법시대 참회법과 석경장엄
『미륵대성불경』에서 말하길, 미래세에 이르러 수행자가 미륵에게 귀의하고자 한다면 먼저 과거칠불에게 예배하고 공양하여 과거업장이 소멸되고 수계를 받아야 한다. 신라시대부터 일반 대중은 연등회와 팔관회…
고혜련 /
-

봄나물 예찬
바야흐로 들나물의 계절이 도래하였습니다. 도시에 살면서 아주 작은 주말농장을 통해 수확의 기쁨을 누리면서 24절기에 늘 진심입니다. 『고경』을 통해 여러 번 언급하곤 했지만 절기를 통해 깨닫게 되는…
박성희 /
※ 로그인 하시면 추천과 댓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