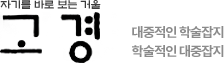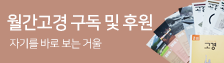[선어록의 뒷골목]
각자의 몸에 묶인 마음은 그 몸 안에서만 유효하다
페이지 정보
장웅연 / 2015 년 4 월 [통권 제24호] / / 작성일20-05-22 08:32 / 조회4,674회 / 댓글0건본문
거울에 비친 나는 내가 아니다. 나를 빙자한 껍데기이며 나를 사칭하고 다니는 욕심이다. 나를 억누르는 한계인 동시에 나처럼 보이는 그림자다. 결국 그게 나여선, 희망이 없다. 마찬가지로 깨달음은 그 ‘깨달음’이란 걸 부숴버린 자리에서 싹튼다. 그리고 산산이 조각난 깨달음을 지르밟으며 걷는 길에서 오래 머문다. 깨달음은, 붉다.
제9칙
남전이 고양이를 베다(南泉斬猫, 남전참묘)
어느 날 남전의 회상(會上)에서 동서(東西) 양당의 대중이 고양이를 놓고 다툼을 벌였다. 남전이 고양이를 들어 올리고는 “바로 이르지 않으면 베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대중은 일언반구 말을 못했고 고양이는 두 토막이 났다.
동당(東堂)과 서당(西堂)은 주지에서 물러난 원로 스님들이 거처하는 공간이다. 수행과 전법에 일가견을 이룬 어른들이 사는 곳이니, 드나드는 발길도 따르는 무리도 많았을 법하다. 한편으론 고인 물은 썩기 쉽고,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리면 도당으로 변질되기 십상이다.
또한 한낱 고양이 한 마리를 갖자고 서로 으르렁대지는 않았을 듯싶다. 절 안의 패권싸움 또는 누가 더 잘났느냐는 법통 논쟁이었을 게 뻔하다. 전체 대중을 지도하는 방장(方丈)의 입장에선 문도들의 갈등이 안타깝고 고까웠을 것이다. 그래서 일도양단의 각오로 칼을 뽑아들었다. “바로 이르라.”는 건 동당이든 서당이든 자신들이 왜 고양이를 가져야 하는지 설득해보라는 주문일 터.
하지만 불같이 화를 내는 ‘대장’ 앞에서 양쪽 모두 말문이 막혔다. 더구나 셈에 밝은 자들은 샘이나 낼 뿐이다. “고양이 대신 내가 죽겠다.”며 결연하게 나서는 이도, “공연히 노망 피우지 말라.”며 호기롭게 대드는 이도 없다. 하다못해 “잘못했다.”고 꼬리를 내리면 고양이는 무사할 수 있었다. “불쌍한 짐승을 살려 달라.”는 한마디조차 인색하다. 말은 많은데 정작 필요한 말은 못하는 ‘찌질이’들이다.
고양이를 일종의 화두로 본다면 다음과 같은 해석도 가능하다. 깨달음은 누가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 외려 갖겠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자리가 깨달음이라는 것. 그만큼 깨달음은 별것 아니라는 것. 별것도 아닌 것에 갖은 별꼴을 부리며 별것도 아닌 것이 되지 말라는 것. 한바탕 잔치는 끝났으니 다들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 발 씻고 드러누워 잠이나 청하라는 것. 마음을 잠그라는 것. 잠깐이나마.
제10칙
오대산의 노파(臺山婆子, 대산파자)
오대산 길목에 한 노파(老婆)가 있었다. 어떤 승려가 “오대산 가는 길이 어니냐.”고 물었다. 노파는 “곧장 가라.”고 일러줬다. 승려가 떠나자마자 노파는 탄식했다.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는구나!” 또 한 승려가 이 사실을 조주에게 고했다. 조주는 “감정해줄 터이니 잠시만 기다리라.”며 뜸을 들였다. 다음날 조주가 법좌에 올라 말했다. “내 그대를 위한 감정을 끝마쳤다.”
한국의 오대산은 강원도에 있고 중국의 오대산은 산시성[山西省]에 있다. 문수보살의 성지로 유명하다. 몽골 티베트계열의 라마교가 성한데, 선종 사찰도 간혹 보인다. 곧 승려가 묻고 있는 ‘오대산 가는 길’이란 진리를 상징한다. 아울러 노파는 수행자의 잘못을 바로잡는 ‘멘토’로서 선어록에 종종 등장한다. 어느 노승의 위선에 분노해 그가 기거하던 암자를 불태워버렸다는 파자소암(婆子燒庵)이 비근한 예다.
본문의 정황상 “곧장 가라.”던 노파의 말은 거짓으로 짐작된다. 앞길 창창했던 스님은 남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탓에 골로 보내졌다. 행여 제대로 찾아갔다손 그것은 노파의 오대산일 따름이다. ‘그림의 떡’에 군침을 흘린 격. 마음의 길은 외길이어서 오로지 그 마음만이 걸어갈 수 있다. 묻는 순간 함정이고 기대는 순간 벼랑이다.
천성부전(千聖不傳)이라고 했다. ‘천 명의 성인(聖人)이 있더라도 깨달음을 전해줄 수 없다’는 뜻이다. 이렇듯 불법(佛法)의 구극(究極)은 오직 체험의 영역에 속한다. 하물며 불조(佛祖)라도 대신 가르쳐주는 건 불가능하다. 누군가 나의 아픔을 위로할 순 있어도 대속하지는 못하는 이치와 같다. 떼죽음은 겉으로 보거나 제3자가 보기에나 떼죽음이지, 당사자에겐 외로운 죽음이고 절대적인 죽음이다.
체득하지 못한 깨달음은 풍월이나 겉멋에 지나지 않는다.
가히 밥맛과 같아서 구경하거나 참고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다. “모름지기 안거(安居)에 든 납자라면 방금 싸운 사이처럼 상대를 대해야 한다.”는 선가(禪家)의 충고는, 스스로에 대한 몰입을 강조하는 당부다.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양심과 가치가 있게 마련이다. 그것은 숨어 있는 만큼 소중하고 몰라주는 만큼 절박하다. 나에게 최고의 동반자는 나다.
‘조주’는 조주종심(趙州從諗) 선사를 이른다. ‘개에겐 불성이 없다’, ‘뜰 앞의 잣나무’, ‘차나 마시게’ 등 역대 최다의 공안(公案, 공인된 화두)을 남긴 인물로, 그만큼 촌철살인에 강했다. 그런데 ‘입으로 선을 가지고 놀았다’는 구순피선(口脣皮禪)의 대가는, 유독 이 대목에선 말을 아끼고 있다. 화두를 풀이해주겠다고 해놓곤 하루가 지나 뜬금없이 설명을 종료한다고 선언한 처사는 의뭉스럽다. 어쩌면 ‘해주겠다’와 ‘끝마쳤다’ 사이의 비약과 여백에 답이 있을 것이다.

오대산 만월선원 전경
스승이 제자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생각할 시간을 벌어주는 일 정도다. 고작 그것밖에 없음으로, 끝마쳤다고 태연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저런 ‘갑질’에서 보듯 살아 있음의 권리는 남이 가져가기 십상이지만, 살아 있음의 책임은 오로지 내게만 부과된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건, 사랑뿐이다. 인생의 허다한 나머지는, 기어이 그 인생을 짊어진 자의 몫이다. 각자의 몸에 묶인 마음은 그 몸 안에서만 유효하다.
제11칙
운문의 두 가지 병(雲門兩病, 운문양병)
운문 대사가 말했다.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 병이 있어서이니, 도통 어리석어서 눈앞에 어떤 물건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 그 하나요, 설령 공(空)의 경지에 이르렀어도 때때로 물건이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다. 아울러 법신(法身)에도 두 가지 병통이 있으니 먼저 법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이제는 법신에 집착하는 경우다. 물론 법신의 경지마저 초월했다 하더라도 법신을 놓아버리면 그것 또한 옳지 못하다.”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 공(空)과 동일한 맥락이며 견성성불(見性成佛)의 전제다. 애당초 아무 것도 없었음을 알 때 마음도 편안해지고 부처도 될 수 있다는 논리다. ‘물건’이란 대상세계 전체를 의미한다. 만물은 존재하기에 앞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다. 실체 이전에 환상이다.
또한 아무 것도 없다면, 아무 것도 아니다. 나보다 못났다고 거들먹거리거나 나보다 잘났다고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듯 삼라만상과 세상만사가 결국엔 마음놀음이다. 제아무리 소란스럽고 뻑적지근해도 오십보백보이며 도토리 키 재기다. 이를 깨우치면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그러나 마음놀음이란 생각 역시 마음놀음이다.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겠다는 것도 집착이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도 얽매임이다. 운문의 말대로 이래도 병이고 저래도 병이다. 끊임없이 동하고 혹하고 들썩이다가 이지러지는 게 마음의 필연적인 본성이다. 육신으로 살다가 골병이 들든, 법신으로 살다가 화병이 나든 매한가지다.
끝내는 인생 자체가 환란이거나 최소한 폭풍전야인 셈이다. 관건은 그때그때의 인연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감내하는 일이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以生其心)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잠언이자 ‘부처님’보다 값진 보배다.
병든 몸으로 너무 멀리 가거나 너무 늦게까지 나다니지 말 것.
저작권자(©) 월간 고경.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뉴스
-

가야산에 흐르는 봄빛을 몇 번이나 보았던가!
지난 2월 16일 백련암에서 신심 깊은 불자님들의 동참 속에 갑진년 정초 아비라기도 회향식을 봉행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하고, 저마다 간절한 서원 속에 한 해를 밝힐 공덕을 쌓아 …
원택스님 /
-

기도는 단지 참선을 잘하기 위한 방편인가?
참선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참선이란 수행법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수행법 중에 “오직 참선만이 가장 수승한 수행법이요, 나머지 다른 수행법들은 참선을 잘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
일행스님 /
-

얼굴 좀 펴게나 올빼미여, 이건 봄비가 아닌가
여행은 언제나 좋은 것입니다. 예전처럼 가슴이 두근거리지는 않지만, 마음속 깊이 잔잔한 기쁨이 물결칩니다. 숙소는 64층인데, 내려다보는 야경이 아름답습니다. 이 정도 높이면 대체로 솔개의 눈으로 …
서종택 /
-

말법시대 참회법과 석경장엄
『미륵대성불경』에서 말하길, 미래세에 이르러 수행자가 미륵에게 귀의하고자 한다면 먼저 과거칠불에게 예배하고 공양하여 과거업장이 소멸되고 수계를 받아야 한다. 신라시대부터 일반 대중은 연등회와 팔관회…
고혜련 /
-

봄나물 예찬
바야흐로 들나물의 계절이 도래하였습니다. 도시에 살면서 아주 작은 주말농장을 통해 수확의 기쁨을 누리면서 24절기에 늘 진심입니다. 『고경』을 통해 여러 번 언급하곤 했지만 절기를 통해 깨닫게 되는…
박성희 /
※ 로그인 하시면 추천과 댓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