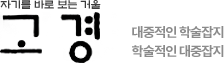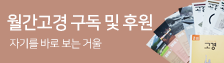[선어록의 뒷골목]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올 것이 오면 올 것이 오는 대로
페이지 정보
장웅연 / 2015 년 3 월 [통권 제23호] / / 작성일20-05-22 08:32 / 조회4,775회 / 댓글0건본문
나무는 평생을 맨몸으로 서 있고, 냇물은 죽을힘을 다해 흘러간다. 달은, 홀로 둥글다. 이제 내가 누는 똥은 어느 날 꽃으로 피어나고, 오늘 네가 짓밟은 마음은 훗날 할(喝)로 거듭날 것이다. 어쨌거나 혹은 어떻게든, 다들 살아가며 살아낸다. 돌고 돌고 돌다보면, 어느새 부처.
제6칙
마조의 백과 흑(馬祖白黑, 마조백흑)
어떤 승(僧)이 마조에게 물었다. “네 가지 구절과 백 가지 허물을 떠난 경지[四句百非, 사구백비]에서 저에게 서래의(西來意)를 보여주십시오.” 대사가 이르되, “오늘은 내가 피곤해서 그대에게 말해줄 수 없다. 지장에게 가서 물으라.”고 했다. 승이 지장에게 가서 물으니 지장은 “어찌하여 큰스님께 여쭙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마조의 말을 전하자 지장은 “내가 오늘은 머리가 아파서 그대에게 말해줄 수 없으니 회해 사형(師兄)에게 가서 물으라.”며 등을 떠밀었다. 별 수 없이 회해에게 갔더니 회해는 “나는 그 문제에 관해선 모르겠다.”고 단칼에 잘랐다. 승이 다시 마조에게 돌아가 그간의 사정을 고하니 마조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지장의 머리는 희고, 회해의 머리는 검구나.”
보리달마 이후 중국엔 무수한 선사들이 배출됐다. 그중에서도 발군을 꼽으라면, 대체로 마조도일(馬祖道一)이 빠지지않고 추천된다. ‘평상심(平常心)’이란 독창적 개념으로 구구한 선종사(禪宗史)에서 한자리를 꿰찼다. 평상심은 지금 이 순간 흘러가는 마음이며, 흘러가는 마음을 붙잡지 않는 마음이다.
“평소의 이 마음이 바로 도(道)이다. 평소의 이 마음이란 무엇인가. 짐짓 꾸미지 않고, 이러니저러니 따지지 않고, 마음에 드는 것만 좇지 않고, 무엇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집착하지 않고, 평범하다느니 성스럽다느니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지자(智者)의 삶이란 일부러 마음을 쓰지 않는 삶이며 마음에 놀아나지 않는 삶이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올 것이 오면 올 것이 오는 대로.
이렇듯 유유자적한 마조에게 객승 하나가 불쑥 찾아와 심기를 어지럽혔다. 사구백비란 하나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100가지 명제를 일컫는다. ‘있다’ ‘없다’ ‘있으면서 없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등등…. 한마디로 정리하면 ‘논리로 표현이 가능한 모든 것’인 셈이다. 서래의는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 곧 승(僧)의 질문은 낱말은커녕 토씨 하나 쓰지않고 불법의 대의를 설명해달라는 매우 황당한 요구다. 은근슬쩍 답변을 남에게 떠넘길 만하다. 마음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지지고 볶아 곤죽을 만드는 일이니, 자못 이해가 되는 회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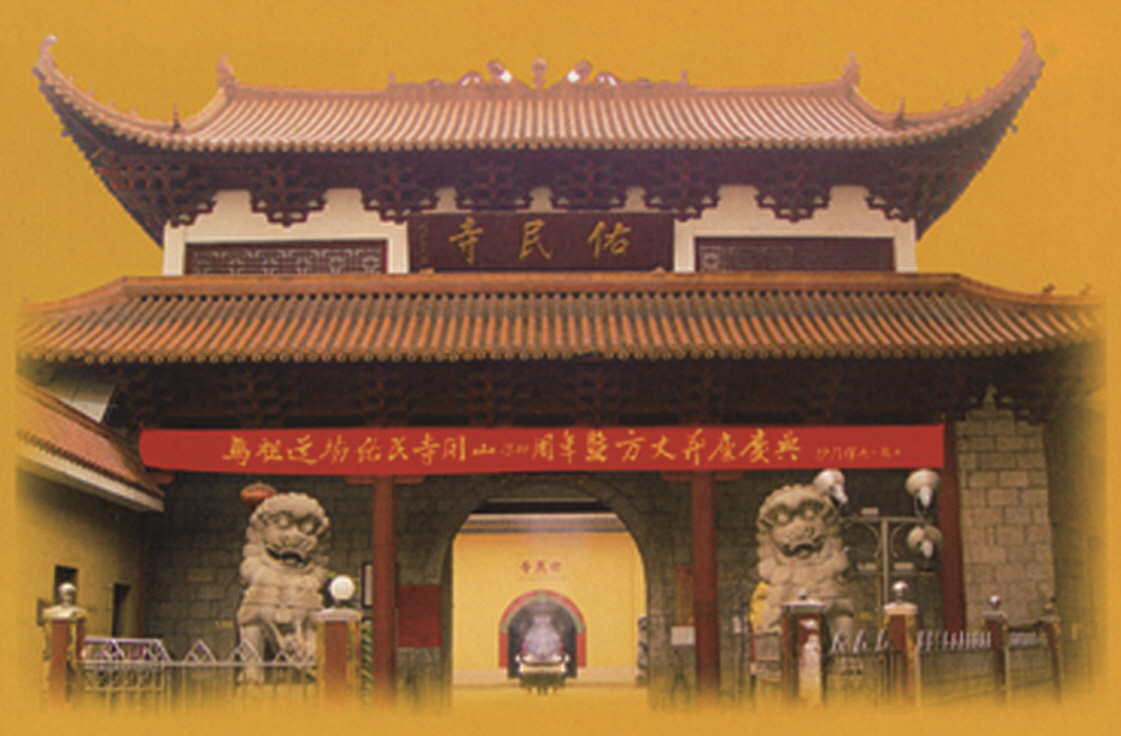
마조 스님이 주석했던 중국 강서성 홍주 개원사(현 남창 우민사) 모습
서당지장(西堂地藏)과 백장회해(百丈懷海)는 마조의 수제자들이었다. 『벽암록』의 ‘마조완월(馬祖玩月)’ 고사에 따르면 전자는 경(經)에 후자는 선(禪)에 밝았다. 지장의 처신은 책상물림답다. 머리를 쥐어짜는 일에 익숙하고 무엇보다 핑계를 대는 일에 능숙하다. 반면 회해는 복잡한 것은 딱 질색인 선승이다. 그리고 해답을 얻지 못해 답답한 자에게, 마조는 뜬금없이 머리 색깔을 운운하며 끝까지 모르쇠 타령이다.
이들을 본떠서 엉뚱한 이야기 한 토막.
바둑의 역사는 5천년을 헤아린다. 바둑을 발명했다고 추정되는 인물은 전설상의 성왕인 요(堯) 임금이니, 중국의 출발과 함께 시작된 게임인 셈이다. 또한 구경만으로도 제법 흥미로운 게 바둑이다. 백돌과 흑돌이 한 집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분투를 적은 기보(棋譜)는, 전쟁 이전에 풍경이다. 치열하기에 앞서 아름답다.
선문답의 주인공들도 바둑을 뒀거나 최소한 바둑이 무엇인지는 알았을 사람들이다. 지장은 머리가 하얘졌을 것이고, 회해가 지향하는 무(無)는 시커멓다. 곧 지장이 백돌이라면 회해는 흑돌이다. 머리가 아프다는 지장이나 모르겠다는 회해나, 자기 삶의 당체(當體)를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머리가 아프다는 것이 어리석은 것은 아니요 모르겠다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니까. 경쟁이 아닌 관조의 영역에서 받아들이는 인생은 그다지 복잡하지도 아리지도 않다. 그냥 바라보면 그만인데, 대개는 훔쳐보거나 노려보는 통에 정작 봐야할 것을 못 본다.
아울러 도진개진. 어차피 아무리 싸워봐야 알음알이와 말다툼으로는 진리를 인식하지 못한다. 마조의 딴청은 쓸데없는 망상 피우지 말고 마음을 정히 다스리라는 무언의 훈수로도 들린다. 깨달음은 ‘깨달음’이란 글자에만 있다. 쉬는 것과 내려놓는 것을 능가하는 정의는 없다. 끝장이 나기 전엔 결코 끝나지 않는 머리싸움.
제7칙
약산이 법좌에 오르다(藥山陞座, 약산승좌)
약산유엄(藥山惟儼) 선사는 오랫동안 법좌에 오르지 않았다. 절 살림을 맡아보는 원주(院主)가 간청했다. “대중들이 오래 전부터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스님께서는 부디 법을 설해 주소서.” 마지못해 약산은 종을 치라고 하여 대중들을 불러 모았다. 법좌에 올라 한참을 앉아 있던 그는, 이내 자리에서 내려와 방으로 돌아갔다. 화가 난 원주가 꽁무니를 쫓으며 따졌다. “큰스님께서는 대중에게 설법을 해주시겠다더니 어찌하여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약산이 어이 없어하며 대꾸했다. “경에는 경사(經師)가 있고 논에는 논사(論師)가 있거늘 어찌 노승을 괴이하게 여기느냐!”
제1칙 ‘세존승좌’의 반복이다. 불립문자(不立文字)를 신조로 하는 선사에게 입방정을 요구했으니, 당연히 불쾌할 일이다. 그나저나 절에 스님의 법문이 없으니, 절은 무얼 먹고 살는지…라는 입방정.
제8칙
백장과 여우(百丈野狐, 백장야호)
백장이 상당(上堂)해 법문을 하면 한 노인이 나타나 법문을 듣다가 대중이 흩어지면 홀연히 사라지곤 했다. 어느 날은 법문이 끝났음에도 떠나지 않자 백장이 물었다. “그대는 누구인가?” 노인은 사연을 설명했다. “저는 본래 가섭부처님 때에 이 산에 살았었습니다. 한번은 어떤 학인이 ‘뛰어난 수행자도 인과(因果)에 떨어집니까?’라고 묻자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대답했다가 그 과보로 여우의 몸을 받아 500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큰스님께 청하노니 한 말씀을 내려주소서.” 이에 백장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나는 인과에 어둡지 않다[不昧].” 노인은 이 말끝에 크게 깨달았다.
가섭(迦葉)은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은 후계자다. 오랜 세월 고생하던 노인은 결국 여우의 몸을 벗고 극락왕생했다는 후문이다. 인과에 대한 통찰로 인해 절대적인 안식을 얻은 셈이다. 죽지 못해 살다가 비로소 죽었으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결과가 있는 건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때리면 아프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벌은 늦게 오더라도 기어이 온다. 살아 있는 것은 응당 죽어야 하며, 죽은 것은 또 다른 몸으로 태어나 뒹굴고 더러워지게 마련이다. 이렇듯 인과는 세계를 떠받치고 인생을 지배하는 법칙이다. 왕후장상은 물론 선지식이라도 인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살아 있는 것들은 전부 몸을 지니며, 그 몸은 시련과 불운을 당하기 위해 존재한다. 예컨대 샘물의 몸뚱이는 잔잔하여 반드시 누군가 와서 돌을 던지며, 하늘의 몸뚱이는 파래서 기필코 먹구름이 끼게 되어 있다.
‘불매(不昧)’란 ‘어둡지 않다’ 혹은 ‘어리석지 않다’는 뜻으로, 그만큼 백장이 인과의 이치를 잘 알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반면 콩을 심었음에도 팥이 나기를 원한다면, 이는 무지이거나 기만이다. 노인은 진실을 속인 죄로 평생을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업보를 받았다. 여우는 잔꾀가 많은 만큼 의심이 많은 동물이다. 야호선(野狐禪)은 겉으로는 자비를 운운하지만 본색은 양아치와 다를 바 없는 수행자를 꼬집는 말이다. 갖은 거짓말과 해코지로 사회를 불바다로 만드는 불여우들은 지구촌 곳곳에서 눈에 밟힌다.
모든 생명은 시간에 허물어지고 타자(他者)에 시달려야 하는 육체성을 극복할 수 없다. 물론 무시할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일정한 용기가 필요하다. 쓰러지면 기어가고, 넘어지면 쉬어가고, 비가 오면 이참에 빗물로 샤워나 하자는 긍정. 마찬가지로 누구나 인과에 매여 있다. 다만 인과를 흔쾌히 감내할 수 있다면, 삶이 덜 괴롭고 죽음이 덜 무서울 것이다. 아, ‘되는 대로’ 살 수 있다면!
저작권자(©) 월간 고경.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뉴스
-

가야산에 흐르는 봄빛을 몇 번이나 보았던가!
지난 2월 16일 백련암에서 신심 깊은 불자님들의 동참 속에 갑진년 정초 아비라기도 회향식을 봉행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하고, 저마다 간절한 서원 속에 한 해를 밝힐 공덕을 쌓아 …
원택스님 /
-

기도는 단지 참선을 잘하기 위한 방편인가?
참선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참선이란 수행법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수행법 중에 “오직 참선만이 가장 수승한 수행법이요, 나머지 다른 수행법들은 참선을 잘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
일행스님 /
-

얼굴 좀 펴게나 올빼미여, 이건 봄비가 아닌가
여행은 언제나 좋은 것입니다. 예전처럼 가슴이 두근거리지는 않지만, 마음속 깊이 잔잔한 기쁨이 물결칩니다. 숙소는 64층인데, 내려다보는 야경이 아름답습니다. 이 정도 높이면 대체로 솔개의 눈으로 …
서종택 /
-

말법시대 참회법과 석경장엄
『미륵대성불경』에서 말하길, 미래세에 이르러 수행자가 미륵에게 귀의하고자 한다면 먼저 과거칠불에게 예배하고 공양하여 과거업장이 소멸되고 수계를 받아야 한다. 신라시대부터 일반 대중은 연등회와 팔관회…
고혜련 /
-

봄나물 예찬
바야흐로 들나물의 계절이 도래하였습니다. 도시에 살면서 아주 작은 주말농장을 통해 수확의 기쁨을 누리면서 24절기에 늘 진심입니다. 『고경』을 통해 여러 번 언급하곤 했지만 절기를 통해 깨닫게 되는…
박성희 /
※ 로그인 하시면 추천과 댓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