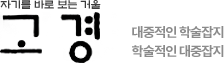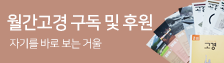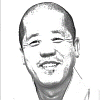[보림별어]
서문이 어디론가 사라지다
페이지 정보
원철스님 / 2014 년 12 월 [통권 제20호] / / 작성일20-05-22 08:32 / 조회5,600회 / 댓글0건본문
제목에 목숨 거는 시대
오랜만에 서문을 썼다. 같은 매수의 글이라고 할지라도 ‘서문’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 때문에 전전긍긍하게 된다. 남의 책 서문이 아닌지라 그나마 다행이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더 공을 많이 들이는 부분은 그 서문의 소제목이다. 조선함허(涵虛, 1376~1433) 선사의『금강경오가해』서문은 ‘일물서(一物序)’라고 부른다. “유일물어차(有一物於此,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고인들은 지금 우리처럼 서문 제목을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 첫 문장을 당연히 제목으로 ‘알아서 알아듣기’ 때문이다. 당나라 청량징관(淸凉澄觀, 738~839) 스님의 대작『80화엄경』서문도 그냥 제목이 ‘왕복서(往復序)’이다. 이것 역시 첫 문장이 “왕복무제(往復無際, 가고 옴이 끝이 없으나)”이므로 ‘알아서’ 후학들이 소제목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제 시절이 그런 시절이 아니라 ‘제목에 목숨을 거는 시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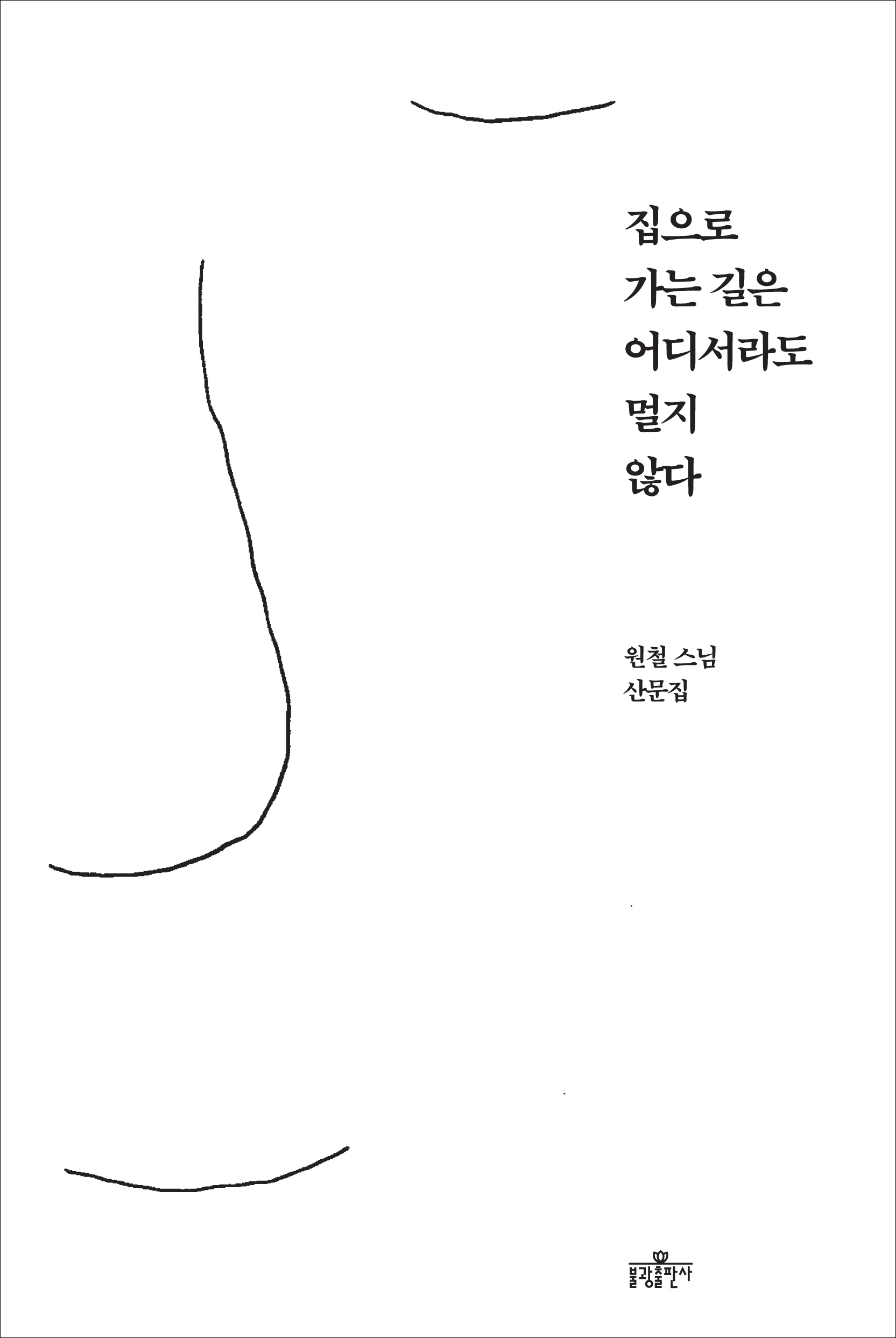
<집으로가는길은 어디라도 멀지 않다> 표지
서문을 완성한 후 소제목인 ‘은둔과 노출 사이에서’를 뽑느라고 적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책이름은 이미 출판사에서『집으로 가는 길은 어디서라도 멀지 않다』라고 근사하게 붙여놓았다. 장황하긴 하지만 서문의 많은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인생이란 은둔과 노출의 반복이다
인터넷 시대인지라 갖가지 노출화면이 사이버 공간에 가득하다. 검색어만 두드리면 회사 단체 개인 할 것 없이 저마다 한껏 멋을 부린 ‘드러냄의 공간’을 자랑한다. 누구든지 까맣게 잊히는 것을 원하진 않지만 때로는 잊히고 싶은 부분도 있기 마련이다. 그런 까닭에 원하지 않는 사이버상의 노출을 청소해주는 전문업체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드러내고자 하는 권리만큼 감추고자하는 권리도 인정해야 한다는 욕구가 자연스럽게 사업 아이템에 반영된 것이다. 빛이 강할수록 그만큼 그늘도 짙은 것이 인터넷속의 인생사라고 하겠다.
알고 보면 산다는 것은 결국 드러냄과 감춤의 반복이다. 출근이 드러냄이라면 퇴근은 감춤이다. 화장이 노출을 위한 것이라면 민낯은 은둔을 위한 것이다. 피부를 밤새 쉬게 해줘야 화장발이 잘 받는 것처럼 퇴근 후 제대로 은둔해야 이튿날 자기역량을 마음껏 노출시킬 수 있다. 도시적 일상이 노출이라면 주말을 이용한 잠깐의 템플스테이는 재충전을 위한 은둔이라 하겠다.
연휴와 휴가도 마찬가지다. 우리들의 현실은 제대로 된 노출을 위해 어떤 형태로건 은둔을 위한 나름의 처방책을 가져야 할 만큼 복잡다단한 시대에 살고 있다. 어쨌거나 노출로 인한 피로와 허물은 은둔을 통해 치유하고, 은둔의 충전은 다시 노출을 통해 확대재생산하는 선순환구조를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
과거에도 그랬다. 벼슬살이가 자발적 노출이라면 유배를 가는 것은 비자발적 은둔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둔지에서 나름의 노출방법을 구사하면서 갖가지 풍성한 유배지 문학과 예술세계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모두가 그랬던 건 아니다. 허구한 날 임금이 있는 방향을 향해 큰절을 하며 불러줄 날만 기다리다 허송세월한 이도 부지기수다. 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주먹을 불끈 쥐면서 “나가기만 하면 누구누구는 꼭 손 좀 봐 줘야겠다.”를 반복하다가 화병으로 죽어나간 이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비자발적 은둔이지만 자발적 은둔으로 승화시킬 수만 있다면 귀양 역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된다.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현직에 있을 때보다 물러난 뒤에 더 빛나는 이가 제대로 산 것이라고 할 것이다.
노출해야 할 때 은둔을 고집하면 ‘현실 도피’가 되고, 은둔해야 할 때 노출을 고집한다면 ‘전관예우’내지는 ‘00피아’라는 딱지가 붙게 된다. 따라서 노출할 때와 은둔할 때를 잘 구별하는 것은 개인의 일인 동시에 사회적 의무이기도 하다. 국가적으로 은둔을 제도화한 것이 정년이다. 그런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은둔기간이 너무 길어져 ‘노출30년 은둔30년’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제 노출방법보다 은둔방법이 더 중요한 시대적 화두가 되었다.
수십 년 전에 출가라는 형식을 통해 은둔적 삶의 방식을 선택했다. 입산초기에는 가당찮게도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내가 사라지게 해 달라’고 기도할 정도였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실제적 은둔기간은 딱 십년이었다. 이후 은둔은 은둔이 아니었다. 종교적 은둔은 (성철 스님처럼) 그 자체가 곧 노출을 의미한다는 아이러니도 알게 되었다. 차츰차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만큼 내공도 쌓여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노출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오히려 적극적인 노출로 화답했다.
노출의 극치는 종로 조계사에서 7년가량 보낸 수도승(首都僧:서울에 사는 승려)생활이었다. 하지만 그 시기엔 노출 속에서 나름 은둔을 추구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여겼다. 유수 신문사 기자는 만날 때마다 과다 노출된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조언해 주었다. 덕분에 도시에서도 산에 사는 것처럼 살려고 무진 애를 썼다. 그러던 어느 날 은둔과 노출이 둘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도시와 산중을 구별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산은 산이고 도시는 도시였다. 3년 전(2011년) 늦은 가을날 서울살이의 묵은 둥지를 털고 세속을 여읜다〔俗離〕는 이름을 따라 속리산으로 들어갔다. 산행과 포행(산책)을 살림살이로 삼아 한동안 지내다가 다시 가야산으로 거처를 옮겼다. 외형은 은둔생활이었지만 대표적 노출증세인 글쓰기는 일간지와 월간지 등을 통해 자의반 타의반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이 소박한 책 역시 그런 과정을 포함한, 과감한 노출을 권하는 출판사의 독려 결과물이다.
『보림전』에는 서문이 없다
서문은 남이 서술하든지 자기가 정리하건 간에 예의상 공치사(?)와 자화자찬이 감초처럼 들어가기 마련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그 책이 나오게 된 저간의 사정과 과정일 것이다. 그래서 간기(刊記)와 더불어 서지학상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취급된다. 하지만『보림전』에는 아무 것도 없다. 권1의 시작은 “이상결삼지(以上缺三紙, 앞부분 3장 없음)”라고 부기한 데서 보듯 앞부분이 떨어져 나간 채로 발견되었다. 또 끝부분인 권10은 통째로 종적이 묘연하다. 서문 발문이 전혀 없는 까닭에 고서점에 내놓는다면 그 책의 가치와 상관없이 가격은 뚝 떨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새기지 않는 비석인 백비(白碑)처럼 서문이 없는 책이 주는 신비감을 즐기는 것도 괜찮은 일이라 생각된다.
저작권자(©) 월간 고경.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뉴스
-

‘옛거울古鏡’, 본래면목 그대로
유난히 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불면석佛面石 옆 단풍나무 잎새도 어느새 불그스레 물이 들어가는 계절입니다. 선선해진 바람을 맞으며 포행을 마치고 들어오니 책상 위에 2024년 10월호 『고경』(통권 …
원택스님 /
-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물병 속에 있다네
어렸을 때는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 시절에 화장실은 집 안에서 가장 구석진 곳에 있었거든요. 무덤 옆으로 지나갈 때는 대낮이라도 무서웠습니다. 산속에 있는 무덤 옆으로야 좀체 지나…
서종택 /
-

한마음이 나지 않으면 만법에 허물없다
둘은 하나로 말미암아 있음이니 하나마저도 지키지 말라.二由一有 一亦莫守 흔히들 둘은 버리고 하나를 취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두 가지 변견은 하나 때문에 나며 둘은 하나를 전…
성철스님 /
-

구루 린뽀체를 따라서 삼예사원으로
공땅라모를 넘어 설역고원雪域高原 강짼으로 현재 네팔과 티베트 땅을 가르는 고개 중에 ‘공땅라모(Gongtang Lamo, 孔唐拉姆)’라는 아주 높은 고개가 있다. ‘공땅’은 지명이니 ‘공땅…
김규현 /
-

법등을 활용하여 자등을 밝힌다
1. 『대승기신론』의 네 가지 믿음 [질문]스님, 제가 얼마 전 어느 스님의 법문을 녹취한 글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이렇게 여쭙니다. 그 스님께서 법문하신 내용 중에 일심一心, 이문二…
일행스님 /
※ 로그인 하시면 추천과 댓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