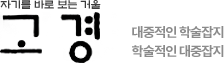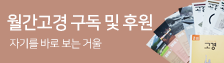[선어록의 뒷골목]
말은 삶을 빛나게 해주지만, 그 빛에 눈이 멀 수도 있다
페이지 정보
장웅연 / 2015 년 1 월 [통권 제21호] / / 작성일20-05-22 08:32 / 조회5,721회 / 댓글0건본문
이번 호부터는 장웅연 님의 ‘선어록의 뒷골목’을 연재합니다. 장웅연 님은 대표적인 선서(禪書)로 꼽히는 『종용록』의 화두를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줄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뒷골목은 음침하다. 때론 위험하다. 그러나 조용하다. 생각을 비우거나 다듬기에 더없이 적절한 공간이다. 휘영청 달이라도 떠주면 생각엔 날개가 돋친다. 그 누가 들어주지 않아도 뿌듯하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훨훨 날아다닌다. 도시 곳곳이 감춘 고독과 절세의 뒤안길은 나에게 요람이고 법당이다.
내가 다니는 회사의 책상 한편엔 <선림고경총서(禪林古鏡叢書)>가 20권쯤 꽂혀 있다. 조사선(祖師禪)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편찬된 선어록들의 묶음이다. 밥벌이의 피로와 위선에 지칠 때마다 몇 장씩 들춰본다. 마음 다잡자고 읽는 책이지만, 달콤한 교훈이나 솔깃한 처세술 따위는 담겨 있지 않다. 극단적인 비약과 여백의 언어는 웬만한 세상사보다 복잡하고 어이가 없다.
선어록은 부담스러운 텍스트다. 우선 읽기 자체가 녹록치 않다. 대부분 길어야 너덧 마디를 넘지 않는 대화 형식이지만, 외려 너무 짧다는 게 문제다. 독자의 이해를 돕는 설명도, 이야기의 재미를 북돋우는 서사적 장치도 없다. 딱딱하고 건조하며 밋밋하고 무정하다. 그럼에도 그토록 단조롭고 까칠한 글줄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어찌 보면 정말 짧아서이다. 가장 간명한 어법으로 존재의 의미를 단박에 그리고 명쾌하게 일러준다.
사실 어록에서 선사들이 전하고자 하는 가르침은 분량만큼이나 단출하다. 일언이폐지하면, ‘그냥’ 살라는 것이다. 당장의 꿀맛 같은 행복도 인연이 다 하면 속절없이 허물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 또한 이와 같은 이치로 끔찍한 불행이란 것도 종국엔 한 조각 거품으로 오므라들리라는 것. 빛은 어둠의 절반이고 삶은 죽음이 먹다 남긴 찌꺼기라는 것. 도에 넘치게 욕심내지 말고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며 중심을 잡으라는 것 등속의 잠언은 귓가에 오래 남는다.
물론 이렇듯 호기롭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쪽엔 켕기는 구석이 있다. 선어록은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읽어야 한다는 채근을 자주 들었다. 오랜 수행이 바탕이 되어야만 역대 선사들의 경지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선가(禪家)의 지고한 전통이다. 개인적으로 3000배나 간화선 용맹정진은커녕 좌복에 땀 한 방울 흘려본 적 없는 처지다. ‘교수도 법사도 아닌 일개 재가불자의 선어록 해설을 누가 들어주기나 할까’라는 계급적 열등감도 부정할 수 없는 벽이다.
그러나 독서라는 관점에만 집중하면 응어리는 의외로 쉽게 풀어진다. 하늘 아래 모든 글월들은 읽으라고 내놓인 것이다. 저자는 있겠지만 주인은 없는 구조다. 시장과 도서관에 널린 책들을, 자기만의 취향으로 즐기거나 제 나름의 사유로 곱씹으면 그만이다. 독서는 기술이 아니라 취미라는 상식을 새삼 깨닫게 되는 대목이다. 선어록도 한낱 책이며, 차근차근 정독하고 깜냥에 발맞춰 독해하면서 주관과 객관의 간극을 줄여 나가면 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다만 읽음이라는 행위와 읽음에 대해 표현하는 행위는 엄연히 다른 맥락임을 잘 알고 있다. 독서는 소비일 수 있으나, 비평은 소비여선 안 된다. 일관되게 논리적이어야 하며 가일층 객관적이어야 한다. 아름답다면 금상첨화다. 이는 원고료를 받아낼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이러한 덕목들을 지지할 수 있는 최후의 버팀목은 진정성이라고 믿는다. 나는 스님이 아니지만, 내 삶에 충실했다.
<선림고경총서> 가운데 어렵기로 따지면 『종용록(從容錄)』이 압권이다. 저본은 『굉지송고(宏智頌古)』. 중국 북송(北宋) 시대를 살았던 굉지정각(宏智正覺) 스님이 이름난 선사들의 특출한 언행을 담은 100개의 고칙(古則)에 송(頌)을 붙인 문헌이다. 여기에 만송행수(萬松行秀) 스님이 시중(示衆)과 평창(評唱)을 삽입한 것이 『종용록』이다. 『종용록』이란 명칭은 스님이 원고를 집필했던 장소인 종용암(從容庵)에서 유래한다.

선림고경총서 중 하나인 종용록
송이든 시중이든 평창이든, 한 마디로 풀이하면 논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칙(本則)의 의미를 쉽게 일러주는 해제는커녕, 한 번 더 비틀고 꼬는 말장난에 가깝다. 단, 100칙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화두는 그야말로 선어록의 핵심만을 집대성한 저작이라 볼 수 있다.
각각의 본칙에 착어를 담아 ‘나름의’ 『종용록』을 만들어보면 쓸모가 있겠다는 욕심을 몇 번 냈었다. 그 기회를 이제 얻었다. 평석(評釋)이나 훈고(訓詁)가 아니라 감상(感想)이나 한담(閑談) 쯤으로 읽어줬으면 한다. 뒷골목에서 몰래 휘파람을 부는 심정으로 쓴다.
제1칙
부처님이 법좌에 오르시다(世尊陞座, 세존승좌)
세존이 어느 날 법좌에 올랐다. 문수가 백추(白椎)를 하고서 아뢰었다. “법왕(法王)의 법을 자세히 관찰하니 법왕의 법이 이와 같습니다.” 세존이 법좌에서 내려왔다.
세존은 부처님을 뜻한다. 선의 원류는 불교이며 선종(禪宗)의 종조(宗祖)는 결국 부처님이다. 그러므로 이야기를 여는 첫머리에 부처님의 일화를 넣은 것은 당연지사다. 그러나 정작 ‘이야기’는 없다.
백추(白椎)란 추를 쳐서 법회가 열릴 것임을 대중에게 알리는 일이다. 문수(文殊)는 부처님의 제자로 최고의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이다. 그는 ‘백추’라는 한 번의 행위 안에 불교의 진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공언했다. 부처님이 자리에서 얼른 내려왔다는 건, 문수의 입장에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작 종소리 하나로 법회가 마무리된 격이다.
초등학교 시절 월요일 아침은 언제나 애국조회로 시작됐다. 1시간을 서 있어도 애국의 마음은 일어나지 않았다. 질 나쁜 마이크에서 터져 나오는 훈화는 으레 학생들의 감동이 아니라 교장의 체면을 위한 몸부림이었다. 아무리 훌륭한 말도 오래 들으면 소음이 된다. 말이 없어도 해는 뜨고 꽃은 핀다. 부처님의 침묵은 해가 뜨고 꽃이 피는 것 이상의 불법은 없음을 가르친다. 말은 삶을 빛나게 해주지만, 그 빛에 눈이 멀 수도 있다. 가장 보잘 것 없으나 가장 절대적인 음식은 맹물이다. 공기는 비어 있으나 꽉차있다.
제1칙에 대한 시중(示衆)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보인다. “문을 걸어 닫고 잠만 자는 것은 상상기(上上機)를 인도하는 길이요, 이리저리 둘러보거나 하품을 하거나 소리를 꽥 지르는 것은 중하(中下) 근기를 위한 방편이다.” 눈이 부시게 착한 마음이라도 무심(無心)에 비길 바가 못 된다. 악한 마음을 비난하고 바로잡아주려다, 또 다른 착한 마음 앞에서 재잘대고 뽐내려다, 끝내 악한 마음으로 이지러진다. 반면 무심은 최소한 중간이라도 간다.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쉴 수는 있다.
제2칙
달마의 확연함(達磨廓然, 달마확연)
양무제 : 어떤 것이 성스러운 말씀의 으뜸가는 진리인가.
달 마 : 텅 비어서 성(聖)이랄 것이 없다.
양무제 : 짐(朕)을 대하고 있는 그대는 누구인가.
달 마 : 모르겠다.
남북조시대 남조의 양(梁)을 건국하고 무제(武帝)로 등극한 소연(蕭衍)은 중국 역사에서 가장 불심(佛心)이 깊었던 황제다. 일반적인 권력자들은 성(性)에 관심이 많았지만, 양무제는 성(聖)에 탐닉했다. 재위 기간 중 지은 절만 3000여 곳이다. 금욕과 검소로 일관한 생활은, 웬만한 큰스님들의 삶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는 착한 원인을 지으면 착한 결과로 돌아온다는 인과(因果)를 철저히 믿었다.
인도에서 온 달마를 만났을 때 양무제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받고 싶었다. 하지만 달마는 “네가 무더기로 쌓은 선업(善業)은 부질없는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단히 핀잔을 주었다. 훗날 양무제에게 돌아온 보상이란 실제로 재앙이요 폐허였다. 옛 부하의 반란으로 황궁을 빼앗겼고 연금된 상태에서 굶어죽었다. 지극정성으로 세웠던 제국도 머지않아 망했다.
그는 믿었을 뿐 알지 못했다. 아무리 부처님을 위해 ‘쏴봐야’, 소원을 들어줄 부처님은 진작 사라지고 없다는 것을. 공덕(功德)이란, 확연하게 헛것이다. 성스럽다는 건 화려하고 비싸다는 것일 뿐이다.
결례를 범한 달마에게 양무제는 퉁명스럽게 물었다. “감히 황제에게 막말을 내뱉는 너는 도대체 목숨이 몇 개냐?”는 으름장에 가깝다. 이에 달마는 “모르겠다.”고 응수함으로써, 양무제를 더욱 낯뜨겁게 만들었다. ‘무식하고 졸렬한 너 따위가 알아낼 수 없는 나’라는 당찬 대답이다. 한편으론 나도 나 자신을 모르겠다는 솔직한 고백으로도 들린다.
만일 내가 정말 나라면, 고작 나라면, 당신 앞에서 어찌 이토록 당당할 수 있겠는가! ‘나’라는 관념은 얼핏 나를 보호해주는 울타리 같지만, 나를 옴짝달싹 못 하게 하는 덤불인 경우가 더 많다. 나를 밟고 일어서면, 세상도 우스워진다.
저작권자(©) 월간 고경.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뉴스
-

‘옛거울古鏡’, 본래면목 그대로
유난히 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불면석佛面石 옆 단풍나무 잎새도 어느새 불그스레 물이 들어가는 계절입니다. 선선해진 바람을 맞으며 포행을 마치고 들어오니 책상 위에 2024년 10월호 『고경』(통권 …
원택스님 /
-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물병 속에 있다네
어렸을 때는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 시절에 화장실은 집 안에서 가장 구석진 곳에 있었거든요. 무덤 옆으로 지나갈 때는 대낮이라도 무서웠습니다. 산속에 있는 무덤 옆으로야 좀체 지나…
서종택 /
-

한마음이 나지 않으면 만법에 허물없다
둘은 하나로 말미암아 있음이니 하나마저도 지키지 말라.二由一有 一亦莫守 흔히들 둘은 버리고 하나를 취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두 가지 변견은 하나 때문에 나며 둘은 하나를 전…
성철스님 /
-

구루 린뽀체를 따라서 삼예사원으로
공땅라모를 넘어 설역고원雪域高原 강짼으로 현재 네팔과 티베트 땅을 가르는 고개 중에 ‘공땅라모(Gongtang Lamo, 孔唐拉姆)’라는 아주 높은 고개가 있다. ‘공땅’은 지명이니 ‘공땅…
김규현 /
-

법등을 활용하여 자등을 밝힌다
1. 『대승기신론』의 네 가지 믿음 [질문]스님, 제가 얼마 전 어느 스님의 법문을 녹취한 글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이렇게 여쭙니다. 그 스님께서 법문하신 내용 중에 일심一心, 이문二…
일행스님 /
※ 로그인 하시면 추천과 댓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