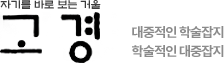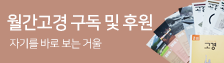[명추회요, 그 숲을 걷다]
갈대꽃이 물밑으로 잠긴다
페이지 정보
박인석 / 2016 년 11 월 [통권 제43호] / / 작성일20-05-22 08:32 / 조회4,923회 / 댓글0건본문
이번에 같이 읽어볼 부분은 <명추회요>의 358쪽에서 365쪽까지 나오는 무심(無心)에 대한 내용이다. 무심이란 용어를 말 그대로 풀어보면 ‘마음이 없다’라고 새겨볼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이 없다’는 말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음을 곧장 느끼게 된다. 이 무심이라는 용어는 선종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성철 선사께서는 <선문정로(禪門正路)>의 1장 견성성불(見性成佛)의 첫 머리에서 견성(見性)을 무심(無心)과 딱 연결시켜 놓으셨는데, 그 문구는 바로 <종경록> 1권과 한글본 <명추회요>의 55쪽에 나와 있는 연수 선사의 말씀이다.
<종경록>의 “재득견성, 당하무심(纔得見性當下無心)”이라는 구절을 성철 선사께서는 “견성(見性)을 하면 즉시(卽是)에 구경무심경(究竟無心境)이 현전(現前)하여”라고 해석하신 뒤, “일체망념(一切妄念)이 단무(斷無)하므로 이를 무념(無念) 또는 무심(無心)이라 부른다.”라고 설명하신다. 이 설명에 따르면 무심이란, 허망한 마음이 싹 사라진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허망한 마음이 사라진 자리에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진여(眞如)의 태양이 항상 빛나고 있다는 점에서 무심은 망념을 부정함과 동시에 진여를 긍정하는 개념이다.
무심하면 저절로 편안하다
<명추회요> 358쪽에는 ‘무심하면 저절로 편안하다’는 제목 아래 무심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명추회요>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종경록>을 보면 무심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전에 ‘안심(安心)’에 대한 내용이 길게 이어지는데, 주요하게는 중국 천태종과 화엄종에서 말하는 안심법문(安心法門)을 소개한 것이다. 안심이란 ‘마음을 편하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 천태종과 화엄종은 선종과 대비시키면 교종(敎宗)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연수 선사는 교종을 대표하는 두 종파의 안심(安心) 법문과 대비시켜 선종에 무심(無心) 법문이 있음을 강조한다.
앞에서는 천태(天台)의 가르침에 의거해 오백 가지 안심법문(安心法門)이 모두 근기에 맞추어 병을 따라 약을 준 것임을 밝혔다.
이제 조사의 가르침에 의거해 한 가지 법문을 더하니,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심(無心)이다. 무엇 때문인가? 마음이 있으면 불안하지만 무심하면 스스로 즐겁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중국 선종의 2조 혜가(慧可) 선사가 소림사에서 면벽 중이던 달마 대사를 찾아가 나눈 문답과 무척 흡사하다. 혜가 선사는 원래 불교의 경론을 깊이 연구한 스님이었는데, 마음 한 구석에 늘 알지 못할 불안함이 있었다. 아마 경을 많이 읽어도 사라지지 않는 실존적인 불안감이었던 것 같다. 그러던 중 마음을 단박에 밝히는 선(禪)의 가르침을 전하는 인도 스님 한 분이 소림사에서 면벽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소림사를 찾았다.
달마 대사는 혜가 스님을 만나주지 않았다. 혜가 스님 역시 물러서지 않고 눈이 펑펑 내리는 달마 대사의 처소 앞에서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렇게 삼 일 정도 지난 뒤, 달마 대사는 혜가 스님의 정성에 감복하여 그를 돌아보며 “왜 왔느냐?”고 물었고, 혜가 스님은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왔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 대답을 듣고서 달마 대사는 “그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면, 내가 그 마음을 편안케 해주겠다.”라고 재차 말했고, 그 말씀에 당황한 혜가 스님은 “그 마음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솔직히 답하였다. 그 순간 달마 대사는 “내가 그대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노라.”고 담담히 말씀하셨고, 혜가 대사는 끊임없이 불안하던 마음에서 훌쩍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 선종에서는 이를 ‘마음을 편하게 한 법문’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의 중심에는 ‘찾아도 찾을 수 없는 마음’에 대한 자각이 들어 있다. 이런 자각을 또한 ‘무심’이라 부를 수 있다.
무심하다면 허망은 무엇을 의지해 일어나는가
달마 대사와 혜가 선사의 문답을 통해 그간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기도 했을 테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이해하기 어려워했을 수도 있다. 아마 10세기에 활동했던 연수 선사의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다. 가령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심리 활동들이 끊임없이 생겼다 사라지는 것을 생생히 느끼고 있다. 그런데 ‘무심’, 곧 ‘마음이라고 할 것이 없다’면, 우리의 무상한 심리 활동은 무엇에 근거해서 발생하는가? 이런 의문점이<명추회요>의 360쪽에 그대로 나타난다.
【물음】 본래부터 무심하다면 허망함은 무엇을 의지해 일어나는가?
【답함】 본래부터 무심한 줄 깨닫지 못한 것을 허망이라 한다. 만약 본래부터 무심한 줄 알면 허망함이 일어날 곳도 없고 진실을 얻을 곳도 없다.
불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비유 가운데, 본래 없지만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례의 대표적인 것으로 허공꽃(空花)을 들 수 있다. 사람이 열병에 걸리거나 눈병에 걸리면 아무 것도 없는 허공에 마치 꽃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그 허공꽃을 진짜라고 믿고, 그것의 색깔이 붉다거나, 꽃잎이 몇 장이라거나 하는 등의 분별을 일으키는 일이다. 허공꽃에 대해서는 그것의 색깔과 모양을 논하기 앞서 그것이 진짜 존재하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있지도 않은 허공꽃에 대해 색깔과 모양을 자꾸 얘기하는 것을 희론(戱論)이라고 한다. 즉 답도 없이 논의만 무성해지는 말씀이란 뜻이다. 허공꽃에 대한 논의가 희론에 해당하는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허공꽃이 본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허공꽃이 본래 없는 것임을 알면, 허공꽃의 색깔과 모양을 분별하던 잘못된 생각뿐 아니라, 그것의 잘못을 가리키던 지혜로운 사람의 지적 역시 같이 사라지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본래는 망념이 없는 진실한 상태였지만, 그런 줄 모르기 때문에 허망한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었으므로, 본래 무심한 줄 알면 허망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허망을 지적하는 진실도 함께 사라진다는 점을 위의 문답은 말해주고 있다.
갈대꽃은 물밑으로 잠긴다
연수 선사가 활동하던 10세기 중국 불교계는 오늘날 널리 퍼져 있는 간화선(看話禪) 수행이 아직 등장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12세기에 활동했던 대혜종고(大慧宗杲, 1089-1163) 선사 이후 간화선은 선종 수행의 핵심이 되었고, 무심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앞서 성철 선사께서 견성(見性)하면 곧장 무심(無心)해짐을 강조하신 것처럼, 화두를 참구하는 방법이 견성의 지름길이 되었다. 한편 무심의 경계에 다가서기 위해 화두 참구를 강조한 것은 지눌(知訥, 1158-1210) 스님의<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幷入私記)>에도 나타나지만, 지눌 스님은 중국의 종밀(宗密, 780-741) 스님의 입장에 따라 돈오점수(頓悟漸修)를 수증론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반면<종경록>을 편찬한 연수 선사는 종밀을 비판하고 돈오돈수(頓悟頓修)의 관점에서 선종의 수증론을 재편하였는데, 이는 위의 인용문에서 ‘무심(無心)’을 강조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 견해는 성철 선사에게도 그대로 전해진다.
다시 논의로 돌아가 보자. 우리는 지금 짧은 지면을 통해 ‘무심’에 대해 몇 가지 얘기를 나누고 있다. 그러나 그림의 떡을 아무리 보아도 배가 부르지 않은 것처럼, 문자를 통해 ‘무심’을 얘기해도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아주 자명한 이치일 것이다. 어떤 문제는 아무리 캐물어도 답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명추회요> 364쪽의 문답으로 이에 대한 답을 대신하고자 한다.
【물음】 있고 없다는 견해를 지을 수 없다면 어떤 것이 무심을 바르게 깨닫는 것인가?
【답함】 돌 호랑이 산 앞에서 싸우고, 갈대꽃은 물밑으로 잠긴다.
말의 문이 막히고 생각의 길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하여 선사들은 시(詩)를 남기기도 하는데, 아마 위의 문답이 그런 경우일 것이다. 연수 선사는 끝도 없이 이어지는 우리의 사량분별(思量分別)을 탁 막아버렸다. 그러나 그 막힌 곳이 도리어 무심(無心)으로 통하는 길일지도 모른다.
저작권자(©) 월간 고경.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뉴스
-

‘옛거울古鏡’, 본래면목 그대로
유난히 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불면석佛面石 옆 단풍나무 잎새도 어느새 불그스레 물이 들어가는 계절입니다. 선선해진 바람을 맞으며 포행을 마치고 들어오니 책상 위에 2024년 10월호 『고경』(통권 …
원택스님 /
-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물병 속에 있다네
어렸을 때는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 시절에 화장실은 집 안에서 가장 구석진 곳에 있었거든요. 무덤 옆으로 지나갈 때는 대낮이라도 무서웠습니다. 산속에 있는 무덤 옆으로야 좀체 지나…
서종택 /
-

한마음이 나지 않으면 만법에 허물없다
둘은 하나로 말미암아 있음이니 하나마저도 지키지 말라.二由一有 一亦莫守 흔히들 둘은 버리고 하나를 취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두 가지 변견은 하나 때문에 나며 둘은 하나를 전…
성철스님 /
-

구루 린뽀체를 따라서 삼예사원으로
공땅라모를 넘어 설역고원雪域高原 강짼으로 현재 네팔과 티베트 땅을 가르는 고개 중에 ‘공땅라모(Gongtang Lamo, 孔唐拉姆)’라는 아주 높은 고개가 있다. ‘공땅’은 지명이니 ‘공땅…
김규현 /
-

법등을 활용하여 자등을 밝힌다
1. 『대승기신론』의 네 가지 믿음 [질문]스님, 제가 얼마 전 어느 스님의 법문을 녹취한 글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이렇게 여쭙니다. 그 스님께서 법문하신 내용 중에 일심一心, 이문二…
일행스님 /
※ 로그인 하시면 추천과 댓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