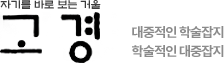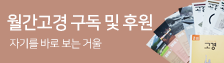[백일법문 해설]
공의 네 가지 의미
페이지 정보
서재영 / 2017 년 2 월 [통권 제46호] / / 작성일20-05-22 08:32 / 조회5,697회 / 댓글0건본문
불교하면 공사상(空思想)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공사상은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이자 존재의 실상을 설명하는 교설이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공이라고 하면 눈앞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빔’만을 떠올린다. 모든 존재의 실상은 실체가 없는 ‘텅 빔’이 맞지만 그렇다고 공을 ‘아무 것도 없음’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극단에 치우친 변견이다. 공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존재는 개체라는 실체가 없이 수많은 조건에 의해 직조된 관계의 산물일 뿐이다.

부여 궁남지의 연꽃 사진=서재영
존재에 대한 설명은 종교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온 우주를 법계연기(法界緣起)라는 하나의 관계망으로 설명하는 화엄종에서도 공은 중요한 개념으로 채용된다. 공을 설명하는 법장의 교설 중에 하나가 바로 ‘진공사의(眞空四義)’이다. 공의 참다운 의미에 대해 네 가지로 설명하는 교설이다.
진공사의에서는 공의 개념을 공 자체만으로 설명하지 않고 공의 반대개념인 색(色)과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한다. 무엇이 비었다[空]는 개념이 성립하려면 당연히 무엇이 있다[有]는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장은 색과 공의 관계를 통해 진공의 네 가지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진공에 전체적으로 네 가지 뜻이 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버리고 남을 이루는 뜻이니(廢己成他義), 공이 그대로 색이기 때문이다. 즉 색은 드러나고 공은 숨는 것(色現空隱)이다. 두 번째는 남을 버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뜻(泯他顯己義)이니, 색이 공이기 때문이다. 즉 색이 다하고 공이 드러나는 것(色盡空顯)이다. 세 번째는 자기와 남이 함께 존재하는 뜻(自他俱存義)이니, 숨는 것과 드러남이 둘 아닌 것(隱顯無二)이 진공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색이 공과 다르지 않은 것(色不異空)을 환색(幻色)이라 하니 색이 존재하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은 것(空不異色)을 진공(眞空)이라 하니 공이 드러난다. 서로 장애하지 않아 둘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자기와 남이 함께 없어지는 뜻(自他俱泯義)이니, 전체가 상즉하여 완전히 빼앗아 색・공 둘을 없애서 양변을 끊어 버리기 때문이다.” -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
자신을 숨기고 남을 드러내다
진공의 첫 번째 의미는 ‘자기를 버리고 남을 이룸[廢己成他]’이다. 여기서 ‘자기[己]’란 ‘공(空)’을 의미하고, ‘남[他]’이란 공의 반대 개념인 ‘색(色)’을 말한다. 흔히 공이라고 하면 아무 것도 없는 ‘텅 빔’으로 이해하지만 공의 첫 번째 의미는 공은 숨고 색이 전면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모든 존재는 허공처럼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갖가지 사물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 감각의 대상으로 인지되는 대상은 공이 아니라 ‘색(色)’이라는 사물들이다. 하지만 그 색의 본질을 깊이 궁구해 보면 모든 개체는 실체가 없는 공이다. 따라서 우리가 보는 공의 첫째 모습은 ‘텅 빔’이 아니라 색이라는 무수한 존재들이다.
공은 색의 그늘 밑으로 ‘자신을 숨김[廢己]’으로써 자신을 드러낸다. 만약 공이 뒤로 숨지 않고 전면으로 드러난다면 눈앞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 사라지게 된다. 공이 전면으로 드러나는 순간 그 ‘텅 빔’이라는 속성 때문에 공조차도 존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은 색을 전면에 드러내고 자신은 뒤로 숨는 것이다[色現空隱].
공이 뒤로 숨는 이유는 사물[色]이 없으면 공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공은 색으로 표현되는 존재들에 의지해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 이런 원리를 화엄의 십현문에서는 ‘탁사현법(託事顯法)’이라고 설명한다. 사물에 의탁해서 공이라는 존재의 실상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내가 보는 것은 한 송이의 꽃, 한 그루의 나무, 하나의 생명체들이다. 그 모든 존재의 본질을 궁구해 들어가면 개체의 본성은 공하다. 비록 공이 전면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모든 사물의 근저에는 공이 조용히 도사리고 있다. 눈앞에 색이라는 존재는 있지만 그 본질은 공하기 때문에 색을 보는 것이 곧 공을 보는 것이 된다[色卽是空]. 이처럼 공을 아무 것도 없는 ‘텅빔’으로만 이해하면 공을 왜곡하는 것이다.
남을 숨기고 자신을 드러내다
진공의 두 번째 의미는 ‘남을 버리고 자기를 드러냄[泯他顯己]’이다. 여기서 ‘남’은 ‘색’을 의미하고, 자신은 ‘공’을 의미한다. 감각기관으로 인식하는 것은 눈앞에 펼쳐진 존재의 세계, 즉 색의 세계이다. 우리는 눈앞에 드러난 색에 현혹되어 세상에는 색이라는 유(有)만 있고 공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색의 실체를 탐구해 들어가면 색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 송이 국화꽃은 눈으로 보면 꽃이라는 독자적 개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화의 실체를 파고들어 가면 국화라는 실체는 어디에도 없다. 국화는 촉촉하게 대지를 적시는 봄비의 습기 때문에 싹을 틔웠고, 뿌리를 타고 오르는 수분에 의지해서 생기를 얻고, 무수한 미생물과 박테리아들이 공급하는 자양분에 의지해서 성장하고, 따사로운 태양의 에너지에 의지해 꽃을 피우고, 무수한 벌 나비들에 의해 열매를 맺는다.
결국 한 송이 국화꽃은 작게는 미생물의 활동에서 크게는 우주적 질서에 의지해서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관계의 산물이다. 국화의 실체는 없다는 개체의 공성(空性)을 통해 비로소 하나의 존재는 우주적 관계로 확장된다. 따라서 국화라는 색이 없으면 관계의 사슬이 해체되고, 관계의 사슬이 해체되면 공도 존재할 수 없다. 공은 연기라는 관계의 사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존재의 궁극적 실체를 파고들면 눈앞에 실재하는 것처럼 보이던 국화라는 존재는 없다. 그래서 법장은 ‘색이 다하면 공이 드러난다[色盡空顯]’고 했다. 색이라는 존재를 하나 하나 파고 들어가면 색이라는 개체적 실체는 없고 관계적 맥락만 남는 것이다. 여기서 ‘민타(泯他)’라는 공의 두 번째 의미가 저절로 드러난다. 눈앞에 존재하는 색이 해체될 때 비로소 존재의 실상인 공이 전면으로 드러난다. 공은 이와 같이 개체적 존재의 해체를 통해 ‘현기(顯己)’, 즉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
색을 숨기고 공이 전면으로 드러난다고 해서 새로운 공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 색은 공의 현상이고, 공은 색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현상과 본질은 둘이 아니므로 현상이 곧 본질이고, 본질이 곧 현상이다. 공이든 색이든 그 둘의 관계는 ‘색이 그대로 공[色卽是空]’이며, ’공이 그대로 색[空卽是色]’이라는 관계가 된다. 따라서 ‘참다운 공[眞空]’은 아무 것도 없는 절대 무가 아니라 색이라는 자기 부정성을 포함하고 있고, 반대로 색의 본질인 ‘진색(眞色)’도 눈앞에 드러난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 색의 부재라는 자기부정을 함축하고 있다.
나와 남이 함께 존재하고, 함께 사라지다
진공의 세 번째 의미는 ‘자기 자신과 남이 함께 머묾[自他俱存]’이다. 공의 첫 번째 의미는 공은 숨고 색이 전면에 드러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색의 본질을 살펴보면 실체가 없다. 따라서 두 번째 의미는 공이 전면에 드러나고 색이 뒤로 숨는다. 여기서 하나의 사물은 공이면서 또한 색이라는 모순적 성질을 띠게 된다. 하지만 그 두 성질은 서로 충돌하지 않고 공이 숨을 때 색이 드러나고, 색이 숨을 때 공이 드러나는 신비로운 작용을 한다.
이처럼 공에도 색이 숨어 있고, 색에도 공이 들어 있다. 공이 있을 때 색이 있고, 색이 있을 때 공도 있다. 우리는 사물을 볼 때 색만을 보지만 그 속에는 두 속성이 함께 있다. 결국 존재는 공과 색이라는 모순적 성품이 공존함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도적 성질을 띠게 된다. 그러므로 색과 공은 서로 모순적이지만 대립 모순된 색과 공이 서로의 존재를 비추는(雙照) 관계에 있다. 이것이 공의 세 번째 의미인 색과 공이 함께 존재하는 ‘구존(俱存)’이다.
색이 숨고 공이 드러나든, 공이 숨고 색이 드러나든 숨는 것이 곧 드러나는 것이고, 드러나는 것이 곧 숨는 것이다[隱顯無二]. 모든 존재의 근본적 성품은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색은 실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를 ‘환색(幻色)’이라고 한다. 우리가 보는 색은 환영일 뿐이며 진짜 모습은 공이기 때문이다.
진공의 네 번째 의미는 ‘자기와 남이 함께 사라짐[自他俱泯]’이다. 색이 곧 공이기 때문에 색이라 할 수도 없고, 공이 곧 색이기 때문에 공이라 할 수도 없다. 공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공이어서 색이 없고, 색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색이어서 공이 없다. 따라서 우리가 보는 하나의 사물은 색이라 해도 안 되고 공이라 해도 안 된다.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므로 색과 공이 한꺼번에 사라짐 즉, ‘구민(俱泯)’이 된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존재는 중도(中道)로 설명된다. 첫째,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기 때문에 색과 공이 함께 있다[俱存]. 색도 드러나고 공도 드러나기 때문에 둘 모두 드러나는 쌍조(雙照)가 성립된다. 동시에 색도 없고, 공도 없는 것[俱泯]이 공이므로 공은 색과 공을 모두 부정하는 쌍차(雙遮)도 된다. 결국 진공은 색과 공이 함께 사라지고 함께 존재하는 쌍민쌍존(雙泯雙存)이고 쌍차쌍조(雙遮雙照)가 된다. 공의 관점에서 존재를 설명하면 진공(眞空)이 되고, 색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묘유(妙有)가 된다. 삼라만상이라는 색 속에 공이 있고, 개체의 무실체성이라는 공 속에 무수한 관계를 통해 색이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월간 고경.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뉴스
-

‘옛거울古鏡’, 본래면목 그대로
유난히 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불면석佛面石 옆 단풍나무 잎새도 어느새 불그스레 물이 들어가는 계절입니다. 선선해진 바람을 맞으며 포행을 마치고 들어오니 책상 위에 2024년 10월호 『고경』(통권 …
원택스님 /
-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물병 속에 있다네
어렸을 때는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 시절에 화장실은 집 안에서 가장 구석진 곳에 있었거든요. 무덤 옆으로 지나갈 때는 대낮이라도 무서웠습니다. 산속에 있는 무덤 옆으로야 좀체 지나…
서종택 /
-

한마음이 나지 않으면 만법에 허물없다
둘은 하나로 말미암아 있음이니 하나마저도 지키지 말라.二由一有 一亦莫守 흔히들 둘은 버리고 하나를 취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두 가지 변견은 하나 때문에 나며 둘은 하나를 전…
성철스님 /
-

구루 린뽀체를 따라서 삼예사원으로
공땅라모를 넘어 설역고원雪域高原 강짼으로 현재 네팔과 티베트 땅을 가르는 고개 중에 ‘공땅라모(Gongtang Lamo, 孔唐拉姆)’라는 아주 높은 고개가 있다. ‘공땅’은 지명이니 ‘공땅…
김규현 /
-

법등을 활용하여 자등을 밝힌다
1. 『대승기신론』의 네 가지 믿음 [질문]스님, 제가 얼마 전 어느 스님의 법문을 녹취한 글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이렇게 여쭙니다. 그 스님께서 법문하신 내용 중에 일심一心, 이문二…
일행스님 /
※ 로그인 하시면 추천과 댓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