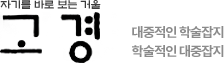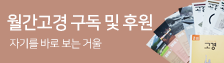[달과 손가락 사이]
법정스님 계신 곳에 가다
페이지 정보
최재목 / 2018 년 7 월 [통권 제63호] / / 작성일20-05-22 08:32 / 조회5,430회 / 댓글0건본문
‘무소유, 방랑, 자유’란 어휘 앞에
박홍규 교수(영남대)가 쓴 『카페의 아나키스트, 사르트르 - 자유를 위해 반항하라』(열린시선, 2008)를 읽었다. 그 속에 「법정 스님과 사르트르」라는 대목이 있어 흥미로웠다. 저자는 ‘무소유, 방랑, 자유’라는 공통분모가 되는 키워드를 두 사람에게 찾아내려 애쓴다. 하지만 삶의 행태에서 “법정스님과 사르트르 사이에서 아무리 비슷한 점을 찾으려고 해도 역시 다르다.”(48 쪽)고 말한다. 아울러 솔직한 의견을 보탠다. “법정스님이 영원히 떠돌아다니는 탁발승이었는지 나는 모른다. 언젠가는 서울 부근의 어느 절의 주지가 되었다고 해서 의아해 한 적이 있다. 반면 사르트르는 언제나 결코 어딘가에 고정되어 머물지 않은 영원한 탁발승처럼 살았다. 구걸만 안했다 뿐이지 떠돌이 중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35쪽) 나는 차라리 법정스님을 소로우 아니면 - 격이 다르긴 하나 - 스피노자에 대비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월든 호숫가의 법정스님
법정스님은 『아름다운 마무리』(문학의 숲, 2008)라는 책 가운데 「간소하게 더 간소하게」에서 소로우가 살았던, 콩코드시에서 남쪽으로 2킬로 정도 떨어진 곳의 월든 호수와 오두막집 이야기를 적고 있다.
“월든에 다녀왔다. …호수의 북쪽에 150여 년 전 소로우가 살았던 오두막의 터가 돌무더기 곁에 있다. 거기 널빤지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 ‘내가 숲속으로 들어간 것은 인생을 한번 내 식대로 살아보기 위해서였다. 즉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인생이 가르치고자 한 것을 내가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해서였다. 그리하여 마침 죽음에 이르렀을 때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소로우’”(137∼138쪽)

아마 스님에게 감명을 준 구절이었으리라. 20년 전 필자도 케임브릿지시에 머물 때 가족과 함께 월든 호수를 두 번 찾아 그다지 크지 않은 맑은 호수에 발을 담그고 소로우의 간소한 삶을 동경한 적이 있었다.
이어서 스님은 「다시 월든 호숫가에서」에서도 다시 월든 이야기를 적고 있다. “월든으로 갔을 때 그의 나이 스물여덟이었고 책은 한 권도 저술한 적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 말고는 그를 알아볼 사람도 없었다. 월든 호숫가에서 지낸 이 기간이 소로우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의미있는 시기였다. 그 이후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정스님에게 소로우는 제법 영향을 미친 사람이다.
어쨌든 ‘무소유, 방랑, 자유’이런 어휘는, 누구나 살면서 한번쯤은 머리로 생각해봄직한 것들이리라. 생애의 ‘마지막 어휘’(final vocabulary)는 아니라 하더라도, 실천에 옮기기가 그리 쉬운 말들은 아니다. 누군가가 세속의 때가 묻은 나더러, “당장 그렇게 살아보라!”고 권한다면, “아, 잠시만요!” 하고 ‘정신적 경련’(mental cramp)을 겪지 않으리란 확신도 없다.
문득 마주한 ‘청졸’淸拙
마침 ‘법정스님 계신 곳’으로 가기 전날 문득 책상에 앉아 있다가 『조정사원』을 아무데나 펼쳤다. 운 좋게도, 그 때 턱 마주친 단어가 <한적할 ‘청’淸, 질박할 ‘졸’拙> ‘청졸’淸拙이다. 어쩐지 이것이 법정스님을 표현하는 말로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악(潘岳. 247〜300, 중국 서진西晉 때의 사람)의 ‘한거부’閑居賦 ‘서’序에서 말한다. “졸拙이란 것은 총애와 영광[寵榮]의 일에 대한 뜻을 끊을 수 있는 것이다. 집 짓고 나무 심고서, 소요消搖하며 자득自得하는 것, 이것이 청졸淸拙이다.”(주1)
청졸은 한마디로 ‘한적하면서[淸] 질박함[拙]’이다. 자연에 기거하며, 세속의 번잡한 일들을 끊고, 오두막집이나 짓고 나무나 심으며 소요하면서 자신의 내면적 깨달음에서 의미를 찾는 생활을 말한다. 즉 소유가 아닌 ‘존재’(=무소유)로, 구속이 아닌 ‘자유’로 향한 라이프스타일을 말한다. 법정스님의 ‘무소유, 자유’의 삶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말이라 생각했다.
대중을 위해서라면 ‘말에 기대서’라도
우리 사회에서 과연 ‘무소유, 방랑, 자유’가 어디까지, 얼마나 가능할까. 주위로부터 법정스님의 홀로 사는 삶과 까다로운 성격, 문필가적 면모를 둘러싼 이런 저런 평가를 듣기도 한다. 입만 벙긋 하면 어긋난다는 ‘개구즉착開口卽錯’이나 혹은 ‘불립문자’不立文字니 ‘염화미소’拈花微笑라는 말에 올인하여, 분서갱유焚書坑儒하듯 싸악 문자들을 태워버린다면 이 세상이 한결 좋아질까, 불법佛法에 대한 대중들의 다양한 눈높이, 진리에 대한 난청難聽, 낮은 해상도解像度의 시력은 또 어쩌랴.
선방에서 참선만 하는 분들은 펜대 굴리는 문필 작업을 아주 우습게 알 수도 있으련만. 개인적으론 문자사리文字舍利를 진실을 드러내는 고귀한 매개로 본다. 대기설법對機說法이 필요한 경우, 당연히 언어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의언진여依言眞如 - 진여도 세속에 다가가서 읽히려면 ‘말에 기대어’, ‘말로써’ 나지막이 천천히, 나긋나긋 조곤조곤 알기 쉽게 설명되어야 마땅하리라. 꼭 그래야 한다. 대중들을 위해서라면 ‘말에 기대서’라도 함께 저 언덕[彼岸]으로 가야하리. 그래야 대중들도, 스님들을 따라서, 불법의 정수리[頂]에 오르며 미끄러져 내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지 않겠는가.
이 풍진의 끝자락에서, ‘대지大地’를 새로 읽다
이 풍진 세상의 무명 중생들은 죽어 땅에 묻히고서야 비로소 탐 · 진 · 치의 ‘삼독심’을 그친다. ‘독’毒은 잘 다스리면 ‘약’藥이 된다. 그래서 ‘독’ 자에 만물을 길러준다는 ‘양養 · 육育’ 의 의미도 있다. 죄나 업보가 구원의 근거(계기, 단서)가 되듯이 말이다. 어쨌든 중생들의 ‘마음’에는 그런 ‘독’들이 덕지덕지 묻어있다. “에이, 독한 놈들”이라 하듯이, 숟가락 들 힘, 문지방 넘을 힘만 있어도 그저 탐 · 진 · 치의 고갱이가 스윽 끈질기게 고개를 쳐든다. 하지만 독실한 수행자들은 어떤가. 염념보리심念念菩提心하여, 평소 욕망을 잘 여의며 살아간다. 처처處處가 안락국安樂國이다.
하지만 대지大地는 천하건 귀하건, 높건 낮건, 그 모든 것들을 다 껴안고 감싸준다. 선도 선으로, 악도 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모든 것을 중립으로, 이것저것을 분명치 않게, 중성의 무색, 무채색으로 만든다. 뉴트럴neutral이다. 그래서 ‘무기’無記를 닮았다고나 할까. 그 힘은 한 마디로 ‘스스로 저절로 그러한’[自然] 것이다. 절로절로 움직여 가는 힘이다. “산山 절로절로, 수水 절로절로, 그 간에 나도 절로절로”의 힘에 노스텔지어를 느끼며 우리는 끊임없이 닿고자 한다. 틈만 나면 산도 타고, 물놀이도 하면서 절로절로 속에 기댄다. 산수를 사랑하는 덕성은 차츰 언덕으로 시선이 향한다. 그러다가 다리에 힘이 빠지면, 차츰차츰 눈높이를 낮춘다. 자기 가슴이나 아랫배, 무릎 높이의 작고 아담한 장소로 눈길이 향한다. 아예 땅바닥에 누우면 평지가 된다. 아니 그 이하의 낮고 깊은 ‘골’, ‘굴’ 속에 아예 숨으려 한다. 암굴暗窟 즉 무덤이다.
‘산정-로고스’에서 저 낮고 깊은 ‘암굴暗窟-카오스’로
최승자는 『내 무덤, 푸르고』(문학과 지성사, 1993)에서 읊었다.
“내 무덤, 푸르고/푸르러져/푸르름 속에 함몰되어/아득히 그 흔적조차 없어졌을 때,/그때 비로소/개울들 늘 이뿐 물소리로 가득하고/길들 모두 명상의 침묵으로 가득하리니/그때 비로소/삶 속의 죽음의 길 혹은 죽음 속의 삶의 길/새로 하나 트이지 않겠는가.”(「未忘 혹은 非忘 8」, 18쪽)
무덤을 바라볼 때, 봉분은 잔디로 푸르니 ‘죽음 속의 삶의 길’을, 지하의 함몰된 곳은 명상과 침묵으로 숨었으니 ‘삶 속의 죽음의 길’을 은유한다. 그 높아지고-낮아짐, 밀고-당김의 힘, 긴장이 생성되는 곳이 무덤이다.
주)
(주1) 睦庵善卿, 『祖庭事苑』 : 潘岳閑居賦序曰, 拙者, 可以絶意乎寵榮之事, 築室種樹, 消搖自得, 此淸拙也.
저작권자(©) 월간 고경.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뉴스
-

‘옛거울古鏡’, 본래면목 그대로
유난히 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불면석佛面石 옆 단풍나무 잎새도 어느새 불그스레 물이 들어가는 계절입니다. 선선해진 바람을 맞으며 포행을 마치고 들어오니 책상 위에 2024년 10월호 『고경』(통권 …
원택스님 /
-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물병 속에 있다네
어렸을 때는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 시절에 화장실은 집 안에서 가장 구석진 곳에 있었거든요. 무덤 옆으로 지나갈 때는 대낮이라도 무서웠습니다. 산속에 있는 무덤 옆으로야 좀체 지나…
서종택 /
-

한마음이 나지 않으면 만법에 허물없다
둘은 하나로 말미암아 있음이니 하나마저도 지키지 말라.二由一有 一亦莫守 흔히들 둘은 버리고 하나를 취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두 가지 변견은 하나 때문에 나며 둘은 하나를 전…
성철스님 /
-

구루 린뽀체를 따라서 삼예사원으로
공땅라모를 넘어 설역고원雪域高原 강짼으로 현재 네팔과 티베트 땅을 가르는 고개 중에 ‘공땅라모(Gongtang Lamo, 孔唐拉姆)’라는 아주 높은 고개가 있다. ‘공땅’은 지명이니 ‘공땅…
김규현 /
-

법등을 활용하여 자등을 밝힌다
1. 『대승기신론』의 네 가지 믿음 [질문]스님, 제가 얼마 전 어느 스님의 법문을 녹취한 글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이렇게 여쭙니다. 그 스님께서 법문하신 내용 중에 일심一心, 이문二…
일행스님 /
※ 로그인 하시면 추천과 댓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