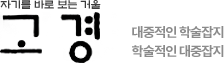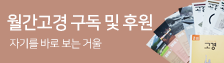[문자와 책의 향기]
깨달음 노래한 活句集
페이지 정보
조병활 / 2021 년 5 월 [통권 제97호] / / 작성일21-05-04 14:33 / 조회6,046회 / 댓글0건본문
최재목 시인의 시 세계
“말 가운데 말이 있으면 죽은 말이며, 말 속에 말이 없으면 살아 있는 말이다[語中有語, 即是死句; 語中無語, 則是活句].”(주1) 사람들은 대개 ‘말 가운데 말이 없는 말[活句]’을 이해하지 못하고 좋아하지 않는다. 말 속에 말이 있는 말, 즉 ‘죽은 말[死句]’을 ‘숭배’한다. 사실 말(문자)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도구에 불과하다. ‘대지의 본 모습[本地風光]’을 말과 문자가 설명해 줄 수 없다. 말을 파고들수록 의미는 점점 미끄러진다. 결국 말에는 아무 것도 남지 않는다.
그래도 사람들은 말과 문자에 집착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는 제대로 살피지 않는다. 평생 말과 문자에만 매달리는 이들도 있다.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맞는 말이 있지만, 말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덕이 있는 것은 아니다[有德者, 必有言; 有言者, 不必有德].”는 구절은 그냥 『논어論語』 「헌문憲問」편에 나오는 격언일 뿐이다. “의미를 체득했으면 말을 잊어라.”는 ‘득의망언得意忘言’ 역시 『장자莊子』 「외물外物」편에 있는 성어成語일 따름이다. 결국 『대승입능가경』 권제5 「제6 찰나품」과 『능엄경』 권제2에 있는 다음의 구절들이 중요하다.

[1] “어리석은 이에게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만 보고 달은 보지 않듯이, 문자에 집착하는 이는 붓다의 진실을 보지 못한다[如愚見指月, 觀指不觀月; 計著文字者, 不見我真實].”
[2] “어떤 사람이 손가락으로 다른 사람에게 달을 가리켜 보이면, 그 사람은 마땅히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아야 한다. 만약 손가락을 보며 달이라고 여기면 이 사람은 달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마저 잃어버린다. 왜 그런가? 가리키는 손가락을 밝은 달로 여기기 때문이다. 어찌 손가락만 잃을 뿐이겠는가! 밝음과 어둠마저 알지 못한다. 왜 그런가? 손가락을 달의 밝은 본성으로 여겨 밝음과 어둠의 두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如人以手指月示人, 彼人因指當應看月; 若復觀指以為月體, 此人豈唯亡失月輪, 亦亡其指. 何以故? 以所標指為明月故. 豈唯亡指, 亦復不識明之與暗. 何以故? 即以指體為月明性, 明暗二性無所了故].”
손가락을 달로 여기면 달과 손가락 모두를, 나아가 밝음과 어둠 자체도 잃어버린다고 강조해 놓았다. 물론 평범한 사람들이 ‘달’과 ‘손가락’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평범한 사람의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는 일은 거의 없다. 설사 가리켜도 그 손가락을 따라가는 사람도 매우 드물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유명한 사람의 그 것이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유명한 사람의 손가락은 달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사람들이 달과 그 손가락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손가락에 매달려 달을 놓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달과 손가락 모두를 살리기 위해 시詩가 탄생됐는지 모른다. 은유적이고 압축적인 언어로 표현된 ‘시詩’는 달도 아니고 손가락도 아니다. ‘달과 손가락 사이[月指之間]’(주2)에 있는 그 무엇이다. 시를 통해, 달을 보고 손가락을 손가락으로 인식한다면 성공적이다. 그런 시는 훌륭하다. 혜홍각범(慧洪覺範, 1071-1127)이 『석문문자선石門文字禪』 권제25 「제량화상전題讓和尙傳」에서 밝힌 견해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3] “마음의 깨달음을 언어로 전달할 수는 없지만 언어로 드러낼 수는 있다. 언어라는 것은 마음과 관련된 것이고, 깨달음의 표시이다. 표시를 살피면 마음이 (깨달음에)(주3) 계합한다. 때문에 수행자는 체득한 깨달음의 깊음·얕음의 징후(기준)를 매번 (사용하는) 언어로 파악한다[心之妙, 不可以語言傳, 而可以語言見. 蓋語言者, 心之緣·道之標幟也. 標幟審則心契, 故學者每以語言爲得道深淺之候].”(주4)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깨달음의 깊이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언어는 중요한 물건이다. 말 속에 말이 있는 말이 귀중한 것이 아니고, 말 속에 말이 없는 말이 귀중하다. 말 속에 말이 없는 말은 어떤 말인가?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말로 설명한 말이 말 속에 말이 있는 말이다. 이것은 죽은 말이다. 왜? ‘진리 그 자체’는 분석과 분별을 벗어난 곳에 있기 때문이다. 말 속에 말이 있는 말, 즉 ‘의미 있는 말[有義語]’은 독자를 ‘의미 있는 그 곳’에만 멈추게 한다. 논리와 구조 그리고 단어에 집착하게 만든다. 반면 말 속에 말이 없는 말, 즉 ‘의미 없는 말[無義語]’은 무한히 넓은 세계를 독자에게 준다. 언어와 논리에 대한 ‘좁은 집착’에서 벗어나게 한다. ‘지혜의 눈[慧眼]’을 선사한다. 시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것이다. 최재목 시인(영남대 철학과 교수)의 시 「이제 그만 싸우자」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

사진1. 최재목 시집 <나는 나대로 살아 있다 어쩔래>, 서울:21세기문화원, 2021
흔들리다 결국 금이 가버린 윗니를 뽑고 와서,
우울하게 누워있었다
하나 둘, 비어가는 치아가 좀 서러웠다
어쩌면 내 삶도, 그렇게 차츰 이빨이 빠져나가
가벼워지고 있었다
아는 분한테 전화가 걸려 와서, “이를 뽑고 누워있다”고 하니,
대뜸 하는 소리가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이제 세상과 너무 싸우지 마세요”라고 한다
“예, 자중하겠습니다”라는 말만 하고,
부끄러워서 얼른 끊었다
생각해보니, 참 오랜 세월 세상과 멱살 잡고 싸워온 게, 분명했다
그게 누군지도 모르고, 왜 그런 줄도 모르면서 …
뺨을 몇 대 더 맞고 나면, 아랫니마저 빠질게 끔찍하여
이제 그만 싸워야겠다고 생각했다
- 「이제 그만 싸우자」 전문 -
시인은 “오랜 세월 해왔던” 싸움 때문에 이빨이 상했다. 뭐 그럴 수 있다. 살다보면 화나고 속상하는 일이 어디 한 두 건인가! 한 번은 성질대로 싸웠다. 그러다 이빨이 상했다. 보통 사람은 일상의 이런 일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 그리곤 또 술 마시고 화내고 싸운다. 다음에 싸움나면 몇 대 더 때려야지라고 생각한다. 친구들에게 자랑도 할 것이다. “그래야 내가 험난한 현실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합리화한다.
그런데 시인은 ‘싸움’이라는 ‘일상의 현상’에서 차원이 다른 진리를 발견한다. 어떤 사람이 “대뜸” 말하는 전화를 받고 부끄러워하며 “곧바로” 각성한다. 물론 “뺨을 몇 대 더 맞고 나면, 아랫니마저 빠질게 끔직”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시가 말하는 싸움은 치고 박는 물리적인 싸움만 ‘가리키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가리키는 방향으로 따라가면 또 다른 달, 즉 정신적인 싸움도 나타나고 이런 저런 고뇌와 번뇌도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 세상과 멱살 잡고 싸워온” 이 싸움은 시인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다. 흐르는 세월을 누가 이길 수 있나! 시간이 흐르면 튼튼하던 이빨이 하나 둘 흔들리고 빠진다. 임플란트 해 넣어도 마찬가지다. ‘세월과의 싸움’에 이길 장사는 없다. 시인은 어느 순간 이 사실을 깨닫는다. ‘모든 존재는 변하기 마련이다’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의 도리를 “윗니 아랫니” 때문에 ‘순식간에 문득 깨닫는다[頓悟]’. 그리곤 싸움을 그만 하겠다고 다짐한다. 제행무상의 이치를 터득하는 과정이 맛깔스럽게 표현되어 있다. 싸움, 전화, 이빨 등 흔히 듣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말들을 사용했다. 지극히 일상적인 단어로 ‘말 속에 말이 없는 깨달음’을 은유적이고 압축적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시 전체가 ‘활구活句’가 됐다. 참구參究하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도구’인 ‘화두話頭’로 승화됐다. 시가 질적質的으로 변한 것이다.
‘의미 없는 말[無義語]’을 사용해 시詩를 ‘활구’로 만드는 기법은 곳곳에 보인다. “저/ 무덤으로/ 걸어가는 진리만큼/ 분명한 건 없더라/ … 나대로 너답게/ 살다가 죽어야지/ 그러다 저 무덤으로 가자/ 저곳이 스승이고/ 저분이 학교장이다”(「학문은 항문이다」); ““나처럼/ …/ 눈 떼지 마라,/ 무상 앞에서/ …,/ 너도 곧 종점이다””(「뒤도 안 돌아보고 내렸다」) 등등. 그렇다고 시인이 죽음 앞에 주눅 들거나 삶에 자존감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한다. 「나는 나대로 살았다 어쩔래」가 대표적이다.
나는 나대로 살았다
어쩌라고
너는 너대로 살았잖아
그런데 어쩌라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훨씬 좋잖아
그런데 왜 자꾸 나더러
너처럼 살라 하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한 번쯤은 막 나가는 삶을
회오리바람처럼
휘몰아치는 삶을
너는 너처럼
나는 나처럼 살자
그래도 된다고
그렇게 말해야 옳잖아
나는 나대로 살았다
어쩔래 네 멱살을 잡으며
그렇게 말하고 싶다
너도 나처럼 그렇게 말해도 돼
좋잖아
그게 좋잖아
한 때 때려 봐 그래도 돼
너는 너처럼
나는 나처럼 살 수 있다면
한 대 맞아도 돼
버림받아도 돼
어쩔래
그래 어쩌라고
- 「나는 나대로 살았다 어쩔래」 전문 -
현실, 번뇌, 고뇌, 생활 등이 가하는 다양한 압력에 당당하게 대드는 시인의 모습이 팔딱거리며 다가온다. “자꾸 간섭하지 마,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살았다. 그게 좋잖아!”라며 각종 압력에 주눅 들지 않고 대든다. 그래서 심지어 “나도 나처럼 살 수 있다면/ 한 대 맞아도 돼”라고 소리 지른다. 물론 한 때는 “어쩔래!”가 말에 그치고 말았다. “나는 나대로 살았다/ 어쩔래 네 멱살을 잡고/ 그렇게 말하고 싶다”고 속으로만 외쳤다.
결국에는 “나는 나처럼 살 수 있다면/ 한 대 맞아도 돼/ 버림받아도 돼/ 어쩔래/ 그래 어쩌라고”라며 기어이 독립한다. 천상천하의 모든 것이 귀하지만 시인 자신도 귀한 존재임을 설파 한다. 시인 자신만 귀한 것은 아니다. “너는 너대로 살았잖아”, “너는 너처럼” 등 상대방의 존재도 쿨 하게 인정한다. ‘어쩔래’라는 무색무취의 단어를 적절하게 배치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 왔다’는 소회所懷를 드러낸다.
“어쩔래!”라며 “이빨 빠질” 정도로 달려드는 현실의 여러 압력에 대항하며 열심히 산 시인은 그런 삶 속에서 진리를 터득한다. 제행무상의 진리만 인식한 것은 아니다. 제행무상은 삶과 죽음을 경험하고 이해할 나이가 되면 누구나 알 수 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제행무상에서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진리’로 시인은 나아간다. 제행무상 속에 자리 잡은 진리, 소멸될 수밖에 없는 모든 현상이나 존재가 사라지며 보여주는 진리, 바로 ‘존재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가치’를 깊이 증득證得한다. 「어느 하나 향기로운 집 한 채가 아니랴」는 시詩에서다.
가을걷이가 끝난 빈 밭고랑이
쪼그리고 앉았다
빼앗을 건 다 빼앗아
뿌리마저 뽑혀 말라비틀어진
세상의 바닥,
생애의 반은 잊혀지고,
그 나머지 반은 허전하다
그런 곳으로도 새들은
먹이 찾아 날아들고
간혹 비닐도 날려 와 허리를 쭈욱 펴고
너덜너덜 쉰다
땅의 한 구석엔 고요가
국화꽃처럼 노랗게 피어 익어가고,
가을 벌떼 윙윙대며 꿀을 퍼 날라
극락전을 짓는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그냥 막 살아 온 것 같아도
어느 하나
향기로운 집 한 채가 아니랴
- 「어느 하나 향기로운 집 한 채가 아니랴」 전문 -
“뿌리마저 뽑혀 말라비틀어진 세상의 바닥”에 발붙이고 사는 시인의 생애는“반은 잊혀지고, 그 나머지 반은 허전하다.” 반은 잊혀지고, 반은 허전한 생애는 아무 것도 아닌 생애다. 그런 생애의 바닥에 새, 비닐, 국화꽃, 가을 벌떼 들이 날아와 어울려 산다. 다른 존재를 해코지 하거나 괴롭히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바닥에서 찾으며 살아간다. 낡아 빠진 비닐마저 간혹 허리를 펴고 자신을 자랑한다. 벌들은 ‘진언眞言’을 소리 높여 외우며 극락전을 짓는다. 벌들이 내는 “윙윙”소리는 ‘입으로 지은 나쁜 업業’을 씻어내는 “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이다. 구업口業을 깨끗이 하며 극락전을 짓는다. 벌들은 그렇게 가을 동안 공덕을 쌓아 겨울에 대비하고, 자신과 후대들이 먹을 꿀을 열심히 모은다. 꿀을 모으는 것이 극락전을 건립하는 불사佛事다. 결국 시인은 그런 현상 속에서 “그냥 막 살아 온 것 같아도/ 어느 하나/ 향기로운 집 한 채가 아니랴”며 뛰어난 ‘승의의 진리[勝義諦]’를 체득한다. 시인은 빈 밭고랑에 쪼그리고 앉아 제행무상을 넘어선 승의제를 몸으로 깨닫는다. “그냥 막 살아온 것 같은 인생”도 실은 ‘진리의 현현顯現’임을,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의미 있음을 증득證得한다.
그래서 시인도 점차 원만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 변한다. 「독도여래」, 「진짜 내 글씨 한 줄」, 「발밑을 보라」, 「지옥에서 쫓겨난 어둠이 걸어간다」, 「일면불 월면불」, 「학문은 항문이다」 등이 그런 과정을 노래한 시들이라 생각된다.
고독하지 않으면
돌이 될 수 없고
돌이 될 수 없으면
고독이 될 수 없음을
동해東海에서
독존獨尊을 보았다
독도獨島에서
여래를 만났다
바위에 붙은
섬초롱불佛을,
괭이갈매기가 물어 가는
천상천하天上天下 유아독도唯我獨島를,
얼핏 틈새로 달아나던
홀로 말라비틀어진
고독을 만났다
- 「독도여래獨島如來」 전문 -
발밑을 보라,
수 없이 머뭇거리다 간
침묵과 고독함을, 그 허망을
보라
모두 헤어지고
등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야 새 길로 나아갈 수 있으니,
가고 오지 않으면
꽃도 피고 지지 않는다
삶도 그렇다
- 「발밑을 보라」 전문 -
시인은 “말라비틀어진” 고독에 싸인 독도에서 여래를 만났다. 여래는 그 고독 속에 있고, 고독한 돌 속에 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등 ‘세 가지 독[三毒]’과 완전히 절연한 고독 속에서 독도는 여래가 되었다. 그래서 독도의 바위에 붙은 섬초롱(꽃)도 불佛이 되었다. 갈매기가 물어가도 흔들림 없는 “유아독도”가 되었다. 그러나 뭔가 미진하다. 고독만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 시인도 이를 의식한 듯 “침묵과 고독함을, 그 허망을/ 보라/ 모두 헤어지고/ 등지고 있지 않느냐”고 외친다. 침묵과 고독 나아가 허망까지도 다 벗어던져야만 새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가기만 하고 오지 않으면 ‘깨달음의 꽃’은 피지 않는다. 꽃을 피우려면 돌아와야 된다. 침묵, 고독, 허망에서 벗어나되 다시 그 속에 들어가 그들과 하나가 되어야 참다운 꽃이 핀다. 다시 ‘시장에 들어가 중생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 뻗어야[入鄽垂手]’ 진정한 깨달음이다. 오지 않으면 삶도 피지 않는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렇게 오실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가실 것을 알지 못해/ 여래如來와 여거如去/ 두 분의 부처를 업고/ 나는, 하염없이 산길을 헤매고”(주5) 있었다. 가고 옴에 막힘이 없자 “해님도 부처고, 달님도 부처/ 아니 아니,/ 모든 어둠마저도 부처”(주6)가 되었다. 시인은 결국 “진짜 내 글씨 한 줄/ 삐둘삐둘 썼다”(주7)고 고백한다. 고독 속에서 ‘말 속에 말이 없는’ 활구活句를 문자로 뱉어낸 것이다.
사실 글자가 무슨 신령한 물건은 아니다.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권제28 「월주대주혜해화상越州大珠慧海和尙」조에 전하는 다음의 기록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4] “경전은 문자와 종이와 먹물로 이뤄진 것이다. 본성상 공한 이 경전의 어느 곳에 신령함이 있단 말인가? 영험이라는 것은 경전을 지닌 사람이 쓰는 마음에 있다. 그래서 사물과 신령스럽게 통하고 감응한다. 한 권의 경전을 책상 위에 놓은 뒤 아무도 그 경전을 지니지 않았는데도 경전 스스로 영험이 생기는지(있는지) 시험해 보라(신령함이 생기지 않는다)[經是文字紙墨, 性空何處有靈驗? 靈驗者, 在持經人用心, 所以神通感物. 試將一卷經安著案上, 無人受持, 自能有靈驗否]!”
경전 자체에 영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전을 지닌 사람이 쓰는 마음에 신령함이 있다고 혜해는 지적한다. 이처럼 경전(문자)을 읽은 마음에 신령이 비로소 깃드는 것이지, 아무 것도 읽지 않은 마음 자체가 신령스럽게 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유마힐소설경維摩詰所說經』 「입불이법문품入不二法門品」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문수 보살 등 32명의 보살들이 저마다 ‘둘이 아닌 진리에 들어가는 방법[入不二法門]’에 대해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수 보살이 유마 거사에게 “불이문不二門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무엇입니까?”하고 물었다. 유마 거사가 침묵으로 답변했다. 문수 보살이 “훌륭하도다! 훌륭하도다! 문자와 말이 없는 이것이야말로 둘이 아닌 진리에 들어가는 문.”(주8)이라며 찬탄했다. 유마 거사의 이 침묵이 그 유명한 ‘유마일묵維摩一黙’이다. ‘진리 자체[不二]’는 언어·문자에 있지 않고, 진리는 침묵으로 체득하는 것임을 설명할 때 애용하는 말이다.
과연 그럴까! 침묵만 있으면 진리를 체득할 수 있을까? 언어·문자로 진리 그 자체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언어·문자가 없으면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조차 설명할 수 없다는 점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소동파(1037-1101)가 「석각화유마송石恪畵維摩頌」(『소식문집蘇軾文集』 권20)에서 이렇게 읊은 것이리라.
[5] “내가 보기에 32명의 보살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불이문(둘이 아닌 진리에 들어가는 문)’에 대해 말했다. 유마힐이 침묵하고 말하지 않자, 32보살이 말한 의미는 일시에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내가 보기에 32보살이 말한 의미는 떨어지지 않았다. 유마힐도 처음에는 (「입불이법문품」 앞부분에서) 불이문에 대해 말했다. 예를 들어 밀랍으로 만든 초에 불을 붙이지 않으면 밝아지지 않는다. 홀연 침묵해 말 없는 그곳에 32보살의 설명은 모두 빛나는 불빛이다[我觀三十二菩薩, 各以意談不二門. 而維摩詰黙無語, 三十二意一時墮. 我觀此意亦不墮, 維摩初不離是說. 譬如油蠟作燈燭, 不以火點終不明. 忽見默然無語處, 三十二說皆光焰].”
불을 붙이지 않으면 촛불이 타오르지 않는다. 침묵을 돋보이게 한 것은 언설言說이다. 말없이 무조건 침묵한다고 그 침묵이 진리와 계합契合하는 것은 아니다. 침묵과 언설은 서로 도와주고 보충하는 관계다. 궁극적인 입장에서 보면 침묵이 진리와 계합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 언설의 역할이 반드시 있다. 무조건 침묵을 긍정하고 언설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소동파의 생각이다. 32보살의 말들이 유마 거사의 침묵을 돋보이게 하고, 빛나게 해줬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불교적 견지에서 보면 시詩의 역할도 바로 이 점에 있다. 시 자체가 궁극적인 진리를 담아내지는 못한다. 그러나 시가 없다면 진리에 들어가는 입구조차 찾기 힘들다. 최재목 시인의 시도 마찬가지다.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소소한 사실들에서 진리를 추출하고, 그 진리로 다시 현실의 생활을 해석하고 설명하며 시인은 점차 깨달음의 세계에 몰입한다. 어느 순간 ‘팍 터지며’ ‘그 무엇’을 터득한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어쩔래』(사진 1)를 통해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독자들도 몰록 깨닫기를 기원한다.
주)_
1) 북송(960-1127)의 혜홍각범(慧洪覺範慧洪, 1071-1127)이 쓴 『임간록林間錄』 권상 「동산수초어록洞山守初語錄」조에 있는 말이다. 원문은 “말 가운데 말이 있는 것을 사구라 부르며, 말 가운데 말이 없는 것을 활구라 한다[語中有語, 名為死句; 語中無語, 名為活句].”이다. 백련선서간행회, 『임간록』(상), 합천: 장경각, 1989, p.81.
2) 최재목 시인은 「달과 손가락 사이」라는 제목으로 제72호(2019년 4월호)부터 제92호(2020년 12월호)까지의 『고경古鏡』에 시와 그림을 연재했고, 연재된 시와 그림을 중심으로 엮은 것이 이 시화집詩畫集이다. 「달과 손가락 사이」는 『능엄경』의 말씀에서 착안된 것이며, 『고경』은 성철사상연구원이 발행하는 월간지이다.
3) ( )는 원문엔 없으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넣은 것을 의미하며, 이 글에 있는 모든 밑줄은 시인이 아닌 필자가 그은 것이다. 이하 동일.
4) 『嘉興大藏經』 第23册, 臺北: 新文豊出版社 影印本, 1987, p.700a.
5) 시 「하염없이, 산길을 헤매다」의 마지막 부분.
6) 시 「일면불 월면불日面佛 月面佛」의 마지막 부분.
7) 시 「진짜 내 글씨 한 줄」의 첫 부분.
8) “善哉! 善哉! 乃至無有文字語言, 是真入不二法門.”
저작권자(©) 월간 고경.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뉴스
-

‘옛거울古鏡’, 본래면목 그대로
유난히 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불면석佛面石 옆 단풍나무 잎새도 어느새 불그스레 물이 들어가는 계절입니다. 선선해진 바람을 맞으며 포행을 마치고 들어오니 책상 위에 2024년 10월호 『고경』(통권 …
원택스님 /
-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물병 속에 있다네
어렸을 때는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 시절에 화장실은 집 안에서 가장 구석진 곳에 있었거든요. 무덤 옆으로 지나갈 때는 대낮이라도 무서웠습니다. 산속에 있는 무덤 옆으로야 좀체 지나…
서종택 /
-

한마음이 나지 않으면 만법에 허물없다
둘은 하나로 말미암아 있음이니 하나마저도 지키지 말라.二由一有 一亦莫守 흔히들 둘은 버리고 하나를 취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두 가지 변견은 하나 때문에 나며 둘은 하나를 전…
성철스님 /
-

구루 린뽀체를 따라서 삼예사원으로
공땅라모를 넘어 설역고원雪域高原 강짼으로 현재 네팔과 티베트 땅을 가르는 고개 중에 ‘공땅라모(Gongtang Lamo, 孔唐拉姆)’라는 아주 높은 고개가 있다. ‘공땅’은 지명이니 ‘공땅…
김규현 /
-

법등을 활용하여 자등을 밝힌다
1. 『대승기신론』의 네 가지 믿음 [질문]스님, 제가 얼마 전 어느 스님의 법문을 녹취한 글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이렇게 여쭙니다. 그 스님께서 법문하신 내용 중에 일심一心, 이문二…
일행스님 /
※ 로그인 하시면 추천과 댓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