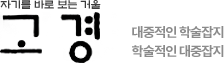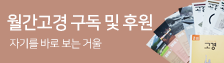[작고 아름다운 불교의례 ]
묵언默言과 합송合誦의 조화 ①
페이지 정보
구미래 / 2024 년 11 월 [통권 제139호] / / 작성일24-11-05 11:37 / 조회342회 / 댓글0건본문
발우공양은 기본적으로 묵언의 공양이다. 일상의 대화나 말이 끊어진 자리에서 수행과 다름없이 공양이 이루어진다. 유일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간은 함께 게송을 외울 때이다. 수많은 대중이 소리 없이 공양을 이어가는 묵언默言도, 검박하고 우렁찬 합송合誦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준다. 이에 두 회에 걸쳐, 묵언과 합송이 조화를 이루는 수행자들의 발우공양을 차례로 살펴본다.
‘묵언을 아뢰오’
예전에는 사찰 대방에 나무로 된 묵언패黙言牌가 여러 개 걸려 있었다. 손에 쥘 수 있도록 직사각형으로 자그맣게 깎아 만들어 주로 발우공양 때 사용하였다. 공양의 모든 단계가 묵언이지만 밥을 먹는 중에는 더욱 철저했고, 그릇·수저 소리나 음식 씹는 소리도 나지 않아야 했다. 이에 생반게生盤偈 등을 마치면 소임이 패를 치는데, 양손에 하나씩 들고 서로 부딪혀서 소리를 내게 된다. 공양이 시작되니 일체 묵언할 것을 환기하는 의식이다.
일찍부터 범패가 생활화된 신촌 봉원사에서는 묵언패를 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묵~언~알~~요.”라며 운율을 넣어 외친 다음 패를 ‘짝짝짝!’ 세 차례 치게 된다. ‘묵언을 아룁니다’라는 말을 네 자로 줄여 길게 소리 짓는 것이다.
종두鐘頭 스님 둘이 일어나 패를 치는데, 두 명을 양쪽에 둔 것은 감시의 기능까지 염두에 둔 듯하다. 만약 공양 중 속삭이는 스님이 있으면 그를 향해 패를 한 차례 ‘짝!’ 쳐야 했기에, 대중이 많은 경우 혼자서 전체를 살피기 힘들기 때문이다. 묵언을 깨뜨려 패를 치게 만들면 그 스님은 ‘묵언 맞았다’고 표현하였다.

노스님도 묵언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노스님이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패를 치는 대신 그 앞에 묵언패를 갖다 놓은 채 절을 올렸다. 점잖은 방법이지만 노스님으로선 여간 쑥스러운 일이 아니다. 예전에는 ‘묵언 맞은 노스님’이 자청해서 쌀을 내어 떡을 하는 문화도 있었다고 한다. 종두는 어김없이 소임을 수행했고, 노스님은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어 유쾌하게 풀어나간 것이다.
공양을 마치면 묵언 푸는 절차도 두었다. 이때는 소리를 짓지 않은 채 묵언패만 3차례 ‘짝짝짝’ 치게 된다. 묵언의 결계結界를 풀어야 다음 절차로 이어지는 절수게折水偈·수발게收鉢偈 등을 외울 수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처음 묵언을 맺을 때와 달리 소리를 짓지 않고 묵언패만 세 차례 치는 것도, 묵언을 풀기 전이라 소리를 먼저 낼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 묵언을 푸는 패에서 묵언 결계의 엄중함이 더욱 깊게 새겨진다.
묵언 속의 속삭임
몇 해 전, 운문사 발우공양에 참관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 공양을 마치고 대중공사 때 ‘오늘 공양에서 소소한 작성이 많았다’는 강원 학장 스님의 지적이 있었다. ‘작성作聲’이란 말소리는 물론 수저나 그릇을 떨어뜨리는 등으로 소리 내는 것을 말하고, 소리 낸 이를 ‘작성자’라 부른다. 음식을 씹는 소리의 경우, 한 사람 건너서까지 들리면 ‘작성’이라 보고 있다.
만약 모두가 쳐다볼 정도의 작성이 있었다면, 공양을 마친 뒤 작성자는 스스로 앞으로 나와서 반성을 해야 했다. 따라서 수십 명의 대중이 모여 밥을 먹는 데도 말소리·그릇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지극히 조용한 것이 발우공양의 특징이다. 수행과 다르지 않은 출가자의 식사법의 엄정함을 살필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규범과 정반대의 모습도 수시로 드러난다. 발우공양 때 상판의 어른 스님들은 하판 스님들을 배려하느라 묵언을 깨뜨리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스님들은 대방에 둘러앉아 발우공양을 할 때 가장 낮은 자리를 ‘탁자 밑’이라 부르는데, 이때의 ‘탁자’는 불단佛壇을 뜻한다. 조실祖室이 앉는 어간御間을 중심으로 법랍에 따라 사방으로 둘러앉다 보면, 불단 쪽이 맨 하판의 자리가 되기 때문이다.
어른 스님들은 늘 우리를 배려해 주셨어요. 하판은 최고 어른 스님들과 마주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먹거나 행익行益 나가는 걸 항상 우려하시고, 끝까지 많이 먹게끔 하셨어요. “많이 드세요, 천천히 먹어요.”, “걱정 말고 더 많이 먹어요.” 하시며 챙겨 주셨던 따뜻한 기억이 있습니다.
운문사 강원을 다닌 스님들의 학인 시절 이야기이다. 어른들은 음식과 찬상 분배 등을 맡는 하판에서, 대중의 속도를 따라가느라 급히 공양하거나 제대로 공양하지 못할까 하여 늘 염려했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1970년대 동학사에서는 발우공양 때 탁자 밑까지 가기 전에 밥이 떨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동진 출가가 흔했던 시절에는 탁자 밑에 10대 스님들이 앉는 경우가 많았다. 저녁에 죽을 먹고 배고픈 어린 학인 스님들은 자기 앞에서 밥이 없어지면 말없이 눈물을 뚝뚝 흘렸다.
그러면 음식이 모자라지 않는지 늘 탁자 밑을 눈여겨보던 주지 일초스님이, “걱정하지 마라, 밥 줄게.” 하면서 밥통을 가져오게 하였다. 주지부터 한 숟갈씩을 덜어서 전 대중에게 죽 내려가면, 오히려 여느 때보다 더 많은 밥이 탁자 밑 스님들에게 돌아가곤 했다는 것이다.
엄정한 묵언과 수시로 깨어지는 묵언…. 두 모습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상황의 묵언’이다. 아무리 법식이 엄한 묵언의 공양에서도 엄중한 침묵만이 아니라, 따뜻한 속삭임이 가능한 데서 발우공양의 힘이 더욱 크게 여겨진다.
대중이 주는 ‘침묵과 집중의 힘’
발우공양 동참자들과 면담하면서, 상공양보다 발우공양이 좋다는 스님들을 만났다. 그들은 발우공양을 선호하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로 ‘묵언’을 꼽았다. “상공양을 하면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해야 하고, 침묵하면 어색해져서 신경을 쓰게 된다.”는 것이다. 좀 더 깊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말없이 먹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건 ‘대중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묵언’임을 알 수 있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되니 좋습니다. 먹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예전에 도반들 두세 명과 발우공양을 해 봤지만 이런 힘이 나오지 않아요. 대중이 함께할 때, 그 묵언의 시간 속에선 온전히 ‘먹는 것’에 집중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강원생활 4년 내내 발우공양에서 마음을 챙길 수 있었어요. 백 명 넘는 수행자들이 큰방에 모여서 아무 말 없이 ‘쉭쉭쉭쉭’ 공양이 이루어지고, 내가 공양하는 이 사각의 작은 자리에 집중하면서 처음과 끝이 탁 맞아들어갑니다. 마지막까지 환희심이 나면서 대중의 힘이 모든 걸 수행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 같아요.
인원이 많을수록 조용하기 힘들고, 집중하기란 더욱 힘들게 마련이다. 그런데 진관사 동우스님과 덕현스님의 말에 따르면, 대중이 많을수록 침묵도 집중도 잘 된다는 역설이 성립되고, 그 힘 또한 엄청나다는 점을 알게 된다. 깨달음이라는 목적으로 함께 모인 수행자들의 대중생활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일깨우는 대목이다.
예로부터 승가에 ‘대중이 공부시켜 준다’, ‘대중의 눈이 신장神將의 눈’이라는 말들이 전한다. 스님들은 뜻을 같이하는 출가자들이 모여 함께 수행하는 것을 더없는 청복淸福으로 여겼다. 특별히 잘잘못을 논하지 않더라도, 대중의 눈에 비친 서로의 모습에서 수행자의 면모를 가다듬으며 수행의 큰 동력으로 삼아온 것이다.
그러한 대중생활 속에서 묵언의 의미는 더없이 소중했을 법하다. 스승과 제자, 동학과 선후배의 대중이 같은 목표로 한자리에 둘러앉아, ‘이 공양은 가치 있는 것’이라는 믿음을 공유하는 가운데, 밥 먹는 일의 의미를 성찰하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여법한 수행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행위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공양하니, ‘대중이 공부시켜 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 짐작해 보게 된다.
밥맛이 좋아지고 음식과 친해지는 묵언
묵언의 공양은 실제 밥맛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발우공양은 많은 인원이 둘러앉아 간소한 반찬으로 의식절차에 따라 밥을 먹으니, 인간이 지향하는 ‘풍요롭고 자유로운 식사’의 반대편에 놓여 있다. 게다가 대화도 소리도 없이 먹어야 하니 ‘행위를 구속하는 불편한 식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출가·재가의 구분 없이 발우공양을 선호하는 이들은 공양의 의미와 여법한 분위기만이 아니라, 실제 ‘발우 밥이 더 맛있다’고 느끼는 공통점을 지녔다. 오롯이 먹는 일에 집중하면 밥맛이 훨씬 좋다는 말이었다. 묵언하면 음식에 집중할 수 있고, 밥과 반찬에 집중하면 참맛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고요하면 오롯이 공양에만 집중할 수 있죠. 찬도 많으면 생각이 많아질 테지만, 생각이 별로 없을 만큼 간소해. 그냥 새 반찬 하나, 김치, 밑반찬…. 이렇게 밥·국·반찬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생각도 내려지고 온전하게 먹는 일을 느끼면서 집중하게 되죠.
…그렇게 먹으면 더 맛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밥 냄새와 씹을 때의 고소함이라든지, 밥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반찬도 그냥 막 먹을 때보다 음미하게 되죠. 무의 촉촉함이라든지, 식감이라든지. ‘김치가 하얗고 아삭거리네’라는 식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대상을 관찰하게 됩니다.

발우공양 동참자들의 반응을 조사한 필자의 연구에서, 각각 스님과 재가자가 한 말이다. 현대인들에게 밥은 ‘반찬에 곁들여 먹는 것’이 되어 버렸지만, 내게 주어진 발우에 집중하면 밥 자체가 지닌 맛을 온전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반찬 또한 하나하나의 색상과 식감, 촉촉함과 뒷맛 등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발우에 담긴 밥과 국, 반찬 하나하나와 교감하며 친해지는 시간이기도 함을 알 수 있다.
내 앞에 차려진 음식은 더없이 간소하지만, 다른 이와 함께 먹는 겸상이 아니라 오로지 내가 관장해야 할 밥상이다. 그러나 혼자 배타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뜻을 함께하는 이들과 둘러앉아 공양하는 겸상의 미덕을 갖추었다. 따라서 발우공양의 간소한 독상獨床은, 대중생활을 하는 가운데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출가수행자의 삶을 상징하는 듯 여겨진다. 내 밥상을 내가 관장하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수행의 밥상이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묵언’은 공양을 수행으로 여기게 하는 큰 힘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일상의 가장 풀어지기 쉬운 시간에, ‘밥을 먹는 것’이 수행자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새길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다. (다음 호에는 ‘합송合誦’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자(©) 월간 고경.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뉴스
-

‘옛거울古鏡’, 본래면목 그대로
유난히 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불면석佛面石 옆 단풍나무 잎새도 어느새 불그스레 물이 들어가는 계절입니다. 선선해진 바람을 맞으며 포행을 마치고 들어오니 책상 위에 2024년 10월호 『고경』(통권 …
원택스님 /
-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물병 속에 있다네
어렸을 때는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 시절에 화장실은 집 안에서 가장 구석진 곳에 있었거든요. 무덤 옆으로 지나갈 때는 대낮이라도 무서웠습니다. 산속에 있는 무덤 옆으로야 좀체 지나…
서종택 /
-

구루 린뽀체를 따라서 삼예사원으로
공땅라모를 넘어 설역고원雪域高原 강짼으로 현재 네팔과 티베트 땅을 가르는 고개 중에 ‘공땅라모(Gongtang Lamo, 孔唐拉姆)’라는 아주 높은 고개가 있다. ‘공땅’은 지명이니 ‘공땅…
김규현 /
-

법등을 활용하여 자등을 밝힌다
1. 『대승기신론』의 네 가지 믿음 [질문]스님, 제가 얼마 전 어느 스님의 법문을 녹취한 글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이렇게 여쭙니다. 그 스님께서 법문하신 내용 중에 일심一心, 이문二…
일행스님 /
-

한마음이 나지 않으면 만법에 허물없다
둘은 하나로 말미암아 있음이니 하나마저도 지키지 말라.二由一有 一亦莫守 흔히들 둘은 버리고 하나를 취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두 가지 변견은 하나 때문에 나며 둘은 하나를 전…
성철스님 /
※ 로그인 하시면 추천과 댓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