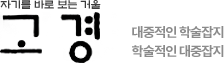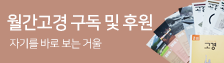[나의 스승, 성철]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니다.”
페이지 정보
원융스님 / 1997 년 9 월 [통권 제7호] / / 작성일20-05-06 08:36 / 조회9,003회 / 댓글0건본문
나의 시자록 / 원융스님(백련암 스님)
한낮의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는 어느 날, 기기암 선원에서 정진중인 원융스님께 ‘나의 시자록’ 원고를 청탁하였다. 스님께서는 결제 기간 중임을 고려하여 원고 마감일을 며칠 연기해 줄 것을 당부하셨고, 해제 뒤 이튿날 인편에 원고를 보내주셨다. 스님의 시간과 『고경』의 지면이 허락치 않음을 아쉬워하며, 훗날 이번 시자록에 이어지는 더 많은 이야기 속에서 다시 한번 스님의 글을 대하는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 - 편집자
"이 젊은이가 스님께 공부하러 갈 겁니다.”
원각회 김경만 회장이 나를 스님께 처음 인사시킨 자리에서 한 말이었다.
“저 사람은 자기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이……!”
스님께서는 버럭 고함을 치시면서 회장을 나무랐다. 회장는 무안해 하였는데, 김회장의 말을 빌면, 이전에 스님께서 “내 밑으로 머리 깎고 들어오면 집 한 채를 특별히 안배할 테다” 하고 몇 차례 권유하셨다고 한다.

1971년 11월 가을, 청담스님의 다비식 다음날 스님께서는 청담스님의 영골을 습골하고 나서 신당동 백련화 보살 댁에서 쉬고 계셨다. 나는 그때 비로소 스님을 처음 뵙게 되었는데, 그날은 피로하시다면서 별 말씀이 없으셨다. 얼굴은 피로 때문인지 까무잡잡해 보였고 형채 있는 커다란 눈으로 나를 유심히 살펴보셨다. 그날은 심재열 거사와 함께 뵈러 갔었는데, 내가 백련암으로 공부하러 가겠다는 확정적인 말이 있기도 전에 회장은 스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다. 조계사에서 청담스님을 모시고 약 3년간 법회를 보아 오다가 갑자기 스님이 돌아가시자, 황당하고 참담해 하는 나 자신보다 주위에서 모두 장차 나의 공부 길을 더 걱정해 주었다. 이제는 아무래도 백련암 스님을 의지해서 공부하는 도리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막상 망설이면서 결정짓지 못하고 있던 참인데, 얼떨결에 확정적인 일이 되어 버렸다.
청담스님과 백련암 스님과는 세속 나이나 승랍으로 보더라도 10년의 차이가 있었으나, 두 분은 수좌로 정진할 때 서로 처음 보았을 때부터 전생에 부부 사이였던 것처럼 절친하고 간격이 없으셨다고 한다. 두 분은 고향이 진주와 산청으로서 같은 진주권역이기도 하였으나 뜻이 서로 통한 나머지 평교간(平交間)처럼 말을 놓고 허물없이 지내셨다고 한다. 두 분 사이의 재미있는 일화들은 지면이 허락지 않아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내가 불교를 본격적으로 접하게 된 것은 나이 서른 무렵이었다. 어느 날 신문 문화면에 동국대 불교대학장을 역임했던 이기영 박사의 글이 실렸는데, 이 박사가 학생들로부터 아직도 이교도를 벗지 못했다는 의혹을 받고 학장직을 물러나게 되고 나서, 그 억울한 심정을 토로한 내용이었다. 그 가운데 “청담스님께서 말씀해 준 ‘莫憎愛하라’(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마라)고 한 법문의 힘으로 참아낼 수 있었다”는 내용의 글이었다. ‘막증애하라’는 말에 나는 두 눈이 번쩍 뜨인 것을 느꼈다. 이 말씀은 내가 여태껏 찾고 있던 말씀으로서, 어느 종교, 철학, 문학, 사상 등에서도 아직 듣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처음 보는 순간 놀라움과 환희심을 가지게 되었다. ‘청담스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길래 이런 말씀을 다 할 수 있을까? 그 스님을 한번 찾아볼수 밖에 없다’ 생각하고 알아본 결과, 조계사에서 툐요일이면 법문을 하신다고 들었다.
조계사에서 처음 법문을 듣던 때는 원각회(그때는 대각회라고 불렀다)를 상대로 『금강경』을 세 번째 말씀해 주던 참이었다. 큰스님께서는 도선사로 가시던 도중에 선학원에서 잠시 쉬어갔는데, 나는 뒤따라가 다짜고짜 인사를 드리고 나서, “스님, ‘막증애하라’는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드니, 스님께서는 얼굴이 환히 펴지시면서 몹시 기뻐하셨다. 그로부터 나는 매 토요일마다 금강경법회에 나가게 되었고, 스님께서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 대강 서둘러 마친 듯하더니, “인제는 『신심명(信心銘)』을 공부하자”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때까지도 ‘막증애 하라’는 법문이『신심명』의 핵심내용인지를 몰랐는데, 막상 『신심명』 법회를 시작하면서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음이요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니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통연히 명백하니라.
至道는 無難이라 唯嫌揀擇이니
但莫憎愛하면 洞然明白하니라
하는 첫머리에서 ‘막증애’ 법문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환희용약(歡喜踊躍)하였으며, 이것을 계기로 불교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된 것이었다. 나는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자기에게 좀 잘해 주고 이익이 되면 희희낙락하고 자기에게 해롭거나 언짢게 대하면 금방 얼굴이 달라지면서 상대방을 미워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사람이 시시각각으로 변덕을 부리는 마음을 쓰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 의연하게 변치 않는 평등한 마음을 쓸 수 없는 것인가? 하고 항상 생각하였다. 그래서 누구의 처세비결, 명상록 등도 읽어보고 문학 사상서들도 읽으면서 더러는 몇 종교를 기웃거려도 보았으나, 여기에서처럼 그런 내용은 접하지 못하였다.

청담스님께서는 매우 진지하고 자상하게 『신심명』을 새겨 주셨는데, “신심명이 끝나기 전에 깨친 사람 하나 나올 것이다” 하면서 몹시 고무된 모습이었다. 나는 기쁨과 신심을 가지고 칠판에다 본문을 쓰는 일을 맡아 하면서 열심히 들었다. 그러나 큰스님의 기대처럼 『신심명』이 다 끝나도록 깨친 사람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신심명』에서 보더라도
믿는 마음은 둘 아니요 둘 아님이 믿는 마음이니
언어의 길이 끊어져서 과거․미래․현재가 아니로다
信心不二요 不二信心이니
言語道斷하야 非去來今이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나의 신심은 사무친 것이 되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큰스님은 한번 새겨도 소식이 없자, 또,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새겨 주셨는데, 이때까지도 적막하였다. 그런데 법문을 들을 때와 듣고 나서 얼마까지는 평온한 마음과 어떤 승묘경계(勝妙境界)까지를 맛볼 수 있었으나 마침내 그것도 이내 허물어져 버렸다. 이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 여기에 대한 근본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이 도리는 한번 깨치지 않고는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깨치기 위해서는 화두라는 참구방편으로써 ‘무(無)’ 자 공안을 참구하는 것이 지름길임을 알았다. 큰스님께서는 결국 ‘무’ 자 법문을 자상하게 말씀해 주셨고, 이후로 나는『신심명』을 일과로써 외움과 동시에 ‘무’ 자를 열심히 참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어찌 된 일인가? 큰스님께서는『신심명』을 세 번째 마지막 새겨 주시던 무렵 열반에 드셨다. 갑자기 스승을 잃고서 하늘이 무너진 듯한 아픔과 슬픔을 맛보았다. 우리는 심재열 거사의 주관으로 큰스님의『신심명』법어집 결집에 곧 착수하였다. 녹음을 푼 초안을 가지고 문장화시키는 작업을 내가 맡아서 하였다. 나는 직장이 끝나고 나면 종로 화신백화점 뒷편에서 조그마한 출판사를 하던 심재열 거사의 사무실에 들러 이 일을 진행하였다. 심재열 거사가 해제(解題)와 체재(體裁)를 다듬고 편집을 하여, 마침내 한 권의 아담한 법어집을『마음의 법문』이란 이름으로 큰스님의 백일재 영전에 법공양으로 올려드렸다.
이것이 끝나고 나서 나는 이내 출가를 결행하게 되었는데, 1972년 음력 정월 스므 이튿날로 기억된다. 백련암 행을 작정은 하였으나 일단 다른 한 곳을 들러서 한참을 늦게 백련암으로 큰스님을 찾아뵙고 출가하러 왔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스님께서는 반기시면서 신당동에서 보신 걸 기억하시겠다고 하셨다. 그때 원택스님이 몇 달 먼저 와 있었는데, 나를 반겨주었다. 또 대오라는 나이 열여덟인 행자가 하나 있었는데, 스님께서는 나를 나무랄 일이 있으면 항상 대오 행자와 비교해서 “나이 스므 살 먹은 놈이나 마흔 살 먹은 놈이나 꼭 같다”고 하여, 나는 결국 곱빼기로 꾸중을 들었다. 그때 내 나이 서른다섯, 역대 조사스님들의 행리를 보아도 서른다섯이 넘어서 출가한 분은 별로 없었다. 오조 법연선사가 그 나이에 출가득도한 것 말고는 다른 분은 알지 못한다.
지금 생각하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출가하도록 모든 조건들이 상당히 충족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무슨 미련이 있었든지 학교를 더 다녀 보겠다고 서울로 올라가 학교 다니다가 휴학하고 군에 가서 만기 제대하고, 졸업 후 직장에 다니고 하면서 십여 년을 그럭저럭 늦춰서 겨우 절집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인연이 그리 성숙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는지…. 한편 백련암 스님을 모시게 된 일로 볼 때, 스므살 때 출가했더라면 그리되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백련암과 큰절 선원에서 20여년 간 시자(侍者)로서 스님을 모시는 동안, 나는 민첩하고 눈치 빠른 선타바(先陀婆) 시자는 되지 못하였다. 오로지 스님께서 주시는 책 받아보고 법문 정리하고 좌복에서 조는 일에만 능했지 다른 일에는 어두웠다. 처음 출가를 결심할 때부터 오로지 이 일만을 위해서 해 마치는 순간까지 서원코 놓지 않겠다는 신심과 원력뿐인지라, 다른 일들에는 널빤지 짊어진 사람(擔板漢)일 따름이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나를 아예 둔근(鈍根)으로 분류하여, “둔근이라야 참선한다”고 말씀하셨다. 가섭존자는『법화경』에서 둔근으로 수기하였으나, 지혜제일 사리불이 아닌 두타제일 마하가섭이 정법안장을 전지함으로써, 이 문중의 종지는 마하반야바라밀이 아닌 정법안장(正法眼藏)으로써 이어져 온 것이다. 참선법을 성취하는 데는 둔공(鈍工)을 드리는 둔방장원(鈍牓壯元)이 제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문중 안에서는 스스로 둔근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둔근을 지켜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관리시험장에서 끝내 한 글자로 써 내려가지 못하고 흰 종이만 끌어당기는 타백(拕白)으로 조롱받지 않기 위해서는 끝까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백련암에서 처음 마음에도 없는 일본어를 익혀서 주시는 책들을 다 받아 보는 데는 2년쯤 걸렸다. 말하자면 ‘백련암 이력’인 셈인데, 전통강원의 주요 교과목들을 포함해서『천태사교의』,『화엄오교장』,『법화』,『유식』등을 마치면『임제록』,『벽암록』,『정법안장』,『정법안장수문기』 등을 주셨다. 일본 조동종 개조 도원(道元)의 『정법안장』은 백 편의 법문이 함께 수록된 단행본이었는데, 그 가운데 「행리(行履)」편을 읽고 나서, 나에게 가장 관심을 끄는 한 분의 행리가 있었다. 저녁 예불이 끝나면 간단히 차 마시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스님께 바로 대매법상(大梅法常) 선사에 대해서 물었다. 스님께서는 몹시 기뻐하시면서 법상스님에 대해서 소참법문(小參法門)식으로 말씀해 주셨다. 법상스님이 “마음이 곧 부처이다〔卽心是佛〕”는 마조의 말씀 끝에 돌아갈 곳을 얻어서 그 길로 대매산으로 들어가 30년을 하산치 않고 용맹정진하였던 이야기며, 법상이 읊었던 저 유명한 게송,
꺾여 버려진 고목이 찬 수풀을 의지해 있나니
봄을 맞이하여 마음 변치 않음이 몇 해이러냐?
나무꾼도 마주쳐 거들떠보지 않거니
대목인들 어찌 애써 챙겨가랴.
摧殘枯木依寒林하니 幾度逢春不變心이냐
樵客遇之猶不顧러니 郢人那得苦追尋이리요
하는 내용들을 병에 물 쏟듯 말씀해 주셨다. 여기서 ‘영주 사람(郢人)’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당나라 때 영주사람들이 가장 좋은 집을 지니고 살았으므로 영주사람이라면 대목을 뜻한다고 설명해 주셨다. 나중에 원택스님한테서 들은 이야기지만, 스님께서는 나의 이 질문에 흡족해하시면서 “여태까지 대매법상에 관해서 물어온 것은 원융이가 처음이다” 하셨다고 한다. 단행본을 다 읽고 나서 갖다 드렸더니, 그냥 지니고 보라고 하여 주신 것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보다는 오히려 그 이름이 좋아서인 까닭이다. 그걸 다 읽고 나서 대혜스님의『정법안장』을 좀 읽게 해달라고 청을 드렸더니 “니가 그걸 어떻게 읽을 수 있겠나?” 하시면서 끝내 주시지 않았다. 앞으로 스스로 읽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백련암에서 주시는 책들을 다 읽고 난 다음에 화두를 받는 것이 보통인데, 나는 혼자서 자꾸 정진 모습을 보인 때문인지 남보다 빨리 화두를 주셨다. 그리하여 출가 이전부터 제법 익어 있던 ‘무’ 자 대신 새로운 화두를 받았다.

1973년 가을 어느 오후, 스님께서는 큰절에 가보자고 하여 혼자서 모시고 갔다. 해제 때문인지라 아래 선열당에 서너 명, 퇴설당에 서너 명, 윗 조사전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퇴설당 뒷 편을 돌아서 조사전 쪽으로 가는 길에 퇴설당의 문이 열린 사이로 깨끗한 유리쪽 같은 장판방에 좌복이 깔려 있는 것을 보는 순간 기쁨이 용솟음쳤다. 그 이듬해부터 나는 장좌불와를 하기로 결심하였다. 『정법안장』을 읽으면서 가섭존자의 12두타행(頭陀行) 가운데 ‘단좌불와(但坐不臥 : 앉기만 하고 눕지 않는다)’는 일과는 나의 눈을 끌었고, 또 스님께서도 젊은 시절 장좌불와를 8년 또는 10년을 했다는 소문은 납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한 번 해보아야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다. 스님께 말씀을 드렸드니 “노력한 일이니까 한 번 해보라”고 하셨다. 1974년 여름에 주신 책들을 대강 다 보고 나서 나는 큰절 선원으로 입방 하였는데, 스님께서는 나더러 장좌불와하니까 조사전에서 정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막상 지내보니 퇴설당이 더욱 마음에 들어서, 이후로 10년을 지낸 것이다.
백련암에서 스님께서는 장좌불와를 허락하시면서 운동으로 하루에 나무 한 짐씩 하는 일과를 주셨는데, 일골이 배지 못한데다 야무지지 못한 체질이라서 그것도 얼마 계속하지 못했다. 큰절에 내려올 때는 하루 3백 배의 일과를 주셨는데, 평소에 2백 배의 일과를 하였고, 절하는 일과는 특히 장좌불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밤새껏 앉아 있다가 새벽에 입선하고 나서 엄습해 오는 피로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몸을 풀고 정상화시키는 데는 이 운동보다 더 좋은 것은 없었다. 아침 다섯 시에 방선하고 나서 법당에 가서 절 3백 배를 하여 땀을 흘리고 나면 지친 피로도 풀리고 몸이 새로 생성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하루의 일과를 생기있게 밀고 나갈 수 있었다.
밤새껏 앉아 있다 보니 대중 정진 시간에 남보다 더 심하게 졸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본 어떤 구참스님은 스님께 나의 장좌를 풀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지, 스님께서 하루는 장좌를 풀라고 하셨다. 옛날 오조 법연선사는 깨친 다음에 장좌불와를 하면서 밤중에 앉아 있다가 새벽 3시만 되면 앉은 채로 합장을 하면 시자가 이를 보고 예불을 드리곤 하였는데, 장좌를 이 정도는 해야만 이익이 있다는 말씀이었다.
또 스님께서 젊은 시절 장좌불와하실 때 일화 하나를 소개한다. 스님께서는 어느 해제 기간 중 망원사에 객으로 들러서 객실에서 밤새껏 앉아 계셨다. 그때 주지였던 춘성(春城)스님이 철수좌가 장좌불와한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하는지 보자고 하여 밤새껏 문구멍을 뚫어 놓고 수시로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볼 때마다 까딱을 않고 그림처럼 앉아 있었다. 다만 밤중에 소변보러 한 번 나온 일 말고는 밤새껏 그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걸 보고 환희심을 내었다. 이후로 춘성스님은 장좌불와를 시작하여 3년을 했더니 이가 모두 빠져버렸었다. 그러나 그 스님이 항용하는 말이 “철수좌가 내 법사야” 하셨다고 한다.
나는 이 분들처럼 꼿꼿하게 앉아 배기지는 못할망정, 해 마쳐야만 풀지언정 쉽사리 그만두지 않겠다는 결심이었기 때문에, 풀라는 스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전대로 꾸준히 계속했더니, 스님께서 한번은 “원융이 고집은 못 꺾는다” “장좌불와는 엉터리라도 힘들다”고 하셨다. 이렇게 나는 퇴설당에서 꼭 10년을 장좌로 정진하였고, 1984년 극락전 자리의 새 선원으로 옮기고 나서도 2년 남짓 더 계속하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소림원 새 선원은 기운은 맑았으나 퇴설당에서처럼 악착같이 밀어붙여 보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지 않았다. 이제는 누군가 장좌를 풀라는 권유도 없었으나 신체적인 이상징후도 조금씩 보인 나머지 스스로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자신의 공부경계를 스스로 살펴볼 때 공부의 밀도가 소가 밟아도 깨지지 않으리라는 자신감이 있었으나, 그것은 얼마 가지를 못했고 이내 평범한 공부자세로 돌아가게 되었다. 장좌를 푼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그래도 그때가 공부하는 것처럼 했던 때였다는 생각이 든다. 적어도 스님께서 말씀한 ‘납자 5계’를 비슷하게나마 지켜야만 장좌의 일과를 지속할 수 있었다. ‘납자 5계’는 완벽하게 지키기란 몹시 어려웠고, 지켜보려고 노력하였으나 완벽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스님께서도 대중에게 더러 말씀하시기를, “5계를 완전히 지킨 사람은 아직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하셨다. 지금의 공부와 장좌할 때의 공부를 비교하면 더 진전했느냐 후퇴했느냐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겠다. 다만 대혜스님의 말씀에서처럼, “선 곳은 이미 익고, 익은 곳은 이미 선다(生處已熟 熟處已生)”는 법문을 가지고 비춰보는 의미가 있겠으나, 그러나 아직 이렇게만 쉬어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1973년 여름, 스님께서는 1967년 총림대중을 상대로 하였던 ‘백일법문’의 프린트 교재와 테이프를 함께 내주시면서 원택스님과 함께 듣게 하셨다. 더운 날씨에 우리 둘은 원택스님의 뒷골방에서 열심히 들었다. 원택스님은 노트에다 녹음을 받아 베끼고 있었다. 뒷날『백일법문』1, 2집과 『신심명․증도가 강설』이 나온 것은 그때 녹음 푼 것을 정리한 것이다.
1984년 스님께서는 극락전 터에 정부가 지은 새 장경각용 건물을 선원으로 개조해 쓰도록 하여 그해 겨울부터 사용하였으며, 퇴설당(堆雪堂)은 방장실로 쓰게 되었다. 그해 겨울 나는 청량사에 잠시 머물면서 『신심명․증도가』법어집을 정리하게 되었는데,『신신명』의 뒷부분에 가서 녹음이 결락되었음을 알았다. 그래서 스님께 이 부분을 다시 말씀해 달라는 청을 드려 퇴설당 방장실에서 녹음을 하였다. 맨 마지막 게송인 “信心不二요 不二信心이니 言語道斷하야 非去來今이로다”를 말씀하실 때 내가 물었다.
“‘신심은 둘이 아니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고 하니, 어찌 된 것입니까?”
그러자 스님께서는,
“어떤 자식이 그렇게 말하드냐? 그건 강사 소견보다 더 못한 것이다.”
하고 나무라시었다.
그보다 칠팔년 전에 칠불사 운상선원에서 정진할 때였다. 방선 시간에 나는 구참스님 두 분과 함께 공부 이야기들을 나누던 중, 그 두 스님은 내가 청담스님의『신심명 강의집』편집에 참여했음은 알고 짐짓 나에게 말을 하였다. ‘신심명(信心銘)’을 ‘믿음과 마음의 새김글’이라 하였고, ‘신심불이 불이신심’을 ‘믿음과 마음은 둘이 아니니, 둘 아닌 믿음과 마음’이라고 번역하였다. 나는 대뜸 “그냥 ‘신심’이라고 해야 옳지 않느냐”고 했더니, 구참 한 사람이 “도둑놈인 모양이지?” 하였다. 곧 백련암 스님이 『백일법문』에서 ‘믿음과 마음’ 둘로 나누어 말씀했다는 뜻인데, 나로서는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없었으나 녹음의 결락 때문에 자신이 없는 나머지, 그 두 스님은 백일법문 회상에서 분명히 그렇게 들었길래 그런 거겠지 생각하고 그냥 쉬어버렸다.
이렇게 하여 나는 두 큰스님의 『신심명』강의를 결집할 행운을 가졌는데, 불교 역사상 ‘문자로서는 최고의 문자요, 가장 훌륭한 글’로서 평가된 이 『신심명』은 ‘믿음과 마음의 새김글’이 아닌 ‘믿은 마음의 새김글〔信心銘〕’로서 영원히 나의 마음속에 자리하였으며, 지금까지 한 편의 일송(日誦)은 나의 중요한 일과의 하나이다.
결락 된 뒷부분을 말씀한 내용 가운데서 “이 ‘신심명’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모를 때는 그것이 금과옥조이지만, 알고 보면 흙덩이보다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두를 열심히 참구해서 자성을 확실히 깨쳐야만 ‘신심명’의 바른 뜻을 알게 된다”는 말씀은 지금까지 귀에 쟁쟁하다.
저작권자(©) 월간 고경.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뉴스
-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물병 속에 있다네
어렸을 때는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 시절에 화장실은 집 안에서 가장 구석진 곳에 있었거든요. 무덤 옆으로 지나갈 때는 대낮이라도 무서웠습니다. 산속에 있는 무덤 옆으로야 좀체 지나…
서종택 /
-

‘옛거울古鏡’, 본래면목 그대로
유난히 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불면석佛面石 옆 단풍나무 잎새도 어느새 불그스레 물이 들어가는 계절입니다. 선선해진 바람을 맞으며 포행을 마치고 들어오니 책상 위에 2024년 10월호 『고경』(통권 …
원택스님 /
-

구루 린뽀체를 따라서 삼예사원으로
공땅라모를 넘어 설역고원雪域高原 강짼으로 현재 네팔과 티베트 땅을 가르는 고개 중에 ‘공땅라모(Gongtang Lamo, 孔唐拉姆)’라는 아주 높은 고개가 있다. ‘공땅’은 지명이니 ‘공땅…
김규현 /
-

햇살을 솜틀하여 만든 알토란 사찰음식
입동이 들어 있는 달이고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11월의 풍광은 아직 가을의 끝자락입니다. 이제 우리는 야무지게 월동 준비를 해야 합니다. 풀과 나무는 성장을 멈추고 모든 것을 다 털어 냅…
박성희 /
-

한마음이 나지 않으면 만법에 허물없다
둘은 하나로 말미암아 있음이니 하나마저도 지키지 말라.二由一有 一亦莫守 흔히들 둘은 버리고 하나를 취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두 가지 변견은 하나 때문에 나며 둘은 하나를 전…
성철스님 /
※ 로그인 하시면 추천과 댓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