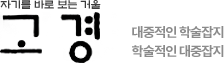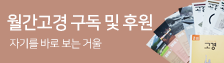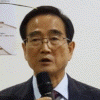[선시산책]
편양언기 선사-배가 갈뿐 언덕은 옮겨가지 않네
페이지 정보
백원기 / 2020 년 3 월 [통권 제83호] / / 작성일20-06-12 11:04 / 조회11,042회 / 댓글0건본문
백원기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문학평론가
‘서산의 4대 문파’ 중에서 가장 융성한 편양파를 이루었던 편양언기((鞭羊彦機, 1581-1644)선사는 양치는 성자로 알려져 있다. 평양성 근처에서 10년간 수백 명의 걸인들을 모아 보살피면서 ‘이 뭐꼬 노장’으로 불리는 등 깨달음을 증득한 후에도 양치기와 거지 왕초로 숨어 지내며 철저한 보살행을 실천했다. 시공을 초월하여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아니했던 선사는 금강산 백화암에서 수행하던 어느 가을날 비가 내리는데 비에 젖어 물든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확철대오하였다. 그 깨달음의 노래가 다음의 시이다.
구름 흐르나 하늘은 움직이지 않고 雲走天無動
배가 갈뿐 언덕은 옮겨가지 않네. 舟行岸不移
본래 한 물건도 없는 것인데 本是無一物
어디에서 기쁨과 슬픔 일어나랴. 何處起歡悲
선사는 변함없는 하늘과 언덕의 모습에서 원융무애의 진리를 깨닫고 있다. 선의 묘지가 불이법문이다. 구름이 제 아무리 다양한 변화를 보인다하더라도 하늘의 근본은 바뀌지 않고, 흐르는 물에 배를 띄우더라도 저편 언덕의 경계는 그대로인 것이다. 그런데 시선의 집착은 곧 내 마음의 집착으로, 사실은 마음이 가고 있었던 것이다. 자연은 원래 있는 그대로인데 내 마음의 희비의 집착에서 웃고 슬퍼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움직임을 넘어서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함을 선사는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깨달음이란 이런 집착된 착각을 여의고 진여의 세계엔 드는 것이다. 출가자가 끊임없는 수행정진의 길을 나서는 것도 ‘본래 한 물건이 없는’ 바로 그런 경지에 이르기 위함이다.
아득한 구름 가엔 겹겹이 둘러싸인 산 雲邊千疊嶂
난간 저 밖엔 소리치는 개울물 檻外一聲川
열흘 동안 장마 비 아니었던들 若不連旬雨
비 개인 뒤 맑은 하늘을 어찌 알리. 那知霽後天
항상 맑은 하늘에서는 하늘의 진정한 모습을 느낄 수 없다. 하지만 계속되는 장마에 언제 개일 것인가 기대하다가 드디어 드러난 맑게 갠 하늘은 참으로 반가울 것이다. 첩첩 산중의 도량에 짙은 구름이 드리우고 열흘 동안 계속되는 장마 비 그치고 난간 밖으로 소리치며 흐르는 개울물 소리를 듣고 일신된 심경을 노래하고 있다. 먹구름이 닫힘의 이미지를 말한다면 콸콸 흘러가는 냇물은 열림의 이미지이다. 여기에서 장마 비는 일념 삼매를 뜻한다. 일념 삼매에 의해서 백천만겁의 번뇌 망상이 사라짐이 소리쳐 흘러가는 개울물 소리로 표상되고 있다. 드러나지 않는 미와 힘든 과정을 극복하고서 깨닫는 환희심, 이것이 곧 회통의 묘이다. 편양 언기의 이러한 회통의 사유는 세속의 선비, 즉 신 거사申居士에게 격의 없는 회포를 표하고 있는 시편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봉래산에서 물은 도, 도는 둘이 아니었고 蓬萊問道道無二
묘향산에서 다시 만났어도 역시 이 마음뿐 香嶽重逢只此心
해 저물어 사립문 밖에서 보내는 때에도 日暮柴門相送處
온 산의 소나무 제 바람에 제 거문고 소리 滿山松檜起風琴
봉래산에서 만나 서로 각기 걷고 있는 길에 대해 담론을 한 적이 있지만 그 길은 둘이 아닌 하나였다. 승·속이라는 입장에서 걷고 있는 길이 다를지 모르지만 그 지향하는 바는 다를 것이 없다. 참다움이라는 실체에는 둘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심전심으로 통했던 것은 하나의 마음이었다. 오늘 그 하나였던 마음이 봉래산에서 만났다. 말과 말을 초월한 대화에서 시간의 흐름을 잊었다. 어느 사이 해는 저물어 작별의 자리로 옮겨진 사립문이다. 세속과 절간을 경계짓는 한계로서의 사립문일 수도 있다. 두 사람의 걸음은 여기서부터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 역시 말이 없다. 이것으로 두 사람의 대화는 끝났다. 더 이상 어느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다. 이 때 온 산에 솔바람이 인다. 솔바람 소리,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의 마음을 튕겨주는 거문고 소리이자 그 소리는 거문고의 줄에서 나온다. 즉, 두 사람을 이어 주는 현의 이 끝과 저 끝이다. 여기서 더더욱 묘함은 바람거문고인 것이다.
선사들은 자연과 더불어 호흡하면서 자연의 도를 배우고, 그것을 통해 청정무구의 구도심을 증장시키는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겼다. 흔히 밝은 달의 둥근 모습은 지상의 모든 사물에게 깨침의 길을 열어준다. 그리하여 불가에서 달은 깨침의 실체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깨달음을 향한 구도의 정신은 만고에 변치 않는 하늘의 달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편양선사의 이러한 구도 정신은 안선연경에게 보여주는 시에서 선명하게 표현되고 있다.
금빛 가을 하늘 달이여 金色秋天月
그 빛 온 누리를 비추네 光明照十方
중생의 마음 물처럼 맑으면 衆生水心淨
곳곳마다 그 맑은 빛 떨어뜨리리 處處落淸光
불가에서 달의 이미지는 무엇일까. 중국 선종의 제3조 승찬스님은 “원동태허圓同太虛 무결무여無缺無餘”로 달의 상징성을 말하고 있다. 지극한 도는 참으로 원융하고 걸림이 없어 둥글기가 허공과 같다는 것이다. 남음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절대적인 무한의 진리가 원으로 표현된 것이며, 그 원의 대표적 상징체가 바로 달이다. 금빛 가을 하늘 달에서 내뿜는 광명은 온 우주를 비추는 빛이다. 하나의 달이 천강을 비추듯 자기 자성이 맑아지면 중생의 마음에도 부처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 빛을 받아들이는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다. 분별심을 끊고 집착하지 않는 청정수 같은 마음을 가진 자 만이 그 광명을 누릴 수 있다. 상징과 은유로 불법의 대의를 밝히고 있는 걸작이다.
평생을 보살행의 실천으로 저자거리를 찾아다니며 전법활동을 했던 편양이었지만, 만년에는 마음의 고향인 산사로 돌아온다. 통성암에 머물며 밭을 일구어 차 싹을 옮겨 심고 정자를 지어 낮에는 불경을 읽고 밤에는 참선을 한다. 하지만 거기에는 번거로움과 조급함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저 즐겁고 한가한 모습이다 담겨 있다.
밝은 창 앞에서 경전을 보고 晴窓看貝葉
저녁 침상에선 선정에 드네 夜榻究禪關
세상의 번화한 사람들이야 世上繁華子
어찌 세상 밖의 한가한 맛을 알리 安知物外閑
산사에서 자유자재한 출출세간의 경지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밭을 일구어 차 그 잎을 따다 차를 끓이고, 나무를 베어 정자를 짓고 그 속에서 무현금 소리를 즐긴다. 또한 해가 한창일 때는 창가에 앉아 경전을 보고, 해가 넘어간 어둠 속에서는 참선에 열중한다. 이러한 삶은 다분히 서산대사의 선교불이禪敎不二의 사상을 그대로 전해 받아 실천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자족과 자락의 세외지미世外之美의 선심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는 시편이다.
한편, 편양은 묘향산의 천수암과 금강산의 천덕사 등 여러 사찰에 주석하면서 후학을 위해 개당 강법하여 널리 교를 선양하였다. 그럼에도 선원의 스님들이 촌음을 아끼며 치열하게 수행 정진해야 함에도 헛되이 세월을 보내는 것을 경책하기도 하였다.
비 내린 뒤뜰에는 밤사이에 꽃이 피어 雨後庭花連夜發
맑은 향기 스며들어 새벽 창이 신선하다 淸香散入曉窓新
꽃은 뜻이 있어 사람 보고 웃는데 花應有意向人笑
선방의 스님네들 헛되이 봄을 보내네 滿院禪僧空度春
비 내린 뒤뜰에 밤사이에 꽃이 피었다. 밤사이에 남몰래 핀 꽃향기가 창을 열자 스며든다. 그때서야 꽃이 핀 것을 알았다. 비에 씨긴 공기도 상쾌하지만 꽃향기는 한결 맑아져 방안의 공기마저 신선하게 해 준다. 그래서 ‘효창신曉窓新’이라 했다. 하지만 웃는 듯 말이 없는 꽃이다. 꽃은 스스로의 존재에 우주의 생명을 안고 있기에 나고 죽음도 없고 절대적인 순간만이 있을 뿐 분별심도 없다. 필시 꽃은 무슨 생각이 있는듯하지만 말없이 웃기만 한다. 이것이 곧 염화미소의 메시지이다. 하지만 선원의 스님들은 이 웃는 의미를 모르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선사이다.
그럼에도 편양은 만년에 자신의 삶에 대한 철저한 반조를 한다. 봄새가 우는 것이 산꽃이 지는 것이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분별심에서 늙고 병드는 것을 슬퍼하고 한탄하는 것이라 하였다.
봄새는 홀로 산꽃 시드는 걸 한탄하는데 春禽獨恨老山花
꽃은 무심하여 스스로 슬퍼하지 않는구나 花老無心莫自嗟
늙은 중은 매미의 버릇을 배우지 못해 老僧不學拘蟬定
새소리 듣고 꽃을 보며 해를 기울이네 聽鳥看花日欲斜
꽃은 스스로의 존재에 우주의 생명을 안고 있기에 나고 죽음도 없고 절대적인 순간만이 있을 뿐 분별심도 없다. 그런데 봄새는 산꽃 시드는 것을 한탄한다. 이는 분별하는데서 비롯된다.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경계는 그 나름대로 의미와 진실을 담고 있다. 설혹 깨달은 눈이 아닐지라도 낙엽이 지는 것을 슬퍼하고 꽃이 지는 것을 한탄하기 보다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윤회의 한 단면으로 본다면, 그것이 결코 슬퍼하거나 한탄할 일만은 아니다. 하여 화자는 매미의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삶을 반조하고 그 심경을 토로한다. 매미는 한 마리가 울면 모두 울고, 한 마리가 그치면 또 모두 그친다. 자기의 존재가 없는 것이다. 절대적인 ‘나’라는 존재는 과거나 미래도 없고 절대적인 순간만이 있다. 철저한 무심의 자각에서 보면 새소리를 듣고 꽃을 보는 것은 내가 새이고 꽃이다. 여기에 편양의 불이不二의 화엄적 사유가 담지되어 있다.

편양언기선사(사진 불교신문)
저작권자(©) 월간 고경.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뉴스
-

카일라스산 VS 카일라사 나트
『고경』을 읽고 계시는 독자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필자는 히말라야의 분수령에 서 있다. 성산聖山 카일라스산을 향해 이미 순례길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나의 앞다리는 티베트의 땅을 …
김규현 /
-

기후미식의 원형 사찰음식
사찰음식은 불교의 자비와 절제, 공존의 정신을 바탕으로 합니다. 자연의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생명을 해치지 않고도 풍요를 느낄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음식 문화입니다. 인공조미료나 육류를…
박성희 /
-

동안상찰 선사 『십현담』 강설⑧ 회기迴機
성철스님의 미공개 법문 12 회기라! 기틀을 돌린다고 해도 괜찮고, 돌려준다고 해도 괜찮고, 경계에서 한 바퀴 빙 도는 셈이야. 열반성리상유위涅槃城裏尙猶危&…
성철스님 /
-

법안문익의 오도송과 게송
중국선 이야기 57_ 법안종 ❹ 중국선에서는 선사들의 게송偈頌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다. 본래 불교는 십이분교十二分敎(주1)로 나누고 있으며, 그 가운데 운문韻文에 해…
김진무 /
-

소신공양과 죽음이 삶을 이기는 방법
만해 선생이 내 백씨를 보고,“범부, 중국 고승전高僧傳에서는 소신공양燒身供養이니 분신공양焚身供養이니 하는 기록이 가끔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아…” 했다.내 백씨는 천천히 입을 …
김춘식 /
※ 로그인 하시면 추천과 댓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