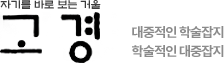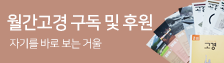[중국선 이야기]
임제종 ⑦ 임제종의 제접법 사빈주四賓主
페이지 정보
김진무 / 2023 년 8 월 [통권 제124호] / / 작성일23-08-04 23:07 / 조회7,175회 / 댓글0건본문
임제종을 창립한 의현의 문정門庭에는 선리禪理를 깨우치고자 다양한 학인들이 몰려들게 되었다. 이러한 학인들은 의현으로부터 선리를 배우기도 하지만 학인들 간에 서로 자신의 경계를 시험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였다. 임제종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주인[主]과 손님[賓, 客]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선지식[主]과 학인[賓]
『임제어록』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주인과 손님이 서로 만나면 바로 말을 주고받는데, 혹은 물物에 응하여 형形을 드러내거나, 혹은 전체작용全體作用이나, 혹은 기권機權으로 기뻐하기도 하고 성내기도 하며, 혹은 몸을 반쯤 드러내기도 하며, 혹은 사자를 타기도 하고, 혹은 코끼리 왕을 타기도 한다.(주1)
이는 대면을 통한 일종의 법거량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체작용’은 임제종의 종지宗旨인 대기대용大機大用을 말하는 것이고, ‘기권’은 본래 ‘기지권모機智權謀’를 뜻하는데, 조사선에서는 기용機用과 방편方便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의현은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예컨대 제방諸方에서 학인이 오면 주인과 손님이 서로 만나고, (학인이) 바로 한마디를 던진다. 이는 앞에 있는 선지식을 알아보려고 재치 있고 의도가 있는 말[機權語路]을 골라 주둥이[口角頭]를 놀려서 ‘아는가? 모르는가?’를 지켜본다. 이때 만약 (선지식이) 이 경계를 알았다면 (그 말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버린다. 그러면 학인은 바로 일상적인 자세로 돌아가 선지식의 가르침을 모색하지만 (선지식은)앞의 말에 따라 그 경계를 빼앗아 버린다.
학인이 “뛰어난 지혜입니다! 대선지식입니다.”라고 말한다. (선지식이) 바로 말하기를 “너는 좋고 나쁨을 조금도 모르는구나!”라고 한다. 그리고 선지식은 하나의 경계[境塊子: ‘境’의 비속어]를 제시하여 학인의 면전에서 희롱하니, 학인은 (그 경계를) 알아차리고 주主를 지어서 경계의 미혹을 받지 않는다. 선지식이 바로 반신半身을 드러내 보이면 학인은 곧바로 할喝을 한다. 선지식이 다시 다양한 차별된 말로 흔들고 두드리면 학인은 “좋고 나쁜 것도 모르는 늙고 머리카락 없는 중이네!”라고 한다. 선지식은 “진정한 도류道流이구나.”라고 찬탄한다.(주2)
이처럼 의현의 문정에서는 선지식과 학인과의 대면을 통하여 선리禪理를 깨우치는 과정을 극도로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주인’과 ‘손님’으로 구분하여 전개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논한 것이 바로 사빈주四賓主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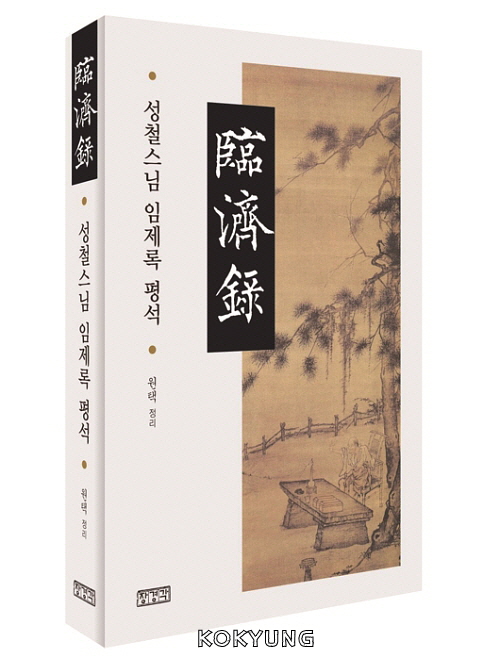
사빈주의 첫째는 빈간주賓看主로서 손님이 주동적으로 주인을 보는 입장이고, 둘째는 주간빈主看賓으로 주인이 손님을 맞이하는 상황이며, 셋째는 주간주主看主로서 찾아온 손님이나 맞는 주인이 모두 주인의 자리에서 만나는 상황이고, 넷째는 빈간빈賓看賓으로서 이와 반대로 손님이나 주인이 모두 손님이 되어 버린 상황이다.
이와 같은 사빈주의 ‘주’와 ‘빈’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보자면, 선사가 ‘주’의 입장이고, 학인이 ‘빈’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으며 언제든지 서로 호환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종문십규론宗門十規論』에서 “임제는 호환互換으로 기機를 삼는다.”(주3)라고 밝히는 바와 같다.
학인이 선지식을 간파하는 빈간주賓看主
이러한 사빈주의 각 내용을 살핀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빈간주’에 대하여 『임제어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한다.
예컨대 진정한 학인이 있다면 곧바로 할을 하여 먼저 하나의 교분자膠盆子를 집어내 보인다. 선지식은 이 경계를 분변分辨하지 못하고 바로 그의 경계 위로 올라와 모양模樣을 짓는다. 학인이 바로 할을 하지만 앞의 사람은 놓으려 하지 않는다. 이는 고황膏肓의 병病으로 의술로 치료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객간주客看主라고 부른다.(주4)
빈간주는 오히려 학인이 선지식보다 더욱 높은 경지에 있으며, 먼저 주동적으로 ‘교분자’를 선지식에게 던지는 것이다. 여기서 ‘교분자’란 아교로 만든 접시로써 선에서 자주 논하는 ‘갈등葛藤’과 유사한 말로 여러 가지 견해나 정식情識이 얽힌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선지식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도리어 이에 빠져들어 ‘모양’을 지어 버린다.
학인이 그러한 선지식을 각성시키고자 ‘할’을 하였지만 깨닫지 못한다. 임제는 이를 ‘고황의 병’이라고 불렀다. 병이 깊어 도저히 의술로써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을 임제는 ‘객간주’라고 했다. 『임제어록』에서는 손님을 ‘객客’으로 표현하지만, 대부분의 선전禪典에서는 ‘빈賓’으로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천안목』에서는 명확하게 “빈간주”(주5)라고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빈’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선지식이 학인을 간파하는 주간빈主看賓
둘째, ‘주간빈’에 대하여 『임제어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혹은 선지식이 사물을 집어내지 않고 학인이 묻는 곳을 따라 바로 빼앗는다. 학인은 빼앗기며 죽어도 놓으려 하지 않으니, 이것이 주간객主看客이다.(주6)
여기에서는 선지식이 참다운 선지식으로서의 안목을 지니고 있어서 학인의 질문에 대하여 잘못된 견해를 타파한다. 하지만 학인이 이에 계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주간빈’은 앞의 ‘빈간주’와 정반대의 상황이라고 하겠다. 여기에서 ‘빼앗는다[奪]’는 의미는 사료간四料簡의 ‘탈인불탈경奪人不奪境’, ‘탈경불탈인奪境不奪人’, ‘인경구탈人境俱奪’, ‘인경구불탈人境俱不奪’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바로 인혹人惑을 타파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학인과 선지식이 모두 도를 아는 주간주主看主
셋째, ‘주간주’에 대하여 임제는 다음과 같이 설한다.
혹은 어떤 학인이 하나의 청정한 경계에 응하여 선지식에게 내기 전인데, 선지식은 이 경계를 분변分辨하여 구덩이에 던져버린다. 학인이 “매우 좋습니다. 선지식이여!”라고 말한다. 선지식은 “돌咄! 좋고 나쁨을 알지 못하는구나.”라고 하자 학인은 곧 예배하였다. 이것을 ‘주간주’라고 칭한다.(주7)

이로부터 ‘주간주’는 선지식과 학인이 모두 선리에 확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인이 청정한 경계를 제출하기도 전에 선지식은 이미 그를 분변하고 있었으며, 또한 그에 대한 집착을 타파하자 학인도 칭송으로 화답하여 자신도 집착을 타파하고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주간주’는 바로 ‘당하즉시當下卽是’와 ‘본래현성本來現成’의 ‘대기대용大機大用’을 완성한 경계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학인과 선지식이 모두 도를 모르는 빈간빈賓看賓
넷째, ‘빈간빈’에 대하여 『임제어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한다.
혹은 어떤 학인은 칼을 쓰고 쇠사슬을 묶여 있어 선지식에게 내기 전에 선지식은 더욱 칼과 쇠사슬을 더한다. 학인은 기뻐하고 서로 분변하지 않으니, 이를 ‘객간객客看客’이라 칭한다.(주8)
여기에서 ‘빈간빈’은 선지식이나 학인이 모두 학리나 정식에 얽매어 있으면서 서로의 망집을 타파해 주기는커녕 더해 주는 상황을 나타낸다. 이 ‘빈간빈’에서 주의할 것은 선지식이나 학인을 모두 ‘빈’으로 칭한다는 점이다. 첫째 ‘빈간주’에서는 선지식이 선리를 깨닫지 못한 상황이라 ‘빈’이 되었고, 학인은 선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주’로 표기하고 있으며, 둘째 ‘주간빈’에서도 선리를 깨달은 선지식이 ‘주’이며, 깨닫지 못한 학인은 명백하게 ‘빈’이다. 한편 학인이나 선지식이 모두 선리를 확철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주간주’이며, 학인과 선지식이 모두 선리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빈간빈’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앞에서 언급한 ‘수처작주隨處作主 입처개진立處皆眞’에서 논하는 ‘주’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해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구절은 “처하는 곳에 있어서 주인이 되며, 서 있는 곳이 모두 진리가 현현한 곳”이라는 해석보다는 “처하는 곳에서 참다운 선리를 깨달아 ‘주’가 되고, 서 있는 곳에서 본래현성을 드러냄”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빈주’를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주’와 ‘빈’이 호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빈주는 선사가 학인을 제접함에 있어서 여러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사빈주와 앞에서 논한 임제삼구를 배대한다면, ‘주간주’는 바로 제일구인 “삼요三要에 주점朱點을 찍어 주인과 객을 헤아려 나누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주9)라는 것과 유사하고, ‘주간빈’과 ‘빈간주’의 ‘빈’은 제이구인 “묘해妙解가 어찌 무착無著의 질문을 용납하겠는가! 그러나 방편[漚和]으로 어찌 (번뇌의) 흐름을 끊은 근기根機를 저버리겠는가!”(주10)라는 도출수증道出修證의 단계에, 그리고 ‘빈간빈’은 바로 제삼구인 “무대 위의 놀아나는 꼭두각시를 보아라. 그를 당기고 늘어뜨리는 것은 모두 그 뒤에 있는 사람이다.”(주11)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에는 의현의 또 다른 제접법인 사료간四料簡과 사조용四照用을 고찰하고자 한다.
<각주>
(주1) [唐]慧然集, 『鎭州臨濟慧照禪師語錄』(大正藏47, 501a), “主客相見, 便有言論往來, 或應物現形, 或全體作用, 或機權喜怒, 或現半身, 或乘師子, 或乘象王.”
(주2) 앞의 책(大正藏47, 500a-b), “如諸方有學人來, 主客相見了, 便有一句子語: 辨前頭善知識被學人拈出箇機權語路, 向善知識口角頭攛過, 看爾識不識. 爾若識得是境, 把得便抛向坑子裏. 學人便卽尋常, 然後便索善知識語, 依前奪之. 學人云: 上智哉! 是大善知識. 卽云: 爾大不識好惡. 如善知識把出箇境塊子, 向學人面前弄, 前人辨得下下作主, 不受境惑. 善知識便卽現半身, 學人便喝. 善知識又入一切差別語路中擺撲, 學人云: 不識好惡老禿奴. 善知識歎曰: 眞正道流.”
(주3) [唐]文益撰, 『宗門十規論』(卍續藏63, 37c), “臨濟則互換爲機.”
(주4) [唐]慧然集, 『鎭州臨濟慧照禪師語錄』(大正藏47, 501a), “如有眞正學人, 便喝先拈出一個膠盆子. 善知識不辨是境, 便上他境上, 作模作樣. 學人便喝, 前人不肯放. 此是膏肓之病, 不堪醫治, 喚作客看主.”
(주5) [宋]智昭集, 『人天眼目』(大正藏48, 303a), “喚作賓看主.”
(주6) [唐]慧然集, 『鎭州臨濟慧照禪師語錄』(大正藏47, 501a), “或是善知識不拈出物, 隨學人問處卽奪, 學人被奪抵死不放, 此是主看客.”
(주7) 앞의 책. “或有學人應一箇淸淨境出善知識前, 善知識辨得是境, 把得抛向坑裏. 學人言: 大好善知識. 卽云: 咄哉! 不識好惡. 學人便禮拜. 此喚作主看主.”
(주8) 앞의 책. “或有學人, 披枷帶鎖, 出善知識前, 善知識更與安一重枷鎖. 學人歡喜, 彼此不辨, 呼爲客看客.”
(주9) 앞의 책(大正藏47, 497a), “三要印開朱點側, 未容擬議主賓分.”
(주10) 앞의 책. “妙解豈容無著問! 漚和爭負截流機.”
(주11) 앞의 책. “看取棚頭弄傀儡, 抽牽都籍裏頭人.”
저작권자(©) 월간 고경.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뉴스
-

카일라스산 VS 카일라사 나트
『고경』을 읽고 계시는 독자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필자는 히말라야의 분수령에 서 있다. 성산聖山 카일라스산을 향해 이미 순례길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나의 앞다리는 티베트의 땅을 …
김규현 /
-

기후미식의 원형 사찰음식
사찰음식은 불교의 자비와 절제, 공존의 정신을 바탕으로 합니다. 자연의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생명을 해치지 않고도 풍요를 느낄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음식 문화입니다. 인공조미료나 육류를…
박성희 /
-

동안상찰 선사 『십현담』 강설⑧ 회기迴機
성철스님의 미공개 법문 12 회기라! 기틀을 돌린다고 해도 괜찮고, 돌려준다고 해도 괜찮고, 경계에서 한 바퀴 빙 도는 셈이야. 열반성리상유위涅槃城裏尙猶危&…
성철스님 /
-

법안문익의 오도송과 게송
중국선 이야기 57_ 법안종 ❹ 중국선에서는 선사들의 게송偈頌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다. 본래 불교는 십이분교十二分敎(주1)로 나누고 있으며, 그 가운데 운문韻文에 해…
김진무 /
-

소신공양과 죽음이 삶을 이기는 방법
만해 선생이 내 백씨를 보고,“범부, 중국 고승전高僧傳에서는 소신공양燒身供養이니 분신공양焚身供養이니 하는 기록이 가끔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아…” 했다.내 백씨는 천천히 입을 …
김춘식 /
※ 로그인 하시면 추천과 댓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