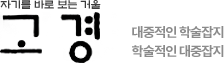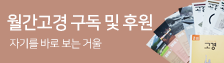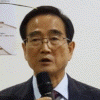[선시산책]
티끌과 정토가 모두 한 암자에 있네
페이지 정보
백원기 / 2020 년 4 월 [통권 제84호] / / 작성일20-05-28 16:23 / 조회7,592회 / 댓글0건본문
백원기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문학평론가
원감국사 충지(1226∼1292)는 장흥 출신으로, 19세 장원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지낸 후 29세에 선원사의 원오국사(1215~1286)에게로 출가하여 득도하였다. 조계산 수선사(현재 송광사)의 제 6세 국사이다.
선사는 출가 후 생사를 초월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두타행(頭陀行)을 멈추지 않았다. 지리산 상무주암(上無住庵)에서 홀로 선정삼매에 들 때의 모습이 마치 허수아비 같았고, 거미줄이 얼굴을 덮고 새발자국이 무릎에 찍힐 정도로 용맹정진을 하였던 선사였다. 그런데 선정에 들어있던 어느 날, 티끌과 정토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그 깨달음의 순간을 선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티끌과 정토가 모두 한 암자에 있어 塵刹都盧在一庵
방장실 떠나지 않고도 남방을 두루 순방했네. 不離方丈遍詢南
선재동자는 왜 그리도 심한 고생을 자처하여 善財何用勤劬甚
53선지식을 찾아 110성을 차례로 찾아갔던가. 百十城中枉歷參
깨달음을 얻은 선사의 눈에는 자연법과 깨달음의 법이 둘이 아니라 하나였다. 곧 천지가 둘이 아닌 하나의 법신향[天地一香]임을 깨달았던 것이다. 53 선지식을 찾아다닌 것은 《화염경》의 선재동자를 본받고자 함이었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 선재동자처럼 선지식을 찾아 다녔던 수고로움이 더 이상 필요 없으며, 천지가 동근이고 하나의 법신향임을 선사는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방장실, 즉 한 장의 공간을 벗어나지도 않고 110성이라는 수많은 곳을 순방한다는 것은 활안(活眼)한 선승의 오도의 경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원오국사의 부름을 받고 김해 감로사의 주지로 있을 때, 원감국사의 법력을 시험하고자 하는 한 선덕이 찾아와 “무엇이 부처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선사는 천지를 꿰뚫는 걸림 없는 사자후를 다음과 같이 토했다.
봄날 계수나무 동산에 꽃이 피었는데 春日花開桂苑中
그윽한 향기는 소림의 바람에 날리지 않네. 暗香不動小林風
오늘 아침 열매 익어 감로사를 적시니 今朝果熟沾甘露
무수한 사람과 하늘이 단 맛을 함께 하네. 無限人天一味同
위의 시가 순식간에 퍼져 대중에게 회자되고, 전국 각지의 운수납자들이 선사의 설법을 듣기 위하여 감로사에 구름처럼 몰려 왔다고 한다. “봄날 계수나무 동산에 핀 꽃”은 지난날 벼슬길에서의 득의를, “그윽한 향기 소림엔 날리지 않”는다 함은 벼슬이 대중 교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비유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열매 익어 감로사를 적시”는 것은 이제 선문에 들어 불법 나눔의 큰 보람을 느낌이고, 마지막 시행 “무수한 사람과 하늘이 단 맛을 함께 한”다는 것은 하화중생과 다선일미의 환희심을 노래한 것이다.
선승들은 예로부터 산과 물을 벗하며 살아간다. 사는 곳이 산속이니 의당 그럴 수밖에 없었다. 무심한 자연 속에 무심으로 한가롭게 살아간다. 여기의 한가로움이라는 것은 망중한(忙中閑)이다. 막연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한(閑)은 망(忙)이 있어서 한가로운 것이며, 선사의 한가로움은 바로 그런 것이다. 이렇듯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차를 마시는 것은 무소득의 청정심을 보여 준다.
배고파 밥 먹으니 밥맛이 더욱 좋고 飢來喫飯飯尤美
잠에서 깨어 마시니 차 맛이 더욱 좋네. 睡起啜茶茶更甘
사는 곳 외져서 찾는 사람 없으니 地僻從無人扣戶
암자 비어 기쁘게 부처님과 같은 방에 있네. 庵空喜有佛同龕
무심 자적하고 청정무구한 선사의 일상생활을 엿 볼 수 있다. 아직 덜 깨달은 자는 밥 먹고 차 마시는 일이 뭘 그리 어려운 일이고, 깨달음의 길이냐고 묻는다. 하지만 자고 싶어 자고 차를 마시고 싶을 때 마시는 일이 어찌 그리 쉬운 일이겠는가. 선사는 배고파 밥 먹고 그 맛을 음미하니 일미(一味)이고, 잠에서 깨어나 차를 마시고 싶어 차를 마시니 차 맛이 한결 좋다. 비록 암자는 외진 곳에 있어 찾아오는 사람마저 없어 더욱 한적하지만, 그 마저 비어 부처님과 한 방에 있게 되니 그 인연 더욱 기쁘다는 선사이다.
눈을 뜨면 사방이 산이고, 그것을 아무리 보아도 싫지가 않으며, 때때로 들려오는 물소리 그 소리에 짜증을 내 본 적이 없는 것이 산승들의 삶이다. 순천 정혜사에 주석한 선사는 어느 봄, 유달리 푸른 산색을 보고, 시냇물 흐르는 소리를 듣고서 부처님의 법이 자연 자체이며, 시냇물 소리 또한 부처님의 설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노래했다.
계족산 봉우리 앞 옛 도량 鷄足峯前古道場
이제와 보니 유달리 푸른 산 빛.今來山翠別生光
물소리 그대로 부처님 말씀이니 廣長自有淸溪舌
도를 일러 무어라 설할 것인가. 何必喃喃更擧揚
산사 주위를 감싸고 있는 푸른 산 빛, 계곡을 흘러내리는 시냇물 소리는 모두 진여의 모습과 소리 아님이 없어 이미 불법을 완벽하고 설하고 있다. 그러니 새삼 구차스럽게 도를 논할 말이 없다는 것이 선사의 생각이다. 사실 깨달음의 경지에서 보면 산과 물, 초목, 이 모두가 도(道) 아님이 없고 불성 아님이 없다. 하여 선사는 불법이 자연 자체이고 보면, 시냇물 소리 역시 부처님의 설법이니 자연의 모든 현상이 곧 무정설법임을 설하고 있다. 선사의 담박하면서도 소박한 물외한인(物外閑人)의 선취는 몰상식의 상식화를 이끌어 내어 가히 황금결의 선미를 자아내고 있다.
흘러가는 시냇물과 솔바람소리보다 아름다운 음악이 어디 있으며, 산빛보다 아름다운 색상이 어디 있겠는가. 늘 깨어 있는 투명한 영혼이 되도록 일깨워 주는 것이 산이요, 또 물이다. 귀를 통한 물소리로 세속의 부질없는 생각을 씻고, 눈을 통한 산빛으로 번뇌를 식히는 산사생활의 한가함을 선사는 이렇게 노래한다.
날마다 산을 봐도 볼수록 좋고 日日看山看不足
물소리 늘 들어도 싫지 않네. 時時聽水聽無厭
저절로 눈과 귀 맑게 트이니 自然耳目皆淸快
물소리 산 빛 속에 마음 편하네. 聲色中間好養恬
늘 보는 산이지만 산은 늘 새롭고, 또한 늘 듣는 물소리라 싫증이 날 법도 하지만 들을 때 마다 시내가 들려주는 선율은 색다르다. 그것은 산의 모양이나 물소리에 집착(執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분별심이 사라진 상태에서 자연을 대하면 자연은 언제나 나와 합일이 된다. 때문에 귀와 눈도 내 마음을 여는 창이 되어 항상 맑고 시원한 산과 물소리를 전해 주는 것이다.
선사들은 죽음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깨달음을 통해 영혼의 긴 여정을 마치고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감, 즉 ‘환지본처’를 말한다. 세속의 길을 버리고 올곧게 열심히 살아온 출가자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담담하게 노래하고 있다. 임종을 앞두고, 진여본체의 섭리와 자연의 이법을 깨우치려 하였던 선사는 존재의 부름에 귀의하는 즐거움을 ‘고향에 돌아가는’ 즐거움으로 표현하고 있다.
살아온 세월 돌아보니 육십칠 년인데 閱過行年六十七
오늘 아침에서야 만사가 끝나도다. 及到今朝萬事畢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훤하게 열렸으니 故鄕歸路坦然平
앞길은 분명해 헤맬 일이 없겠구나. 路頭分明曾未失
손에 겨우 지팡이 하나 들었을 뿐인데 手中纔有一枝筇
가는 길 다리 덜 피로할 것 같아 또한 기쁘네. 且喜途中脚不倦
1292년 1월 10일, 선사는 문도들에게 "사람이 우주공간에 산다는 것은 잠시 여인숙에 머무는 것이요, 본래 오고 가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니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선상(禪床)에 앉아 '설본무설(說本無說)'이라 설하고, 입적하였다. 수중에 있는 지팡이 하나가 그 일생을 통해 얻은 깨달음의 징표임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저승의 길을 마치 소풍가듯 떠나가고 있는 선사의 담대한 모습에서 고향을 향해 가는 가벼운 발걸음 소리를 듣는 듯하다. 생사의 두려움이 없는 경지에 이르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기쁨의 노래이다. 티끌과 정토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천지일향’의 깨달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경주 남산 탑곡마애불상군, 보물 제201호. 통일신라시대, 현봉 박우현 거사 2019년 11월11일 촬영.
저작권자(©) 월간 고경.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뉴스
-

30여 년 만에 금빛 장엄을 마친 고심원
어느 날 큰스님께서 부르시더니, “원택아! 내가 이제 장경각에 있는 책장을 열 힘도 없어졌다. 그러니 장경각에 들어가면 책장을 열지 않고도 책을 자유롭게 뽑아 볼 수 있게 장경각을 새로 지어야겠다.…
원택스님 /
-

죽은 뒤에는 소가 되리라
오늘은 친구들과 모처럼 팔공산 내원암 산행을 합니다. 동화사 북서쪽 주차장에 내리니 언덕을 밀고 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 팔공산 주 능선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팔공산 능선을 바라보면 언제나 가…
서종택 /
-

연꽃에서 태어난 사람 빠드마 삼바바
‘옴 아 훔 바즈라 구루 빠드마 싣디 훔’ ‘마하 구루(Maha Guru)’에게 바치는 만트라(Mantra, 眞言)이다.지난 호에 『바르도 퇴돌』의 출현에 대한 글이 넘쳐서 이번 달로 이어…
김규현 /
-

참선 수행의 무량한 공덕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설사 억천만겁 동안 나의 깊고 묘한 법문을 다 외운다 하더라도 단 하루 동안 도를 닦아 마음을 밝힘만 못하느니라.” 붓다의 참선과 아난의 글&nb…
성철스님 /
-

붓다의 생애와 본생도
우리나라에는 부처님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돈황 벽화에는 부처님의 전생에 관한 이야기가 개굴 초기부터 많이 그려졌다. 불교의 영혼불멸, 인과응보, 윤회전생의 교의에 따…
김선희 /
※ 로그인 하시면 추천과 댓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