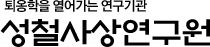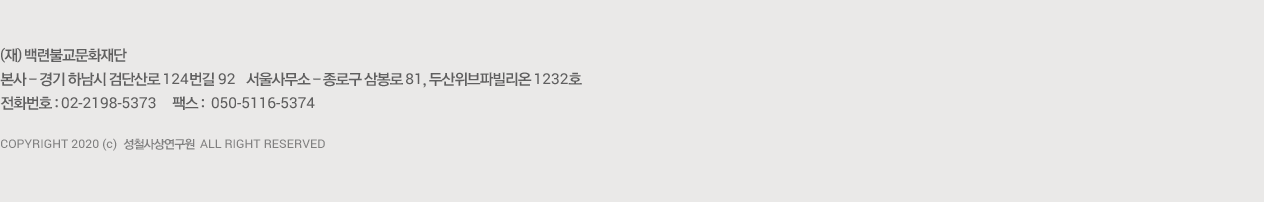|
||
| 사불산 묘적암. 성철스님은 1945년 동안거를 이곳에서 지냈다. 차에서 내려 돌계단을 스무 개 남짓 걸어 올라가면 일주문이 있다. 현판은 불이문. 작지만 고풍스런 품격의 일주문을 지나면 법당 한 채, 요사채 한 채가 눈에 들어온다.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 ||
일본은 한국을 강제점령한 후 불교계를 그릇치고 비뚤어지게 했다. 독신출가 수행이 근본인 한국불교를 자기네 마음대로 승려의 결혼을 강제하고 절간에서 처자식을 기르는 등으로 수행공간을 훼손시켰으며 육식을 하는 등 막행막식의 풍토를 조성했다.
일제치하에서 왜색불교의 병폐를 너무나 절감한 스님은 광복 후 우리불교의 청정승가 수행을 구현하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성숙시켜나갔다. 스님의 이 구상은 1947년 봉암사결사에서 하나하나 드러나게 된다.
법당 한 채·요사채 한 채 ‘침묵이 곧 우레(一如雷)’
‘가장 완벽하고 높은 경지’ 실현하는 도량(妙寂庵)
고려말 나옹스님 출가사찰 백련암 입구와 너무나 닮아…
묘적암은 창건연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신라 말 부설거사(浮雪居士)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고려 말 나옹(懶翁)스님이 출가한 절로 유명하다. 나옹스님(1320~1376)은 경북 영해(寧海, 현재 경북 영덕군 창수면) 출신이다. 처음 이름은 원혜(元惠). 호는 나옹이며 당호는 강월헌(江月軒). 불명은 혜근(惠勤)이며 속성은 아(牙)씨다.
나옹스님은 20세 때 이웃 동무가 죽는 것을 보고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고 어른들에게 물었으나 아는 이가 없으므로 비통한 생각을 품고 공덕산(功德山, 지금의 사불산) 묘적암으로 와 요연(了然)화상에게서 스님이 되었다.
나옹스님이 처음 요연스님을 찾아 스님이 되기를 청하였을 때 요연스님이 물었다. “여기 온 것이 무슨 물건이냐?” 나옹스님은 “말하고 듣는 것이 왔거니와 보려 하여도 볼 수 없고, 찾으려 하여도 찾을 수 없나이다. 어떻게 닦아야 하겠나이까” 하니 요연스님이 “나도 너와 같아서 알 수 없으니 다른 스님께 가서 물어라”고 했다. 뒷날 나옹스님이 도를 깨닫고 다시 이 절로 돌아와서 회목 42그루를 심었으며 나옹스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 절에 찾아왔다.
 |
||
| 묘적암 법당 외관. | ||
묘적암. 큰절에서 약 1.5㎞ 거리다. 가파른 산길인데 차 2대가 마주 스쳐지나가기도 힘든 좁은 길이다. 오르막 내리막 굴곡이 심하여 길이 났다고 해도 차를 타고 가기에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큰절 대승사 총무국장 현광(玄光)스님이 자기 차로 앞장서서 암자에 이르는 길을 안내했다.
묘적암 입구에 서니 꼭 해인사 백련암 입구와 형상이 많이 닮아 이름난 수행처는 이런가 싶었다. 차에서 내려 돌계단을 스무 개 남짓 걸어 올라가니 묘적암 일주문이 있었다. 그 일주문, 불이문이라는 현판이었다.
또한 백련암 일주문과 너무 닮았다. 옛 산중 깊은 곳 암자 일주문은 이런 형태로 지었는지도 모르겠다. 작지만 고풍스런 품격의 일주문을 지나니 작은 마당이었다. 법당 한 채, 요사채 한 채. 중수이후 손을 보지 않은 듯 고색창연했다.
 |
||
마침 법당 안에서 젊은 부부가 나왔다. 절을 얼마나 했는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부부가 절을 나간 후 법당에 참배했다. 법당 옆에 조그만 방이 있었다. 마치 선방의 지대방 같은 곳이었다. 그곳이 이곳 스님의 거처인 듯 했다.
요사채 벽에 있는 일묵여뢰(一如雷, 침묵이 곧 우레)라는 현판이 눈에 띄었다. 진주의 명필 은초(隱樵) 정명수(鄭命壽) 선생의 필체다. ‘정사(丁巳) 하(夏)’라고 쓴 것을 보아 그분이 1977년 여름에 이 문구를 쓴 것으로 알 수 있다. ‘침묵이 우레와 같다’는 이 말이야말로 이 암자 이름인 ‘묘적’과 정말로 잘 어울린다 생각했다.
해방 후 왜색불교병폐 절감…나라 앞날에 대한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깊고 무거운 고뇌 속에서 보냈으리라 …
이곳에서 정진하고 있는 영진스님. 그는 출가한지 40년 된 구참이라 한다. 영진스님은 지난 4월말 불교신문 인터뷰에서 묘적암을 이렇게 말했다.
“불교에서 묘(妙)라는 글자는 ‘가장 뛰어나다, 깊다,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진공묘유(眞空妙有)라고 불교에서 대승(大乘)의 지극(至極)을 이르는 말, <법화경>에서도 묘(妙)는 가장 완벽한 글자이지요. 또 적(寂)은 적멸, 열반과 같이 형상적으로 보면 ‘주변이 고요하다’는 뜻이지만 ‘가장 높은 경지’를 일컫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암자는 ‘묘와 적을 실현하는 도량’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묘적암, 언제나 이렇듯 조용하고 적적할까. 여기 사는 스님은 이 깊고 고요한 절에서 어찌 지낼까. 끼니는 어찌 꾸려나갈까를 생각하는 것은 속인의 어리석은 마음일까.
출가수행자는 이런 묘적의 공간에서도 자신의 길을 닦아나가고 시장바닥 같은 번잡하고 시끄러운 곳에서도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아 동과 정(動靜)에서 변치 않는 항상심을 지니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 일체경계에 무심, 일체(一切)에 무심(無心)이 수행자가 추구하는 곳이라는 말일까.
성철스님이 묘적암에서 지낼 때 생식(生食)을 했음도 짐작할만하다. 출가수행자나 재가불자나 가릴 것 없이 끼니를 때우는 일이 보통일이 아니다. 절에서는 그래서 각자 소임이 있다. 밥 짓는 공양주, 찬 만드는 채공 등이 후원 공양간에서 수행자의 공양을 맡는다.
 |
||
묘적암처럼 공양간을 차리기도 힘든 공간에서는 먹는 일이 여간 아니다. 어쩌면 성철스님도 그래서 생식했나보다. 먹는 일에 끄달리지 않고 수행할 수 있음이 생식의 장점이다. 그러나 생식이라 하여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님을 알아야 한다. 어느 스님, 누구라고 말하면 웬만한 불자는 다 아는 스님이다. 그 스님이 언젠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성철 큰스님이 생식하신다고 해서 나도 해 보았어요. 그런데 생쌀을 그냥 씹어 먹으려니까 이도 아프고 잘 씹히지도 않고 해서 큰스님께 물었어요. ‘스님, 생식은 어찌 합니까’ 스님은 ‘그래, 생식한다꼬 생쌀 씹어 묵었나. 허허, 그라모 안되지. 쌀을 물에 불려놓았다가 꼭꼭 씹어 묵어야지’ 그러셨어요. 생식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광복을 맞은 우리나라. 이른바 해방공간에서 성철스님은 묘적암, 그 고요하고 깊은 산중암자에서 무슨 구상을 그리 깊게 했을까. 한국불교의 앞날, 나아가 해방된 나라의 앞날에 대한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깊고 무겁게 보냈으리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한 시대의 격변기에서 진리를 체득한 선지식으로서 스님의 구상은 그 이후로 크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 ■ 되새기는 성철스님 법어
고행(苦行) 병(病) 가운데 제일 큰 병은 게으름 병이다. 모든 죄악과 타락과 실패는 게으름에서 온다. 게으름은 편하려는 것을 의미하니 그것은 죄악의 근본이다. 결국은 없어지고 마는 이 살덩어리 하나 편하게 해 주려고 온갖 죄악을 다 짓는 것이다. 노력 없는 성공이 어디 있는가? 그러므로 대성공자는 대노력가가 아님이 없다. 그리고 이 육체를 이겨내는 그 정도만큼 성공이 커지는 것이다. 발명왕 에디슨이 말했다. “나의 발명은 모두 노력에 있다. 나는 날마다 20시간 노력하여 연구했다. 그렇게 30년간 계속 하였으나 한 번도 괴로운 생각을 해 본 일이 없다.” 그러므로 여래의 정법이 두타제일(頭陀第一)인 가섭존자에게로 오지 않았는가. 총림을 창설해서 만고에 규범을 세운 백장(百丈)스님은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一日不作 一日不食)”고 하지 않았는가!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편히만 지내려는 생각, 이러한 썩은 생각으로서는 절대로 대도(大道)는 성취하지 못한다. 땀 흘리면서 먹고 살아야 한다. 남의 밥 먹고 내 일 하려는 썩은 정신으로서는 만사불성(萬事不成)이다. 예부터 말하기를 차라리 뜨거운 쇠로 몸을 감을지언정 신심 있는 신도의 의복을 받지 말며 뜨거운 쇳물을 마실지언정 신심인(信心人)의 음식을 얻어먹지 말라고 경계하였다. 이러한 철저한 결심 없이는 대도는 성취하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잊지 말고 잊지 말자. 일일부작(一日不作) 일일불식(一日不食)의 만고 철칙을! 오직 영원한 대자유를 위해 모든 고로(苦勞)를 참고 이겨야 한다. - 수도8계(修道八戒) 중에서 |
[불교신문 2758호/ 10월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