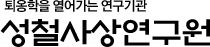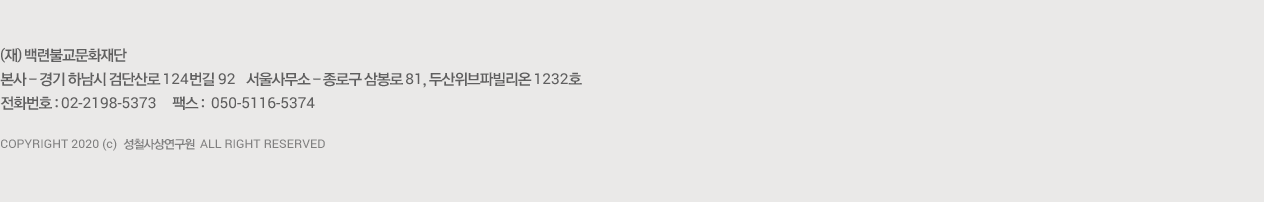|
||
|
“시냇물 소리가 곧 부처님의 설법이니 산 빛이 어찌 청정법신이 아니리오. 밤이 되어 팔만 사천 게송이나 되는 것을 다른 날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들어 보이리오(溪聲便是長廣舌 山色豈非淸淨身 夜來八萬四千揭 他日如河擧似人)” -소동파 오도송 중에서. 물소리 바람소리…. 부처님 말씀 아닌 것이 없다. 사진은 조계총림 송광사 경내 계곡. 김형주 기자 | ||
성철스님은 1940년 금당선원에서 동안거 때 오도(悟道)한 후 이듬해 1941년 전남 순천 송광사 삼일암으로 갔다. 하안거를 하기 위한 걸음이었다. 삼일암(三日庵)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 큰절에 딸린 암자가 아니었다. 송광사 큰 절내에 있는 한 당우(堂宇)를 말한다.
응진전 옆에 상사당(上舍堂)과 하사당(下舍堂)이 있다. 이 상사당 하사당은 한 건물에 두 현판이 있는데 각각 상사.하사당이라 했다. 상사당과 하사당 현판의 중간에 당대 명필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의 글씨로 ‘世界一花 祖宗六葉(세계일화 조종육엽)’이라 쓴 편액이 있다.
지난 5월 하순 송광사에 들렀다. 송광사는 한국불교의 3대 사찰의 하나로 승보종찰(僧寶宗刹)이다. 송광사에는 많은 명안종사(明眼宗師, 눈 밝은 큰스님)들이 나와 선풍을 드날렸다. 보조 지눌스님을 비롯하여 16국사(國師)가 나왔다. 그래서 ‘승보종찰’이라 한다.
당대 선지식 효봉-만공스님 친견 위한 구도행 ‘짐작’
“사람노릇하려면 옳은 중노릇 못한다”
‘철 수좌’ 말씀 일타스님 평생에 큰 영향
삼일암 머문 불과 닷새…정진대중에 ‘깊은 인상’ 남겨
대웅전 앞마당의 매화나무에는 꽃은 다 떨어졌고 매실이 부는 바람에 하나둘 마당에 떨어지고 있었다. 상사.하사당 뒤편에는 삼일암이라고 쓴 현판이 걸려 있다. 한 건물인데 앞쪽은 상사당.하사당이요 뒤편엔 삼일암이라는 현판을 걸었다.
삼일암은 송광사 16국사 중 제9대 조사 담당(湛堂)국사가 이 곳의 물을 마시고 3일 만에 오도했으므로 부쳐진 이름이라 한다. 담당국사는 고려 때 스님으로 생몰연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송광사에 전해오는 말에는 그가 중국인이라 한다.
원(元)나라 순종(順宗, 1343년) 때 고려에 왔다고 한다. 그는 본래 송광사 암자인 천자암(天子庵)에서 수도하다가 이 곳 상사당에서 3일 만에 오도하고 그 우물을 삼일영천(三日靈泉)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상.하사당이 선방으로 쓰일 때 상사당에는 구참납자(舊參衲子)가, 하사당에는 신참납자가 정진했다고 한다.
건물의 크기는 전면과 측면 각각 3간이며 1951년 한국전쟁 때에도 다행히 화재를 모면했다. 그러나 건립연대를 고증할 자료는 없다.
 |
||
|
성철스님이 오도 이듬해인 1941년 하안거를 위한 들렀던 승보종찰 송광사 삼일암. 김형주 기자 | ||
성철스님이 삼일암에 갔을 때 그곳에는 당대의 고승 효봉스님이 있었다. 효봉(曉峰, 1888~1966)스님은 평안남도 양덕에서 태어나 1925년 37세 때 금강산 신계사 보운암에서 석두(石頭)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스님은 1927년 여름 신계사 미륵암 선원에서 안거에 들면서 정진대중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반야에 인연이 엷은데다가 늦게 중이 되었으니 한가한 정진은 할 수 없습니다. 묵언을 하면서 입선과 방선, 경행도 하지 않고 줄곧 앉아만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석 달 동안 정진했다. 줄곧 앉아만 있으니 엉덩이 살이 헐어서 진물이 나와 바지와 방석이 들러붙을 지경이었다. 그래서 ‘절구통 수좌’라는 별명을 얻기까지 했다. 1930년 늦은 봄 스님 나이 42세 때. 법기암 뒤에 토굴을 짓고 ‘깨닫기 전에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토굴 밖으로 나오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 이듬해 여름, 비가 갠 어느 날 아침, 스님은 토굴을 박차고 밖으로 나왔다. 1년6개월만이었다. 스님은 그때 오도했다.
이후 효봉스님은 1954년 교단정화 운동에 앞장섰으며 1957년 총무원장, 1962~ 1966년 통합종단 초대종정을 역임했다. 1966년 10월15일 세수 78, 법랍 42세로 열반에 들었다.
성철스님이 오도 후 첫 발걸음을 송광사 삼일암으로 향한 의중은 헤아리기 힘들다. 그러나 스님의 행적은 송광사 삼일암 이후 충남 예산 수덕사 정혜사로 향한 것으로 보아 당대 선지식 효봉, 만공스님을 친견하기 위함이 아닌가 짐작되기도 한다. 효봉스님과 만남의 자리에서 법거량(法擧揚)이 있었는지는 정확한 기록을 못 찾았다.
그러나 성철스님이 삼일암에 갔을 때의 기록은 있다. 성철스님문도회에서 불기2540(서기1996)년 펴낸 계간지 <고경(古鏡)> 겨울호에 게재된 일타스님과의 인터뷰 기록에서 당시 상황을 살필 수 있다.
일타스님의 회고를 인용한다.
“…오로지 대선지식을 만나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여름 결제를 하기위해 효봉스님이 조실로 계신 송광사를 찾아갔어요. 그 때 성철스님을 처음 뵈었어요. 결제전인 어느 날 저녁 대중이 공양을 마치고 나왔는데 대중스님들이 ‘철 수좌 왔다. 철 수좌 왔다’하며 좀 소란스럽더군요. 그래 철 수좌가 누구냐고 물으니 ‘말도 마. 팔만대장경을 거꾸로 외는 굉장한 스님이야’ 하더군요. 그 소리를 듣고는 호기심이 생겨 나도 가봐야지 하고는 갔어요. 다른 대중들은 일어나 있고 효봉스님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입승 영월스님이 앉아있는데 성철스님이 두 분에게 절을 하고는 턱하니 책상다리를 하고 앉으시더군요. 어른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나면 무릎 꿇고 앉는 것이 보통인데 ‘철스님’은 당당히 책상다리를 하고 앉았어요.
영월스님이 ‘생식을 하시는 분은 여기서 대중과 함께 살수가 없습니다’ 하니 철스님도 ‘잘 알겠습니다. 며칠 쉬어 가겠습니다’라고만 했어요.
그 당당한 모습이 어찌나 인상 깊던지.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있고 특기한 사람이 있는데 철스님은 특기한 사람 중의 한 분이구나 싶었어요. 찬연히 빛나는 눈빛에서는 지혜가 샘솟는 것 같고 훤칠한 이마에 흠씬 커 보이는 키가 대중을 압도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마친 철스님은 법웅스님과 함께 국사전 노전에 머물렀는데 나는 스님이 생식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말뚝신심이 나서 상추를 뜯어다 씻어서 자꾸 갖다 드렸어요. 그때 대중 가운데서 내가 나이가 가장 어려 다른 스님들보다 편안하게 스님을 뵐 수 있었지요. 하루는 밖에 나가시길래 따라 나섰어요. 송광사 위쪽에 경치 좋은 ‘수석대’라는 곳이 있어요. 그 위에 올라가면 석두스님이 지었다는 ‘무구정’이라는 정자가 있어요. 그쪽으로 올라가던 스님이 나를 보고는 ‘와 따라 오노’ 하고 묻기에 ‘따라갑니까? 그냥 가지요’ 하니 허허 웃으면서 은사가 누구냐, 본사는 어디냐 등 물었어요.
그때 스님에게 들은 말씀 중 지금까지 남아있는 말씀이 ‘중노릇은 사람노릇이 아니다. 중노릇하고 사람노릇하고는 다르다. 사람노릇하려면 옳은 중노릇을 못한다’는 말씀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말씀이 내 중노릇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스님이 송광사에 한 닷새 있다가 떠날 때 나도 은근히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 소리는 못하고 ‘혼자 가십니까’ 하니 ‘중이 가는 길은 혼자 가는 길이다’ 하셨어요. 경에도 있듯 ‘구도자의 길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길’이라는 그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때 내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
||
|
승보종찰 순천 송광사 일주문. 김형주 기자 | ||
■되새기는 성철스님 법어
하심(下心)
좋고 영광스러운 것은 항상 남에게 미루고 남부끄럽고 욕된 것은 남모르게 내가 뒤집어쓰는 것이 수도인의 행동이다.
“항상 자기의 허물만 보고 남의 시비와 선악은 보지 못한다”는 육조대사의 말씀이야 말로 공부하는 사람의 눈이다. 도가 높을수록 마음은 더욱 낮추어야 하니, 사람을 부처님과 같이 존경하고 원수를 부모와 같이 섬긴다.
어린이나 걸인이나, 어떠한 악인이라도 차별하지 않고 극진하게 존경한다.
낮은 자리에 앉고 서며, 끝에서 수행하여 남보다 앞서지 않는다.
음식을 먹을 때나 물건을 나눌 때 좋은 것은 남에게 미루고 나쁜 것만 가진다.
언제든지 고되고 천한 일은 자기가 한다.
- 방장 대중법어(1982년 5월)
[불교신문 2729호/ 6월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