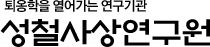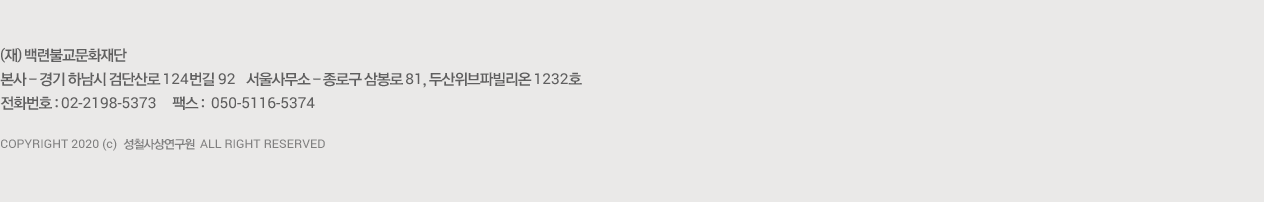원로서예가 남석 이성조
페이지 정보
작성자본문
10월 고희연 여는 원로서예가 남석 이성조
반백년이 넘도록 오로지 먹갈고 붓질하며 사경에만 전념해온 원로서예가 남석 이성조. 지난 6월29일 대구 팔공산 파계사자락에 있는 공산예원에서 그를 만났다. 오는 10월 ‘서예인생 52년 고희연’을 앞둔 그는 “금생에 할일은 다 했다”고 말했다.
1997년 원로서예가 남석(南石)은 환갑을 맞아 가족들과 태백산 인근을 여행했다. 경북 봉화를 거쳐 안동을 지나다 ‘현불사’라는 표석을 본 순간, 이 절에 주석하는 한 노스님이 떠올랐다. 현불사는 득도한 팔순 노승이 머문다는 소문에 오가는 객인들이 깨나 득실댔던 절. 절문에 들자마자 노스님은 대중을 향해 “그 분을 정중히 모시라”며 남석을 알아챘다. “남석은 나를 모르제? 나는 니가 두번째다!” “무…슨…” 1950년대 남석이 청남 오제봉 스님 옆에서 교복 입고 먹 갈던 모습을 봤다는 게 스님의 설명이다. 40여년만의 재회다. 그날 밤 스님과 남석은 밤새는 줄 모르고 울고 웃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헤어지기 전 스님은 남석에게 꼭 집어 말했다. “자네 글씨는 너무 규격화 되었어.” 글씨가 가지런한 것도 잘못이란 말인가. 스님은 이어서 “글씨가 차렷하고 서서 경직되어 있으면 힘들어서 어디 편하게 보겠나. ‘편히 쉬어’도 해야 맛이지. 쯧쯧…” 남석은 일주문을 빠져 나오자마자 남은 여행 일정을 다 접고 집으로 달음질쳤다. ‘내 글씨가 그리도 형편없었나.’ 열여덟에 서예에 입문하여 부산대 사범대학 미술과를 나와서 최연소로 국선에 입선한 남선이 나이 환갑에 받은 ‘혹평’은 그를 미칠 지경까지 내몰았다. “며칠밤을 꼬박 새면서 고민했지예. 그 때 종이 참 많이 버렸제.”
그가 고민끝에 고안해낸 선택은 ‘암중취호’(暗中醉毫). 눈을 감고 글씨를 썼다. 눈알이 튀어나오도록 간과 격을 맞추면서 획마다 혼과 열을 담아쓴 글씨가 눈을 감고나니 오롯이 종이와 붓의 마음따라 휙휙 지나갔다. “이게 자네의 글씨네.” 한달여간 써온 글씨를 한무덩이 싣고 노스님을 찾아갔더니 그제서야 스님은 글씨를 인정했다. “지금도 그 글씨 더미가 스님의 방 ‘금고’안에 간직되어 있다 아이오.”
남석 이성조(李成祚, 70). 40여년간 눈을 부릅 뜨고 지켜온 글씨를 하루아침에 눈감아 ‘휘갈기고 말았’을 때, 순간 그는 시원한 뚫림을 느꼈다고 한다. 반평생 눈을 뜨고도 갑갑했던 마음이 눈을 감고서야 비로소 트였다는 말은 쉬 이해되지 않는 경지다.
...자세히 보기
반백년이 넘도록 오로지 먹갈고 붓질하며 사경에만 전념해온 원로서예가 남석 이성조. 지난 6월29일 대구 팔공산 파계사자락에 있는 공산예원에서 그를 만났다. 오는 10월 ‘서예인생 52년 고희연’을 앞둔 그는 “금생에 할일은 다 했다”고 말했다.
1997년 원로서예가 남석(南石)은 환갑을 맞아 가족들과 태백산 인근을 여행했다. 경북 봉화를 거쳐 안동을 지나다 ‘현불사’라는 표석을 본 순간, 이 절에 주석하는 한 노스님이 떠올랐다. 현불사는 득도한 팔순 노승이 머문다는 소문에 오가는 객인들이 깨나 득실댔던 절. 절문에 들자마자 노스님은 대중을 향해 “그 분을 정중히 모시라”며 남석을 알아챘다. “남석은 나를 모르제? 나는 니가 두번째다!” “무…슨…” 1950년대 남석이 청남 오제봉 스님 옆에서 교복 입고 먹 갈던 모습을 봤다는 게 스님의 설명이다. 40여년만의 재회다. 그날 밤 스님과 남석은 밤새는 줄 모르고 울고 웃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헤어지기 전 스님은 남석에게 꼭 집어 말했다. “자네 글씨는 너무 규격화 되었어.” 글씨가 가지런한 것도 잘못이란 말인가. 스님은 이어서 “글씨가 차렷하고 서서 경직되어 있으면 힘들어서 어디 편하게 보겠나. ‘편히 쉬어’도 해야 맛이지. 쯧쯧…” 남석은 일주문을 빠져 나오자마자 남은 여행 일정을 다 접고 집으로 달음질쳤다. ‘내 글씨가 그리도 형편없었나.’ 열여덟에 서예에 입문하여 부산대 사범대학 미술과를 나와서 최연소로 국선에 입선한 남선이 나이 환갑에 받은 ‘혹평’은 그를 미칠 지경까지 내몰았다. “며칠밤을 꼬박 새면서 고민했지예. 그 때 종이 참 많이 버렸제.”
그가 고민끝에 고안해낸 선택은 ‘암중취호’(暗中醉毫). 눈을 감고 글씨를 썼다. 눈알이 튀어나오도록 간과 격을 맞추면서 획마다 혼과 열을 담아쓴 글씨가 눈을 감고나니 오롯이 종이와 붓의 마음따라 휙휙 지나갔다. “이게 자네의 글씨네.” 한달여간 써온 글씨를 한무덩이 싣고 노스님을 찾아갔더니 그제서야 스님은 글씨를 인정했다. “지금도 그 글씨 더미가 스님의 방 ‘금고’안에 간직되어 있다 아이오.”
남석 이성조(李成祚, 70). 40여년간 눈을 부릅 뜨고 지켜온 글씨를 하루아침에 눈감아 ‘휘갈기고 말았’을 때, 순간 그는 시원한 뚫림을 느꼈다고 한다. 반평생 눈을 뜨고도 갑갑했던 마음이 눈을 감고서야 비로소 트였다는 말은 쉬 이해되지 않는 경지다.
...자세히 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