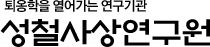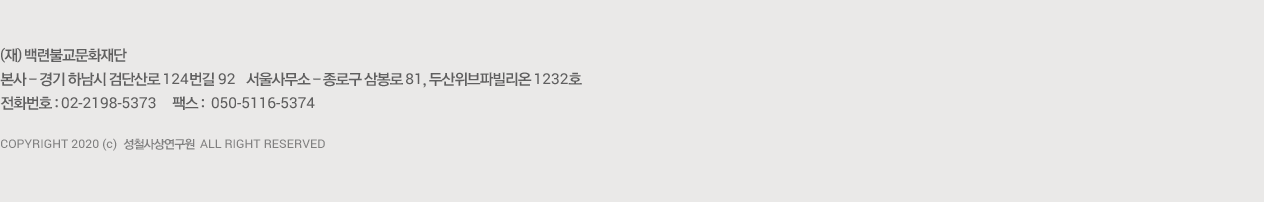성철스님 “불교는 몸으로 깨쳐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본문
성철스님 “불교는 몸으로 깨쳐야”
<붓 가장자리의 마른글> 27.
신문사 편집회의에서 선사들의 산중생활을 취재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해제 전 큰스님의 동정을 살펴 신문에 알렸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그 임무가 나에게 맡겨졌다. 나는 성철스님의 근황을 여쭈어 보기로 마음먹고, 염천 한 더위에 문경 김룡사로 향했다. 그 때 강복영 선생이 나와 함께 갔다. 강 선생은 불교학과 학생으로, 기원학사에서 동거하는 룸메이트였다.
김천까지는 기차를 탔고 문경까지는 버스를 이용하였다. 김룡사 아래 마을까지 차편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거기서부터는 걸어가야만 하였다. 어디서 흘러오는 물인지 널따란 개울을 가득 채우고 저 건너 몇 아름이 되는 나무에 금줄을 매어 놓고 있었다. 그 금줄은 천신에게 비손하는 것만 아니고 이 개울물을 함부로 더럽히지 말라는 자연보존의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나는 금줄의 의미를 지금껏 알지 못하고 있다.
김룡사에 도착하여 스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니 “이 여름에 어떻게 왔노”하셨다. “나는 장(항상) 이렇게 있다”고 하시면서 “요새는 내가 밥값을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다. 아마 굉장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니도 여기 온 김에 절 좀 하고 가거라”고 하셨다. “스님 절하면 절값 줍니까?” “이놈아 부처님께 절하는데 무슨 절값인가.” “그래도 절값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나는 성철스님의 다그침을 이기지 못하고 강복영 선생과 함께 저녁 9시경부터 절을 시작했다. 새벽녘에 이르니 힘들고, 온 몸이 땀범벅이 됐다. 또 그만 둘까 하는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 헤맸다. 어떻게 된 것도 모르고 그냥 숫자를 셈하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다만 거의 녹초가 돼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고 느낀 순간, 아니면 희미한 희망이 넘치는 그 순간 3000배를 이루었다하니, 참으로 기이한 느낌이 들었다.
신문사 편집회의에서 선사들의 산중생활을 취재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해제 전 큰스님의 동정을 살펴 신문에 알렸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그 임무가 나에게 맡겨졌다. 나는 성철스님의 근황을 여쭈어 보기로 마음먹고, 염천 한 더위에 문경 김룡사로 향했다. 그 때 강복영 선생이 나와 함께 갔다. 강 선생은 불교학과 학생으로, 기원학사에서 동거하는 룸메이트였다. 김천까지는 기차를 탔고 문경까지는 버스를 이용하였다. 김룡사 아래 마을까지 차편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거기서부터는 걸어가야만 하였다.
큰스님 만나자마자 “절 좀 해라”
3천배 이루는 순간 성취감 가득
어디서 흘러오는 물인지 널따란 개울을 가득 채우고 저 건너 몇 아름이 되는 나무에 금줄을 매어 놓고 있었다. 그 금줄은 천신에게 비손하는 것만 아니고 이 개울물을 함부로 더럽히지 말라는 자연보존의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나는 금줄의 의미를 지금껏 알지 못하고 있다. 김룡사에 도착하여 스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니 “이 여름에 어떻게 왔노”하셨다. “나는 장(항상) 이렇게 있다”고 하시면서 “요새는 내가 밥값을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다. 아마 굉장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니도 여기 온 김에 절 좀 하고 가거라”고 하셨다.
“스님 절하면 절값 줍니까?” “이놈아 부처님께 절하는데 무슨 절값인가.” “그래도 절값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나는 성철스님의 다그침을 이기지 못하고 강복영 선생과 함께 저녁 9시경부터 절을 시작했다. 새벽녘에 이르니 힘들고, 온 몸이 땀범벅이 됐다. 또 그만 둘까 하는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 헤맸다. 어떻게 된 것도 모르고 그냥 숫자를 셈하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다만 거의 녹초가 돼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고 느낀 순간, 아니면 희미한 희망이 넘치는 그 순간 3000배를 이루었다하니, 참으로 기이한 느낌이 들었다.
절을 마치고 스님 거처에 와서 “스님 절을 다 했습니다”고 말씀 드렸더니 “니도 조금씩 되어 간다. 그렇게 또 하고 또 하면 좋을끼다”라고 하셨다. “불교는 몸소 깨치게 하는 종교다. 입으로 말하는 것은 책을 보거나, 누구에게 들은 것을 남에게 입으로 전할 수 있지만, 그것은 몸과 맘이 하나 되어 그 어디인가 모를 궁극에서 깨친 것이 아니므로 허망한 것이다. 그러므로 맘이 깨쳐 몸에 밝은 불이 되어 있으면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점수법과 돈오법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점수법은 몸을 길들이는 것이지만, 돈오법은 마음을 깨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한 평생 이 몸의 종이 되지 말고 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안거도 따로 있는 것이다. 중이 되면 항상 안거를 해야 한다. 여름, 겨울만 안거하는 것은 몸을 묶어 마음을 깨치게 하는 것이고 사철안거 한다는 것은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백장스님의 철칙만이 아니라 중이 된 사람이면 항상 사철안거를 하면서 마음을 언제나 오매일여에 두어야 한다. 니도 이제 한 번 당차게 했으니, 이 당찬 마음을 절대 버리지 말고 자면서도 참선하는 세계에 오입하여야 한다. 불교는 밥값을 바로 챙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주셨다.
나는 굽히지 않고 “스님 그래도 절값은 주셔야 한다”고 고집했다. 그랬더니 스님은 “절값은 우리가 부처님께 바치고 중생에게 베푸는 것이지, 이놈아 알았다”라며 박사공부하는데 학비에 쓰라고 하시면서 도명스님을 불러 이 사람한테 좀 주라고 하셨다. 큰스님으로부터 절값을 받았다. 아니 부처님으로부터 절값을 희사 받았으니 어찌 불교공부를 게을리 하고 아무렇게나 살 수 있을가. 큰스님 취재는 이렇게 하였고, 강복영 선생과 함께 봉암사를 들러 산길을 넘어 괴산으로 왔다.
목 정 배 / 동국대 명예교수
[불교신문 2390호/ 1월1일자]
2008-01-02 오후 4:00:47 / 송고
<붓 가장자리의 마른글> 27.
신문사 편집회의에서 선사들의 산중생활을 취재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해제 전 큰스님의 동정을 살펴 신문에 알렸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그 임무가 나에게 맡겨졌다. 나는 성철스님의 근황을 여쭈어 보기로 마음먹고, 염천 한 더위에 문경 김룡사로 향했다. 그 때 강복영 선생이 나와 함께 갔다. 강 선생은 불교학과 학생으로, 기원학사에서 동거하는 룸메이트였다.
김천까지는 기차를 탔고 문경까지는 버스를 이용하였다. 김룡사 아래 마을까지 차편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거기서부터는 걸어가야만 하였다. 어디서 흘러오는 물인지 널따란 개울을 가득 채우고 저 건너 몇 아름이 되는 나무에 금줄을 매어 놓고 있었다. 그 금줄은 천신에게 비손하는 것만 아니고 이 개울물을 함부로 더럽히지 말라는 자연보존의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나는 금줄의 의미를 지금껏 알지 못하고 있다.
김룡사에 도착하여 스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니 “이 여름에 어떻게 왔노”하셨다. “나는 장(항상) 이렇게 있다”고 하시면서 “요새는 내가 밥값을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다. 아마 굉장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니도 여기 온 김에 절 좀 하고 가거라”고 하셨다. “스님 절하면 절값 줍니까?” “이놈아 부처님께 절하는데 무슨 절값인가.” “그래도 절값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나는 성철스님의 다그침을 이기지 못하고 강복영 선생과 함께 저녁 9시경부터 절을 시작했다. 새벽녘에 이르니 힘들고, 온 몸이 땀범벅이 됐다. 또 그만 둘까 하는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 헤맸다. 어떻게 된 것도 모르고 그냥 숫자를 셈하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다만 거의 녹초가 돼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고 느낀 순간, 아니면 희미한 희망이 넘치는 그 순간 3000배를 이루었다하니, 참으로 기이한 느낌이 들었다.
신문사 편집회의에서 선사들의 산중생활을 취재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해제 전 큰스님의 동정을 살펴 신문에 알렸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그 임무가 나에게 맡겨졌다. 나는 성철스님의 근황을 여쭈어 보기로 마음먹고, 염천 한 더위에 문경 김룡사로 향했다. 그 때 강복영 선생이 나와 함께 갔다. 강 선생은 불교학과 학생으로, 기원학사에서 동거하는 룸메이트였다. 김천까지는 기차를 탔고 문경까지는 버스를 이용하였다. 김룡사 아래 마을까지 차편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거기서부터는 걸어가야만 하였다.
큰스님 만나자마자 “절 좀 해라”
3천배 이루는 순간 성취감 가득
어디서 흘러오는 물인지 널따란 개울을 가득 채우고 저 건너 몇 아름이 되는 나무에 금줄을 매어 놓고 있었다. 그 금줄은 천신에게 비손하는 것만 아니고 이 개울물을 함부로 더럽히지 말라는 자연보존의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나는 금줄의 의미를 지금껏 알지 못하고 있다. 김룡사에 도착하여 스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니 “이 여름에 어떻게 왔노”하셨다. “나는 장(항상) 이렇게 있다”고 하시면서 “요새는 내가 밥값을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다. 아마 굉장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니도 여기 온 김에 절 좀 하고 가거라”고 하셨다.
“스님 절하면 절값 줍니까?” “이놈아 부처님께 절하는데 무슨 절값인가.” “그래도 절값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나는 성철스님의 다그침을 이기지 못하고 강복영 선생과 함께 저녁 9시경부터 절을 시작했다. 새벽녘에 이르니 힘들고, 온 몸이 땀범벅이 됐다. 또 그만 둘까 하는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 헤맸다. 어떻게 된 것도 모르고 그냥 숫자를 셈하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다만 거의 녹초가 돼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고 느낀 순간, 아니면 희미한 희망이 넘치는 그 순간 3000배를 이루었다하니, 참으로 기이한 느낌이 들었다.
절을 마치고 스님 거처에 와서 “스님 절을 다 했습니다”고 말씀 드렸더니 “니도 조금씩 되어 간다. 그렇게 또 하고 또 하면 좋을끼다”라고 하셨다. “불교는 몸소 깨치게 하는 종교다. 입으로 말하는 것은 책을 보거나, 누구에게 들은 것을 남에게 입으로 전할 수 있지만, 그것은 몸과 맘이 하나 되어 그 어디인가 모를 궁극에서 깨친 것이 아니므로 허망한 것이다. 그러므로 맘이 깨쳐 몸에 밝은 불이 되어 있으면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점수법과 돈오법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점수법은 몸을 길들이는 것이지만, 돈오법은 마음을 깨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한 평생 이 몸의 종이 되지 말고 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안거도 따로 있는 것이다. 중이 되면 항상 안거를 해야 한다. 여름, 겨울만 안거하는 것은 몸을 묶어 마음을 깨치게 하는 것이고 사철안거 한다는 것은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백장스님의 철칙만이 아니라 중이 된 사람이면 항상 사철안거를 하면서 마음을 언제나 오매일여에 두어야 한다. 니도 이제 한 번 당차게 했으니, 이 당찬 마음을 절대 버리지 말고 자면서도 참선하는 세계에 오입하여야 한다. 불교는 밥값을 바로 챙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주셨다.
나는 굽히지 않고 “스님 그래도 절값은 주셔야 한다”고 고집했다. 그랬더니 스님은 “절값은 우리가 부처님께 바치고 중생에게 베푸는 것이지, 이놈아 알았다”라며 박사공부하는데 학비에 쓰라고 하시면서 도명스님을 불러 이 사람한테 좀 주라고 하셨다. 큰스님으로부터 절값을 받았다. 아니 부처님으로부터 절값을 희사 받았으니 어찌 불교공부를 게을리 하고 아무렇게나 살 수 있을가. 큰스님 취재는 이렇게 하였고, 강복영 선생과 함께 봉암사를 들러 산길을 넘어 괴산으로 왔다.
목 정 배 / 동국대 명예교수
[불교신문 2390호/ 1월1일자]
2008-01-02 오후 4:00:47 / 송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