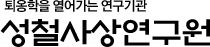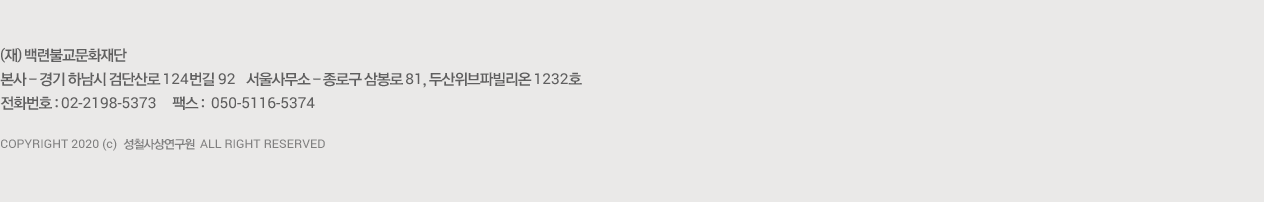|
||
| 통영 안정사 천제굴 터. 성철스님을 10여년 시봉한 성일스님이 필자에게 당시 현황을 설명해주고 있다. 왼쪽 아래 사진은 은봉암에서 바라본 남해 전경.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 ||
겨울철 큰 눈이 내린다는 절기인 대설(大雪)을 이틀 앞둔 지난 5일 경남 통영 안정사(安靜寺) 천제굴(闡提屈)을 찾았다. 통영 벽발산(碧鉢山), 현지에서는 벽방산(碧芳山)이라 부르기도 하는 그 곳의 천제굴. 성철스님은 1951년 안정사 은봉암(隱鳳庵)에서 하안거를 나고 그해 동안거부터 천제굴에 머물렀다. 스님은 1952년 경남 창원 불모산(佛母山) 성주사(聖住寺)에서 동안거 한철을 지낸 것을 빼고는 1951~1954년까지 천제굴에서 보냈다.
천제굴은 성철스님이 안정사 큰절 뒤 산자락에 초가삼간을 짓고 주위를 돌담으로 둘러친 토굴이다. 현 종정 법전(法傳)스님이 시봉을 한 곳, 맏상좌 천제스님이 처음으로 스님을 찾아와서 만난 곳이다. 천제스님은 이후 10년 행자생활 뒤 스님의 상좌가 되었다.
6.25 한국전쟁을 피해 남해 바닷가에서 보낸 시절. 스님은 여기에서 조계종단의 불교정화운동이 시작되던 해까지 살았다.
천제굴을 찾아간 날. 대설을 앞둔 날이지만 낮 기온은 포근했다. 오후 들어 추울까봐 지레 겁먹고 잔뜩 겨울 옷차림을 했는데 괜한 호들갑을 떤 것 같아 멋쩍은 생각을 갖게 했다. 천제굴은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다. 스님이 살던 집도 모두 없어졌고 그 터엔 허물어진 돌담만 남아있다. 집터는 잡초만 무성했다. 천제스님 못지않게 ‘성철스님을 모신 10년 행자’인 성일스님이 동행해 주지 않았으면 천제굴 터를 찾기 어려웠으리라 생각하니 선뜻 동행을 허락해준 성일스님에게 감사한 마음이었다.
반백년도 못되어 흔적만 남은 천제굴 옛터를 보고 있노라니 산천의구(山川依舊)라는 옛말도 헛말이구나 싶었다. 성일스님은 법당 터에 서서 “저 나무들이 그 때는 한 길도 채 안 되는 쬐끄만 것이었는데 지금은 내 키 두 배나 되게 컸네” 했다.
“안정사 천제굴엔 조그만 법당 한 채, 그리고 노장님(성철스님)이 머물던 위채, 내가 있던 식당채가 있었다”고 천제스님은 당시를 회상했다.
“벽방산이 짙푸른 남해를 바라보고 있는 곳에 위치한 안정사는 신라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고찰이다. 성철 노장은 나와 문일조스님, 법웅스님(도우스님) 등의 시봉을 받았다. 문일조스님은 안정사 뒤쪽 평평한 곳에 천제굴을 지었다. 덕분에 우리는 성철 노장을 모시고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 나중엔 두 사람이 가고 나서 나 혼자 노장을 모시다가 천제굴을 떠나올 무렵, 노장의 맏상좌가 된 천제가 왔길래 그에게 시봉을 맡기고 나왔다.”(법전스님 자서전 <누구없는가> 90쪽)
재 지낼 때 음식 차리지 않고
경 읽고 능엄주 외우고 108배
‘참회의 3000배’ 시작한 곳
현 종정 법전스님을 비롯
도우.일조스님에 이어
맏상좌 천제.성일스님이 시봉
“천제굴 주변에는 밭이 꽤 많았다. 그 밭을 다 갈고 세끼 밥을 짓고 청소와 빨래하며, 노장이 주무시는 방에 장작불을 땠다. 약을 달여 드리고 과일즙을 내 드렸으며 손님이 오면 선별해서 만나도록 해 드리고 고성 읍내까지 가서 장을 보아오는 등 날마다 바빴다. … 성철 노장은 참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다. 모든 것에 철저하고 분명했으며 조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 ‘공부를 제대로 이루기 전에는 공부라는 이름도 붙이지 못한데이. 적어도 하루 20시간이상 화두가 한결같게 들려야 비로소 화두공부 한다고 할 수 있단 말이다’ … 부엌바닥에 깔개를 깔아놓고 상을 차려 스승과 단둘이 공양을 했던 단출한 시간들은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던 속세에서는 좀체 볼 수 없는 고요함과 평화로움이 함께 한 시간들이었다. 노장은 늘 ‘영원한 진리를 위해 일체를 희생하라’고 가르치셨다. 그런 정신은 노장의 생활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돈은 비상(砒霜)과 같데이. 거저 얻게 되는 돈을 뿌리치는 사람이 가장 용기 있고 청정한 사람인기라.” …
“그 시절엔 청담스님을 비롯해 자운.운허.서옹.향곡스님 등 많은 스님들이 다녀갔다.”(위 책에서 인용)
법전스님이 천제굴을 떠날 무렵 천제스님이 왔다. 1953년 통영 안정사 천제굴에서 성철스님을 모시고 머리를 깎았다.
“열네 살 되던 해 가을(천제스님은 1939년생). 6.25전쟁으로 병을 얻은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안정사로 부친의 사십구재를 모시러 갔다가 속가의 부친 대신 성철스님을 부친으로, 스승으로 모시게 되었다. 부친이 돌아가시자 나도 더 이상 살지 못할 것 같았는데 거기서 스님을 만나고부터 다시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스님 곁에 머물렀으니까 전생의 인연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
||
“내가 처음 절에 와서 노장님이 일러 준 것을 그대로 써 놓은 공책을 펴 보면 이런 구절이 보인다. ‘수시여전(受施如箭)’, 즉 시주받는 것을 날아오는 화살 받는 것처럼 하라는 뜻이다. 그 당시 노장님의 ‘중들이 돈의 노예가 되었으니 스승이 아니고 종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들은 것을 메모한 것이다. 또 ‘어려운 가운데 가장 어려움은 알고도 모르는 체 함이요, 용맹 가운데 가장 용맹스러움은 옳고도 지는 것이니라. 공부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남의 허물을 쓰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위대한 인물은 모든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다’라는 노장님의 말씀을 적은 메모도 있다.”(박원자 엮음 <나의 행자시절> 196~197쪽)
“성철스님은 천제굴 시절부터 재를 지낼 때 음식을 차리지 않고 경을 읽게 했고(轉經) 매일 신역 능엄주를 외우고 108배를 했다. 등(燈)을 다는 것에 대해서도 본인이 와서 등을 다는 것은 백천 개를 달아도 상관없지만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큰 것을 달아주는 것과 같은 등 장사는 결코 못하게 했다. 또한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미신화 되고 토속화 되어 본래의 모습을 잃은 불교에서 탈피하여 본래의 면목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에 대단한 노력을 하신 분이다. 참회의 3000배를 처음 시작한 곳도 천제굴이다. 노장님은 늘 그러셨다.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부처님 말씀을 수행하고 전하는 일이 내 할 일이다.”(위 책에서 발췌 인용)
“해마다 초가지붕을 이는 일이 예삿일이 아니었어. 그 때는 지금처럼 기와지붕이 아니었거든. … 노장님은 법당 앞마당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아, 참 좋다’라는 말을 자주하셨지.”
스님이 즐겨 바라보던 그 바다. 천제굴 터에서 지금은 잘 보이지 않았다. 길길이 자란 나무들이 전망을 가리고 있을 뿐이었다.
천제굴, 터만 남은 그 곳을 떠나면서 많은 생각이 오갔다. 세월이 하 수상하다고는 하나 ‘시대의 어른’이 살던 자취가 이렇듯 변할 수 있나하는 마음에서였다.
■되새기는 성철스님 법어
|
시비와 선악이 본래 공(空)하고
시비와 선악이 본래 공(空)하고 마군(魔軍)과 제불(諸佛)이 원시동체(元是同體)입니다. 생사열반(生死涅槃)은 꿈속의 꿈이요 이해득실(利害得失)은 거품 위의 거품입니다. 진여(眞如)의 둥근 달이 휘황찬란하여 억천만겁 변함없이 일체를 밝게 비추니 사바가 곧 정토입니다. 물거품인 이해득실을 단연히 버리고 영원한 진여의 둥근 달을 항상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만법이 청정하여 청정이란 이름조차 찾아볼 수 없으니 가없는 이 법계에 거룩한 부처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들판의 괭이소리 공장의 기계소리 함께 같이 태평가를 노래하니 푸른 언덕 잔디 위에 황금빛 꽃사슴이 즐겁게 뛰놉니다. - 1986년 서의현 총무원장 취임식 |
 |
||
“적어도 하루 20시간이상 화두가 한결같게 들려야 비로소 화두공부 한다고 할 수 있다. …
늘 ‘영원한 진리를 위해 일체를 희생하라’고 가르치셨다. 그런 정신은 노장(성철스님)의 생활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돈은 비상(砒霜)과 같데이. 거저 얻게 되는 돈을 뿌리치는 사람이 가장 용기 있고 청정한 사람인기라.” (법전스님 자서전 ’누구없는가‘에서)
 |
||
“‘수시여전(受施如箭)’, 시주받는 것을 날아오는 화살 받는 것처럼 하라.… ‘어려운 가운데 가장 어려움은 알고도 모르는 체 함이요, 용맹 가운데 가장 용맹스러움은 옳고도 지는 것이니라. 공부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남의 허물을 쓰는 것’이라는 노장님의 말씀을 적은 메모도 있다.”
(박원자 엮음 ‘나의 행자시절’ 천제스님 편에서)
[불교신문 2778호/ 12월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