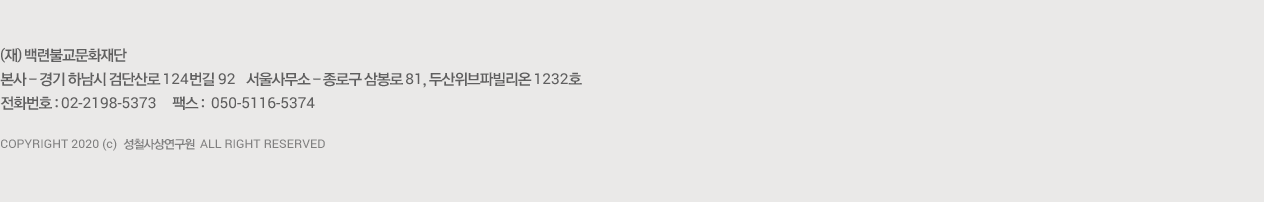[불교신문]성철스님의 자취를 찾아서.. 희양산 봉암사 (上)
페이지 정보
작성자본문
| ‘봉암사 결사’의 큰 걸음 내딛다 | |||||||||||||||||||
| 희양산 봉암사 (上) | |||||||||||||||||||
| |||||||||||||||||||
|
고려 초 광종의 칙령에 의해 부동사원으로 지정되고 고려 중기 원진국사, 고려 말 원증국사가 주석한 사원으로 유명하다. 조선 초에는 함허 득통스님이 주석하여 배불론(排佛論)에 맞서는 현정론(顯正論)을 폈다. 현대에는 조계종의 혁신운동인 봉암사 결사운동의 발상지로서 조계종 특별수도원(종립선원)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이처럼 신라 말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봉암사의 위상은 각 시기마다 사상사에서 주목되고 있다.(문경시에서 펴낸 <희양산 봉암사>에서 인용) 희양산은 태백산맥이 태백산을 거쳐 남쪽으로 곧게 뻗어 내려오다가 갈지(之)자로 꺾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다. 봉암사 가는 길로 들어서다 보면 정면 멀리 원추형으로 생긴 흰 바위 봉우리가 있다. 시선을 압도하는 우람한 봉우리 전체가 화강암이어서 나무나 풀이 붙어있지 못한다. 한국의 산악 경관 중에서 이런 형태의 봉우리는 유일하다고 한다. 이 화강암 바위는 하늘로 치고 올라가는 형상이어서 ‘마치 갑옷을 입은 기사가 앞으로 내달리는 형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봉우리 아래 너른 터에 봉암사가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봉암사에 들어서면 드세고 기가 센 기운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유서 깊은 도량에 근대선원이 처음 개원된 것은 1947년이라 한다.(조계종교육원 불학연구소편 <선원총람>) 1947년 ‘근대 선원’ 개원…6·25 한국전쟁으로 와해 서암스님 등 원력 힘입어 1970년 수좌들 모여들어 1982년부터 일반인 출입제한…종립특별선원으로 우뚝 서 봉암사 결사로 선원이 다시 태어난다. 그러나 봉암사 결사도 1950년 6?5한국전쟁으로 인해 와해되고 그 후 봉암사는 날로 황폐되었다. 1970년 초부터 공부하는 수좌들이 다시 모여들었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전 종정 서암(西庵)스님(1917~2003)의 원력이 있었다. 1982년 6월 종단은 봉암사를 조계종 특별수도원으로 지정했다. 봉암사는 1982년부터 지금까지도 산문을 폐쇄해 일반인·등산객·관광객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님오신날은 개방한다. 당시 산문폐쇄의 발단이 되었던 정황을 알아본다. 봉암사 태고선원(太古禪院, 1990년 이전엔 희양선원)에는 안거기간 외에도 선승들이 항상 머물며 여법히 정진한다. 1982년 하안거 때 많은 수좌들이 용맹정진하고 있었다. 행락객들이 봉암사 계곡으로 몰려왔다. 사찰경내인 마애불 옆에서 텐트를 치고 숙박과 취사를 했다. 스님들은 이들에게 여러 번 주의를 주곤 했지만 행락객의 그런 행위는 그치지 않았다.
결의된 내용을 대중대표 스님들이 당시 종정인 성철스님에게 상세히 말씀드렸다. 성철스님은 대중의 뜻을 치하하면서 1947년부터 실시했던 봉암사 결사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일이 원만히 성사되는데 큰 힘을 주었다. 그 후로 봉암사는 교단의 명실상부한 전문수도장으로써의 면모와 위상을 갖추었다. 그런 후에도 돌광산 개발을 비롯하여 수행환경 파괴행위가 여러 차례 시도되었다. 특히 행정당국은 1982년 이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만들어 사찰을 합법적으로 개방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 역시 스님들의 의연하고 단호한 대처로 오늘에 이르게 됐다. 2002년에는 산림청으로부터 봉암사와 희양산 일대가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으로 지정되었다. 그 후 봉암사 일대의 생태계는 수달이 서식할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었으며 최근에는 희귀식물 여러 종이 새롭게 발견될 정도로 크게 좋아졌다. 봉암사 일대는 절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산세의 빼어남은 이를 것 없고 계곡과 그 계곡을 흘러내리는 물 또한 명징하다. 큰절에서 2㎞도 채 못간 곳에 마애불이 있다. 그 앞에는 너른 바위가 평상처럼 펼쳐져 있다. 근 100여명이 이곳에 앉고 서서 야외법회를 할 만한 공간이 바위로 이루어져 있다. 크고 너른 바위사이로 흘러내리는 물은 거울 같았다. 그 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입으로 바로 넣었다. 봉암사 계곡의 이 물맛은 문자 그대로 가슴 속까지 시원할 정도였다. 그 큰 바위 위에 벌렁 누었다. 오후의 햇살이 마애불 앞에는 그늘이 없어 따사했다. 굳이 큰절 법당 안에서 법회를 열지 않아도 여기에서 법석을 벌인다면 ‘오죽 상쾌하랴’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기에 행락객들이 이곳을 자주 찾아 스님들의 수행환경을 그르치지 않았나 싶었다.
원타스님 말에 따르지 않더라도 장년의 한 도인이 스스로의 웅지를 활짝 펼치던 곳. 그곳이 바로 봉암사가 아니던가. 그곳에서 행해진 여러 일들이 오늘날 우리 종단에 큰 교훈을 남겼으며 앞으로의 종단이 나아갈 방향에 지남(指南)이 되고 있지 않은가. 봉암사 그리고 봉암사 결사가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되짚어 보는 글을 다음 회에도 이어가 보기로 한다. ■되새기는 성철스님 법어
[불교신문 2762호/ 10월26일자]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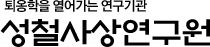
 논설위원
논설위원